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면세점 업계는 엔데믹 이후에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2019년 24조 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지난해 14조 원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면세점 빅4’의 영업손실을 합치면 2850억 원에 달한다. 업황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현대면세점은 올해 7월을 끝으로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점을 폐점하기로 했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올해 1월 폐점했다. 롯데면세점도 매장을 축소하고 실적이 나쁜 해외 점포를 철수할 계획이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면세점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자랑했다. 백화점, 대형마트의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유독 면세점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游客·유커)의 폭발적인 증가세에 힘입어 고공 질주를 이어갔다. 유통업계에선 ‘노다지’인 면세점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2015년 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을 신설하기로 하자 대기업 7곳을 포함해 20여 개 기업이 뛰어들어 ‘면세점 대전’이 벌어졌다. 대기업 오너들까지 전면에 직접 나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2017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큰손’이던 유커가 급감하며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곧이어 2020년 코로나19의 악재가 덮쳤다. 엔데믹 이후 하늘길이 다시 열렸지만 돌아온 관광객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면세점보단 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로드숍에서 주로 지갑을 열었고, 쇼핑보단 한국 문화를 즐기는 체험형 관광이 인기를 끌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면세점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것도 악재가 됐다.▷거위의 배를 가른 정부 역시 면세점 위기에 한몫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면허를 남발해 과당경쟁을 초래했다. 대기업 독점을 막는다며 2013년 면세점 면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는데, 이 규제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도 발목을 잡고 있다. 출국 여행객 수에 비례해서 임대료가 늘어나는 구조인데, 여행객이 늘어도 씀씀이는 그만큼 커지지 않기 때문이다. 유커가 다시 오길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다. 관광 패턴 변화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을 찾아내야 험난한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weeks ago
5
2 weeks ago
5


![[만물상] 아이들 함성이 ‘소음’?](https://www.chosun.com/resizer/v2/RYZZ64RUBVFJBBCJHE4UYVYHPU.png?auth=1748f5aac9ec3f71a0a7e42a9bc146c2d7dc1e8ab9a94652e9a82cfbbf44149c&smart=true&width=580&height=323)
![앞으로 5년…Fed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어떻게 바뀔까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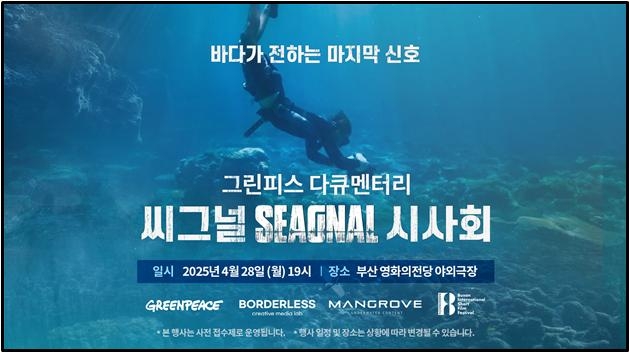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