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햇빛·바람연금, 또 다른 돈 풀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7.35475571.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농어촌 지역의 기본소득 실현 모델로 제시했다. 농어촌 지역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얻는 수익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햇빛·바람연금은 언뜻 들으면 햇빛과 바람이 거저 주는 돈이라는 착각을 일으켜 유권자의 관심을 끈다는 점에서 기막힌 선거 슬로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햇빛·바람연금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전력 소비자에게 덤터기 씌워 얻은 돈을 나누어 갖는 새로운 형태의 돈 풀기가 될 공산이 크다. 햇빛·바람연금이 돈 풀기가 아니라 건전한 농어촌 자립형 수익 모델이 되려면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이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 즉 사회적 비용을 능가할 정도가 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은 전력 판매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과 친환경 편익에 대한 보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가격으로 구성되는 수입과 균등화발전단가(LCOE)로 요약되는 비용의 차이로 나타난다. 실제 수익 규모는 SMP와 REC 가격의 변동에 따라 들쑥날쑥하지만, 대체로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2024년 SMP와 REC 가격이 각각 128.3원, 76.9원이고 LCOE는 136원 정도였으니 ㎾h당 약 97.6원의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바로 이 순이익을 농어촌 주민들이 나누어 갖자는 것이 햇빛·바람연금이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된 수익에는 전력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위 시스템 비용이 빠져 있다. 시스템 비용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완화하기 위한 유연성 전원 확보 및 전력망 비용 등을 의미한다. 햇빛과 바람에 따라 변덕 심한 재생에너지를 전력계통에서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증가와 함께 간헐성이 확대되면 시스템 비용도 덩달아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한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증가와 함께 전력 소비자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55%에 달하는 독일 전기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를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머지않아 재생에너지발 전기가격 폭탄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햇빛·바람연금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유지되는 제도인 것이다.
재산권 분쟁 소지도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나누어 가지려면 그에 걸맞은 지분 투자가 선행돼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햇빛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신안군 주민들은 1만원을 내고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분기마다 1인당 10만~68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마치 햇빛 값을 받는 것과 같다.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이 떠오르는 이유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햇빛·바람연금은 사업자에게는 고정비용이다. 가뜩이나 재생에너지 비중 상승과 함께 출력 제한, 제로 가격 등이 빈번해지며 수입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고정비용마저 증가하면 재생에너지 투자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햇빛·바람연금은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계주생면’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정직해져야 한다. 농어촌의 소득 보전이 꼭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허락을 받아 정정당당하게 지원하는 편이 낫다. 햇빛이니 바람이니 하는 말장난으로 사실을 감춰서는 안 된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2 hours ago
1
2 hours ago
1
![[만물상] 아이들 함성이 ‘소음’?](https://www.chosun.com/resizer/v2/RYZZ64RUBVFJBBCJHE4UYVYHPU.png?auth=1748f5aac9ec3f71a0a7e42a9bc146c2d7dc1e8ab9a94652e9a82cfbbf44149c&smart=true&width=580&height=323)
![앞으로 5년…Fed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어떻게 바뀔까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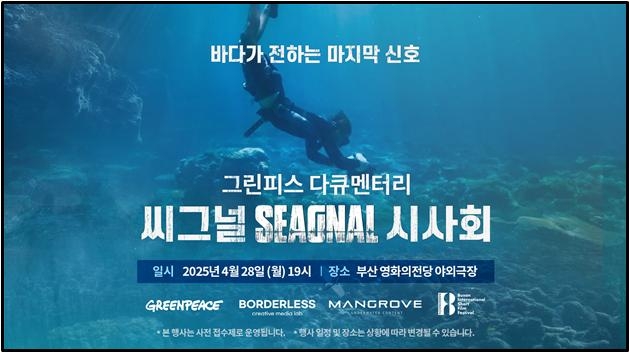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