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벌어진 SK텔레콤의 유심(USIM)칩 해킹 사태가 위약금 면제 논란으로 비화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큰 만큼,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가는 소비자에게 약정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물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SK텔레콤을 재차 압박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SK텔레콤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23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피해 책임을 회사가 지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SK텔레콤도 이런 판단 아래 모든 가입자의 유심칩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통신사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가 지나치다.
약정은 이동통신 상품 계약의 기본이다. 일정 기간 이동통신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요금이나 단말기 가격 할인, 포인트 등의 반대급부를 미리 받는 것이 계약의 골자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80% 안팎이 약정 상품을 이용 중이다. 약정 파기 위약금을 면제해 고객 이탈이 이어지면 SK텔레콤은 수조원대 손실을 입고, 미래 고객 기반도 잃게 된다. 회사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타격이다. SK텔레콤의 과실로 다수의 소비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면 위약금 면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정당화될지 모른다. 하지만 유심칩 정보 유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사례는 아직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해커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시대다. 기업의 노력만으로 막지 못하는 해킹 사고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해커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보상을 하는 것이 선례가 된다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론 위험의 대가가 서비스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편익을 감소시킬 우려도 있다. 소비자를 불편하게 했으니 “망해보라”는 정치권의 마녀사냥식 대응이 교각살우(矯角殺牛)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2 weeks ago
6
2 weeks ago
6
![[만물상] 아이들 함성이 ‘소음’?](https://www.chosun.com/resizer/v2/RYZZ64RUBVFJBBCJHE4UYVYHPU.png?auth=1748f5aac9ec3f71a0a7e42a9bc146c2d7dc1e8ab9a94652e9a82cfbbf44149c&smart=true&width=580&height=323)
![앞으로 5년…Fed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어떻게 바뀔까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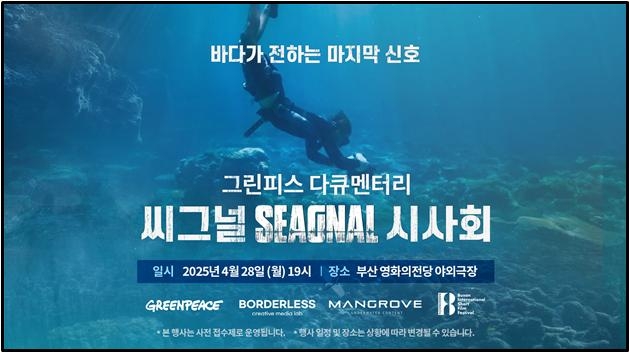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