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716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새마을금고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 은행권 전체 금융사고액(1898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경찰은 금고 직원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공모해 2019년부터 80여 건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사고 직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억원 초과 대출의 심의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자구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새마을금고는 감독 시스템 자체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농협, 수협, 신협 등과 달리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감독을 받고 있다.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대규모 횡령과 부실 대출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감독 주체를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관련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새마을금고 조직의 반발과 지역 민원에 민감한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 등이 맞물린 결과다.
1963년 협동조합 형식으로 출발한 새마을금고는 전국 총 1284개가 운영 중이며, 자산 규모만 289조원에 달한다. 규모 면에서 이미 주요 시중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통제는 여전히 ‘계(契)’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취약하다. 이제 새마을금고를 금융당국의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감독 아래 둬야 한다. 그래야 반복되는 사고를 막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2 weeks ago
6
2 weeks ago
6
![[만물상] 아이들 함성이 ‘소음’?](https://www.chosun.com/resizer/v2/RYZZ64RUBVFJBBCJHE4UYVYHPU.png?auth=1748f5aac9ec3f71a0a7e42a9bc146c2d7dc1e8ab9a94652e9a82cfbbf44149c&smart=true&width=580&height=323)
![앞으로 5년…Fed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어떻게 바뀔까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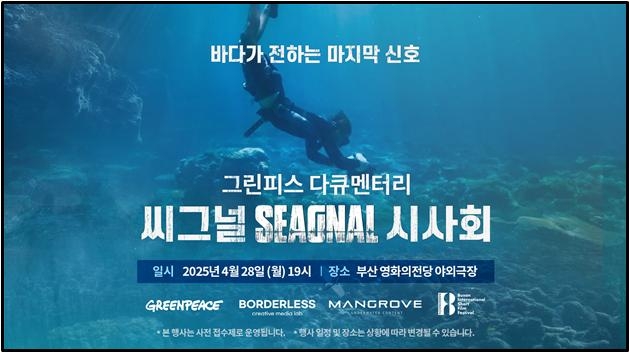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