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43주년 인터뷰] 정송 KAIST AI대학원 원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6/news-p.v1.20250916.86d0fbff590042ecb7dc77d199421b44_P2.jpg) [창간43주년 인터뷰] 정송 KAIST AI대학원 원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창간43주년 인터뷰] 정송 KAIST AI대학원 원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우리나라에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고급 인공지능(AI) 인재가 있습니다. 매년 최소 700명에서 1000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고, 이들이 가진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국내 기업 현장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정송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장은 한국의 AI 전략이 나아갈 방향은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리더십을 통해 인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 원장은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KAIST 석좌교수이자 KAIST AI 연구소장이자 최근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 과학 및 인재 분과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 원장은 한국의 AI 인재 양성 체계를 강점으로 꼽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년 전 시작한 AI대학원 사업을 통해 매년 최소 700명, 많게는 1000명의 석·박사 과정 인재가 배출되고 있다.
그는 “이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국가적 준비이며, 배출되는 인재들의 기량은 AI 분야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점이다.
![[창간43주년 인터뷰] 정송 KAIST AI대학원 원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6/news-p.v1.20250916.efbc034d84194e3fa2c90fc2cf830a18_P1.jpg) [창간43주년 인터뷰] 정송 KAIST AI대학원 원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창간43주년 인터뷰] 정송 KAIST AI대학원 원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국내 기업들이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프라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해외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더 과감한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떠납니다.”
정 원장은 AI 인재를 단순히 수치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AI 인재는 레이어(단계)가 있다”며 “학문적 연구를 이끄는 최상위 인재, 새로운 모델과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인재, 이를 뒷받침하는 반도체·클라우드 인력, 마지막으로 산업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도메인 전문가까지 단계가 있다”고 구분했다.
정 원장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레벨의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판이 국내에 없다”며 “결국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대학에만 남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KAIST만 해도 박사 과정 학생이 290명인데, 이 중 4분의 1이 미국 빅테크에서 인턴십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들이 풀어내는 문제는 스탠퍼드나 MIT 학생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데 GPU 자원이 부족하니 해외로만 눈을 돌리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필요 조건으로는 △우수한 동료 집단(피어 그룹) △충분한 GPU 인프라 △연구 자율성과 지속성 △경쟁력 있는 보상을 꼽았다.
그는 “연봉 차이도 크지만, 실제로 인재들이 가장 먼저 꼽는 것은 동료의 수준과 연구 자율성”이라며 “수직적 기업 문화도 인재들이 기업으로 향하는 것을 막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졸업 후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해외 기업으로 취업 등의 진로를 정한다고 말했다.
![[창간43주년 인터뷰] 정송 KAIST AI대학원 원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6/news-p.v1.20250916.4ce833a712d24842a2d887ba844053db_P2.jpg) [창간43주년 인터뷰] 정송 KAIST AI대학원 원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창간43주년 인터뷰] 정송 KAIST AI대학원 원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정 원장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팔을 걷어붙이고 기술의 미래를 직접 설명하며 전 세계를 이끄는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 기업에서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도 노동 환경이나 규제 등 나름의 고충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이해한다”며 “한편으로 GPU 인프라 구축에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태도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GPU를 지원한다면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대규모 자체 투자를 약속하고,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비전을 보이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결국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한국이 집중해야 할 차세대 전략 분야로는 '피지컬AI'를 꼽았다. 그는 “1단계가 텍스트 기반 학습이었다면, 2단계는 물리 세계에서 기계가 직접 행동을 배우는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로봇, 제조업 현장에서의 AI 적용이 바로 이 영역에 해당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행동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하기에 GPU와 더 큰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빅테크조차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이번 2라운드에서는 한국도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피지컬AI를 통해 제조업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정 원장은 AI 시대 교육의 고민도 언급했다. 그는 “AI는 직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직업 속 개별 과제를 대체하는 것”이라며 “결국 인간에게 남는 것은 기획력과 판단력”이라고 내다봤다.
![[창간43주년 인터뷰] 정송 KAIST AI대학원 원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6/news-p.v1.20250916.895ca7cbf9484623abd3f99f88bfc604_P1.jpg) [창간43주년 인터뷰] 정송 KAIST AI대학원 원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창간43주년 인터뷰] 정송 KAIST AI대학원 원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한편 교육 현장에서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판단력을 길러내던 과정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어떠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그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게 되겠지만, 동시에 인간 고유의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숙제”라고 내다봤다.
정 원장은 AI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 '소버린 AI' 구상도 제시했다.
“소버린 AI의 개념은 더 이상 한 나라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아세안까지 확장해 아시아 퍼시픽 단위의 블록을 형성해야 글로벌 기술 패권 속에서 주도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 원장은 이러한 노력들이 특정 부처나 정부 차원이 아닌 기업 모두가 앞장서 해야 할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이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필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결단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인재들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정 원장은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성패가 인재를 어떻게 붙잡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업이 스스로 '죽기 살기'의 각오로 비전과 투자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인재들은 외국으로 떠나거나 학교 안에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1 month ago
18
1 month ago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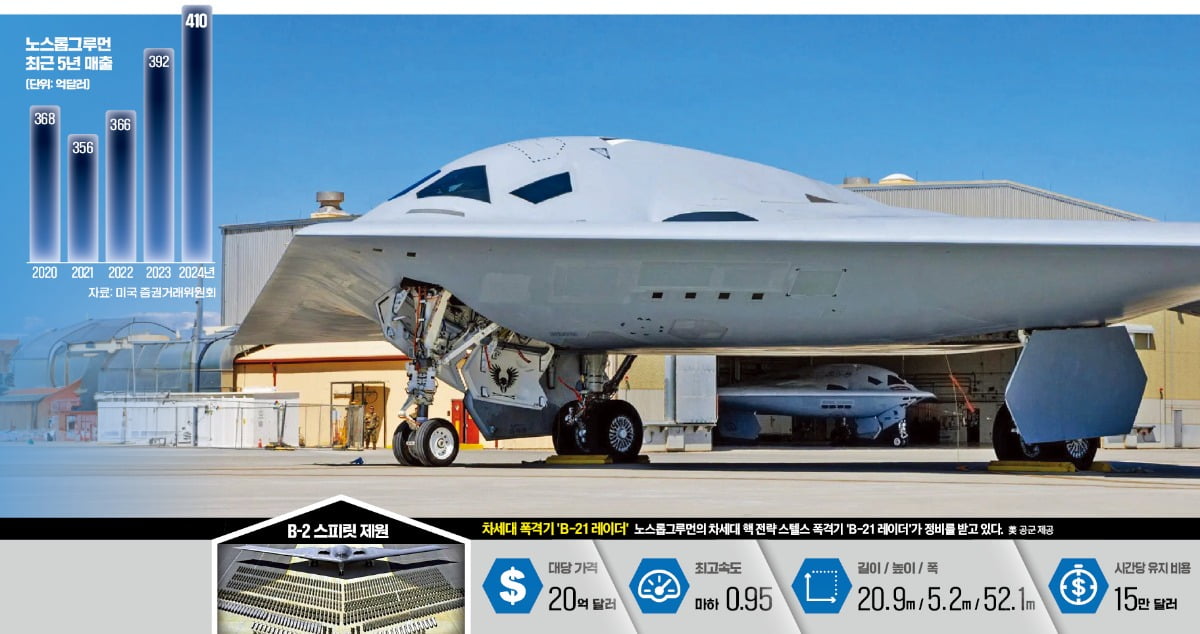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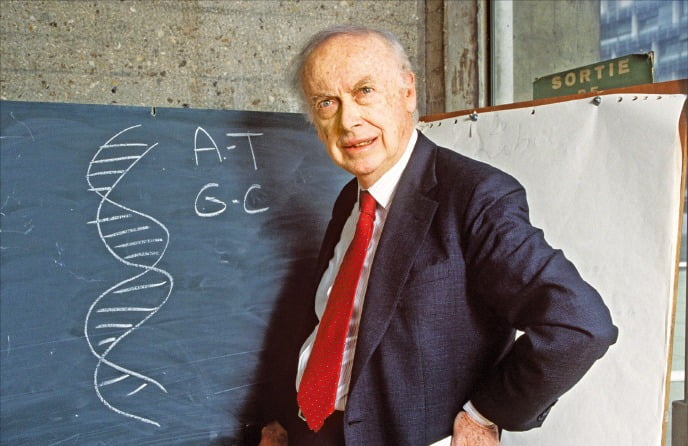







![닷컴 버블의 교훈[김학균의 투자레슨]](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