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최고기술책임자(CTO), AI 담당 총괄 임원들은 한목소리로 “한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인재, 데이터 3대 축을 균형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설문에는 대표이사(CEO) 48명, 최고기술책임자(CTO) 27명, AI 전략·기획 총괄 임원 14명, AI R&D 총괄 임원 13명, AI 사업화 총괄 임원 8명 등 총 1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산업계 현실과 글로벌 흐름을 토대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꼽은 화두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였다. 한 AI 전략·기획 총괄 임원은 “기업에 불확실성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은 불가능한지가 정부가 확실히 가름해줘야 글로벌 AI 3대 강국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현장의 애로를 전했다.
기업들은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버티컬 AI를 당장의 합리적 선택으로 보면서도, 국가 차원에서는 범용 인공지능(AGI) 경쟁력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 CTO는 “AGI는 산업 전반을 넘어 안보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고, 국제적 주도권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GPU와 전력 인프라 확보 없이는 글로벌 경쟁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주류를 이뤘다. 엔비디아 GPU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장기적으로는 AI 반도체 국산화와 전력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AI 칩·하드웨어 업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필요성도 제시됐다.
인재 문제는 최고위 경영진이 공통적으로 호소한 과제였다. 한 CEO는 “우리는 인재를 많이 양성했지만 질적인 측면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해외 빅테크가 한국 출신 박사급 인재를 빼가고 있어, 귀국 인재가 국내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국·중국처럼 인재·투자·데이터를 대규모 투입하는 전략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만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제조업 강국의 특성을 반영한 피지컬 AI, 산업별 특화 AI 등이 대표적이다.
단순히 모델 경쟁에 집중하기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생태계 육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검색·메신저·콘텐츠 플랫폼처럼 생활 속 서비스에 AI를 녹여내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통찰이다.
한 AI 사업화 총괄 임원은 “AI 강국을 위해서는 서비스 중심의 지원과 투자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한국은 구글 검색을 이긴 네이버, 카카오톡 같은 세계적 서비스를 만든 나라로 AI 서비스에서도 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AI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1 month ago
9
1 month ago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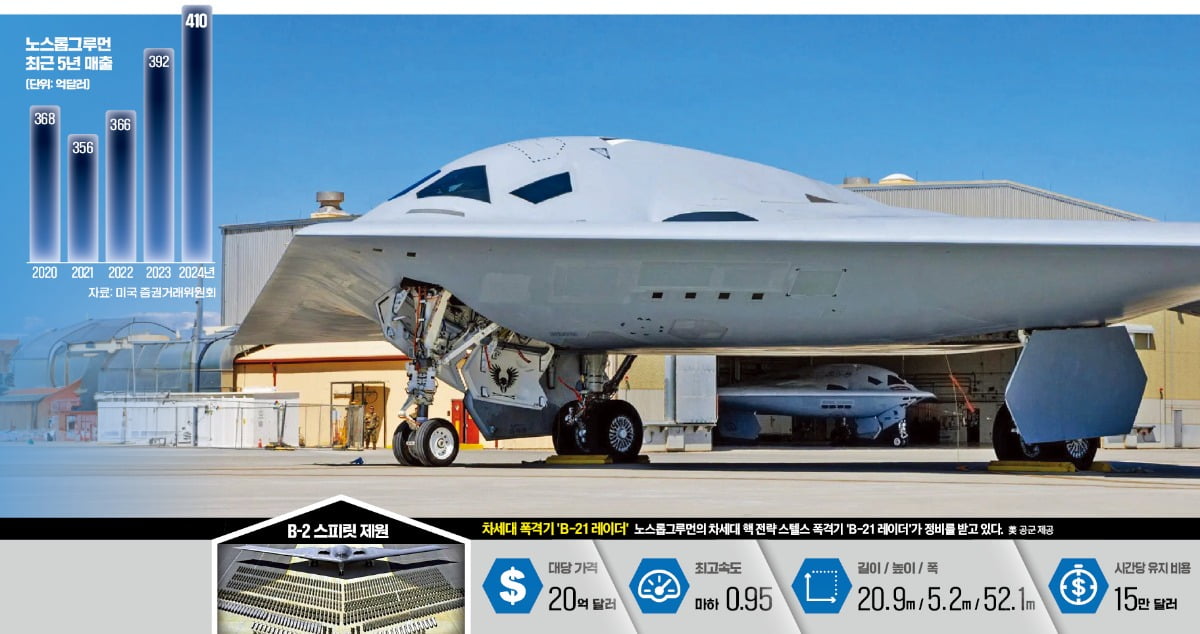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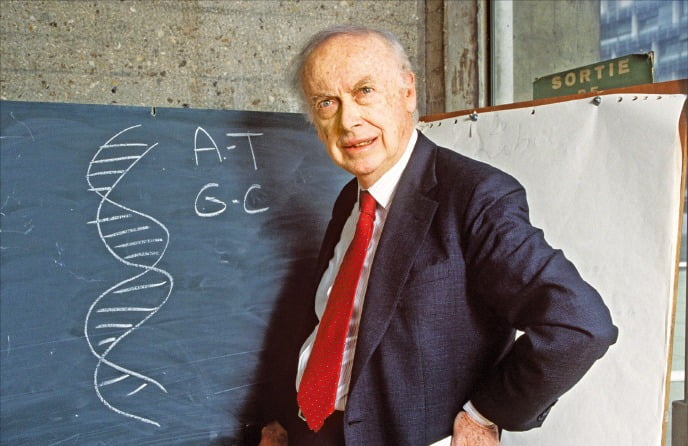







![닷컴 버블의 교훈[김학균의 투자레슨]](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