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부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차를 타고 서쪽으로 1시간을 달리면 미국 명문 공립대학인 미시간대 앤아버캠퍼스가 나온다. 미시간대는 우주항공, 자동차, 추진체, 국방, 로봇 등 분야에서 100여 년간 세계 최고 인재를 미국에 공급해온 동부의 대표적인 ‘엔지니어 팜’이다. 지금껏 노벨상 수상자 26명,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 비행사 7명을 배출했다. 녹음이 우거진 광활한 캠퍼스에 들어서자 바람을 형상화한 풍동 실험장 앞 가든에서 로켓 모형을 들고 추진체 실험을 하는 학생들이 눈에 들어왔다. 대부분 아시아·히스패닉계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도 오로지 실력으로 해외 인재를 수혈한다는 미시간대의 학생 선발 정책을 실감할 수 있었다.

◇ 다양성이 만든 연구 환경
앤아버캠퍼스에서 만난 칼로스 세스닉 미시간대 항공우주공학과 학과장은 미시간대의 경쟁력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유입을 꼽았다. 그는 “소수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편견 없이 오로지 능력과 비전을 투명하게 평가해 우수 학생을 받아들인다는 취지”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야 더 많은 아이디어가 융합돼 기술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강조했다.
미시간대 공대는 일찍이 소수계 이민자와 여성을 위한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을 펼쳤다. 백인 상류층 남학생을 선호하던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입학 사정 과정이 180도 달랐다. 일례로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유대인 입학생 수를 할당제로 제한하자 많은 우수 유대인 학생이 대거 미시간대 공대로 유입됐다. 이후엔 북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히스패닉계 인재가 미시간대로 몰려들었다. 미시간주가 소수자 우대 정책을 법으로 금지한 뒤에도 미시간대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울버린 패스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이민자를 우대하고 있다.
이 정책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기준 미시간대 신입생들은 90여 개국에서 입학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도 미시간대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음속의 6~7배에 달하는 ‘스크램제트’ 엔진의 초음속 연소현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윤 청장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분위기는 자유로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고 말했다. 미시간대는 다양성 정책을 통해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엔지니어를 배출했다. ‘우주항공 추진체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설적 엔지니어 켈리 존슨과 1969년 아폴로 11호의 비행 소프트웨어(SW) 설계 책임을 맡은 NASA의 첫 여성 과학자 마거릿 해밀턴이 대표 인물이다.
우리 정부도 우수 해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뚜렷한 변화가 없다. 지난해 8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주 분야에서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비자 사다리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현재 이 논의는 멈춰 서 있다. 유학생과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 행정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미시간대, 우주 생태계 조성으로 진화
오히려 민간에서 ‘미시간대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이 2020년부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적의 외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등 민간에서 물꼬를 튼 게 대표 사례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국립대, 반둥공과대, 가자마다대, 베트남하노이국립대, 베트남호찌민국립대 등과 협약을 맺고 ‘동남아 일꾼’이 아니라 ‘동남아 브레인’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미시간대에서 학위를 딴 박형준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민간 우주 시대를 개척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생해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넘어간 이민자 출신”이라며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내겠다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흑인과 여성, 아시아계를 배치한 것 역시 NASA가 다양성을 우주 탐사의 미래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미시간대가 글로벌 우주공학의 인재 산실로 불리는 것도 이 같은 인재 정책 덕분이다. 한발 더 나아가 최근 미시간대 항공우주공학과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전략적 비전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세스닉 학과장은 “과거 우주 탐사가 출혈적 경쟁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협력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이미 정부를 비롯해 민간, 대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우주 생태계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시간대 항공우주공학과는 교원 수를 50여 명 수준으로 보강했다. 우주학과로선 세계 최대 규모다.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는 교원이 15명에 불과하다.
앤아버=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1 month ago
20
1 month ago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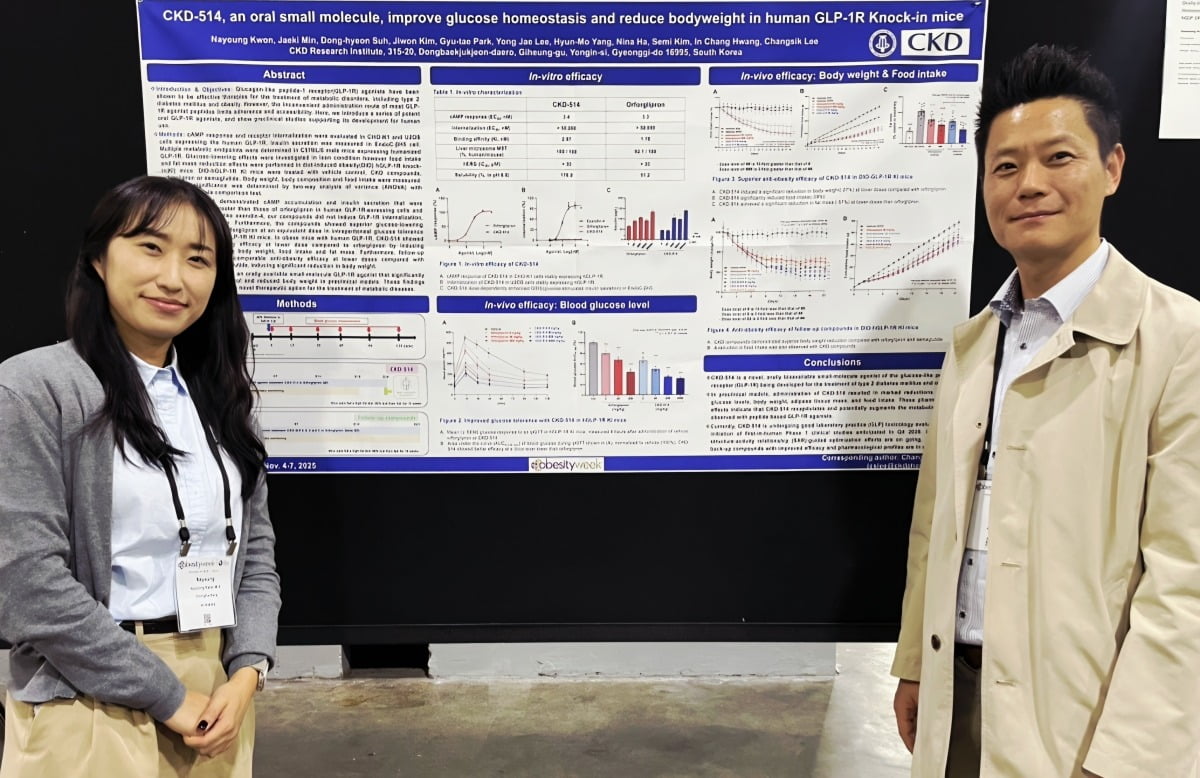

![누코드 “누구나 쉽게 IoT 제품/서비스 만드는 모듈기반 생태계 구현”[서울과기대 x 글로벌 뉴스]](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5/11/10/b223d1941a274eaf-thumbnail-960x540-70.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