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특례시가 광역철도 확충의 변곡점을 도시 재설계의 기회로 삼고 있다.
설계판을 직접 그리는 사람은 이재준 시장으로, 그는 도시계획 전문가다. 이 시장은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로 개통이 확정된 22개 전철역을 콤팩트시티로 전환, 주거·일자리·문화가 15분 생활권에서 만나는 구조를 지향한다.
9개 전략지구를 내년 상반기 착수해 2030년까지 단계 완료하고, 용적률 완화는 공공기여와 연동한다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지침·조례 정비로 실행력을 담보하고, 생활SOC·보행·녹지 네트워크를 먼저 확보해 원주민 보호와 체감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도시는 도심 개발용지 462만8099㎡(약 140만평), 생활SOC 23만1404㎡(약 7만평), 인구 3만명 유입을 목표로 삼았다. '도면'과 '집행'을 아우르는 도시계획가의 손끝이 이번 승부의 성패를 가른다.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준 수원시장.‘수원 대전환’과 역세권 복합개발을 한 축으로 묶어 설명한다면.
경제·공간·시민생활 세 축이 동시에 돌아가야 지속가능하다. 경제 쪽에선 21개 첨단기업 유치,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수원 연구개발(R&D) 사이언스파크가 가속 중이고, 공간 축 핵심 기어가 역세권 복합개발이다. 생활 축은 시의회 여야와 합의한 '시민체감 숙원 사업'으로 현장 체감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타이밍도 명확하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인덕원~동탄선, GTX-C, 수원발 KTX 직결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14개 전철역이 사업 완료 시 22개로 늘고, 경기남부광역철도까지 반영·개통되면 30여 개까지 확대된다. 교통망 대전환기에 역세권을 15분 생활권으로 재설계해야 도시 구조가 바뀐다.
공간 기준과 운영 원칙을 ‘숫자’로 짚어준다면.
기준은 승강장 반경 300m다. 보행 밀도와 직장 인구 데이터를 같이 보고, 밀도가 현격히 높은 수원역·수원시청역은 500m로 확장했다. 역세권은 시 면적의 5%(약 140만평)에 불과하지만 인구 20%, 유동인구 40%가 모인다. 반면 건축물 노후도 70% 이상, 기반시설률 18%(도시 평균 40%)라서 구조적 처방이 필요하다. 원칙은 간단하다. 용도는 복합화, 기능은 집적화, 기반은 선 확보다. 업무·주거·상업·문화·공공을 한 그릇에 담고, 도로·공원·생활SOC를 먼저 채워 난개발을 막는다.
개발 유형과 현장 적용을 사례로 묶는다면.
도심·부도심 및 환승거점은 업무·상업 복합의 도심복합형, 대학·첨단업무 배후지는 자족 기능을 키우는 일자리형, 노후 주거지는 생활 인프라를 보강하는 생활밀착형으로 간다.
영통역은 환승(인덕원~동탄선)을 발판으로 공유오피스·업무시설과 복합상업·문화·편의시설을 얹어 도심형 복합업무 지구로 키운다.
성균관대역은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와 수원R&D사이언스파크를 잇는 축 위에 창업보육센터·창업지원주택·공유오피스·지식산업센터를 담아 청년창업 혁신지구로 만든다.
고색역은 델타플렉스 배후 수요에 맞춰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고,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생활SOC, 녹지·보행축을 촘촘히 엮어 '젊은 생활지구'로 바꾼다.
로드맵·참여구조·행정지원은 하나의 패키지로 간다는데.
공공개발 연계성과 대학 인접성 등을 반영해 9개 역세권 230만㎡(약 70만 평)를 전략지구로 우선 지정했다.
고색·구운·북수원파장·성균관대·수원·수원월드컵경기장·수성중사거리·영통·장안구청역이다. 내년 상반기 착수, 2030년까지 순차 완료가 목표다. 참여는 개인·법인·신탁사 등 민간과 공공에 폭 넓게 열고 면적은 1500㎡~3만㎡ 범위로 유연하게 잡았다. 시는 사전 타당성부터 기본계획(안) 수립을 지원하고 '역세권 복합개발 전문가 자문단'으로 디자인·교통·환경·사업성까지 컨설팅한다. 인허가 기간을 줄여 속도를 내고, 공공기여로 기반시설·생활SOC를 확정적으로 확보한다. 관련 조례는 이달 공포,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개정 중이다.
규제 완화·공공기여·법적 근거를 한 세트로 설명해 준다면.
균형을 설계에 넣었다. 시행자가 토지면적가치의 15%를 기반시설·공공건축물로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100%, 지역 활성화 시설을 일정 비율 확보하면 +200%,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기후대응 건축물, 관광숙박 등 시 정책과 부합하면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최대 +300%까지 허용한다.
대신 지구단위계획으로 스카이라인·보행 네트워크·열린 공간·녹지 의무를 엄격히 관리한다. 법적 근거는 도시기본·관리계획을 포괄하는 국토계획법 제52조의2다. 중앙정부 '도심복합개발법' 대비 사업 기간·공공기여·행정지원에서 현장 대응이 빠르게 움직이도록 설계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을 설명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을 설명하고 있다.서울의 역세권 활성화와 비교하면, 수원형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서울시는 2019년부터 47개 역세권을 종상향 중심으로 압축·복합을 유도했다. 수원은 기초지자체 최초로 22개 전 역세권을 일괄 관리하되 유형별 맞춤 설계를 조성한다. 15분 도시를 공통값으로 적용하고, 보행 네트워크·열린 공간·녹지 축을 의무 도입한다. 인센티브-공공기여-디자인 관리를 패키지로 묶어 균형을 잡는 게 다르다.
젠트리피케이션과 형평성 논란은 어떻게 방지하나.
생활밀착형 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공임대·공공상가·공유오피스를 함께 배치해 생업과 생활을 붙여 놓는다. 보행 생활권 안에 돌봄·의료·교육·문화 시설을 의무 확보하고 단계별 이주·재정착을 지원한다. 상승하는 가치가 원주민 삶을 밀어내지 않도록 제도·설계·재정지원 삼박자를 동시에 작동시킨다.
시민이 체감할 결과를 수치로 보여 달라.
완료 시 도심 개발 용지 약 140만평, 생활SOC 약 7만평을 공급한다. 인구 3만명 유입, 녹지 대폭 확충을 기대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30조원, 고용효과 25만명으로 본다. 요약하면 '집 가까운 일자리와 서비스, 걷는 도시'다.
핵심 거점 세 곳을 한 문장씩 정의하면.
영통은 환승 기반의 도심형 복합업무 지구, 성균관대는 산학연 연계 청년창업 혁신지구, 고색은 산업 배후 수요를 품는 젊은 생활지구다. 기능은 다르지만 보행·녹지축으로 연결돼 하나의 생활권처럼 작동한다. 이 프로젝트는 22개 역세권을 수원의 새로운 생활·일자리·문화 거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약속은 지키고, 속도는 내되, 품질은 더 높이겠다.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1 month ago
14
1 month ago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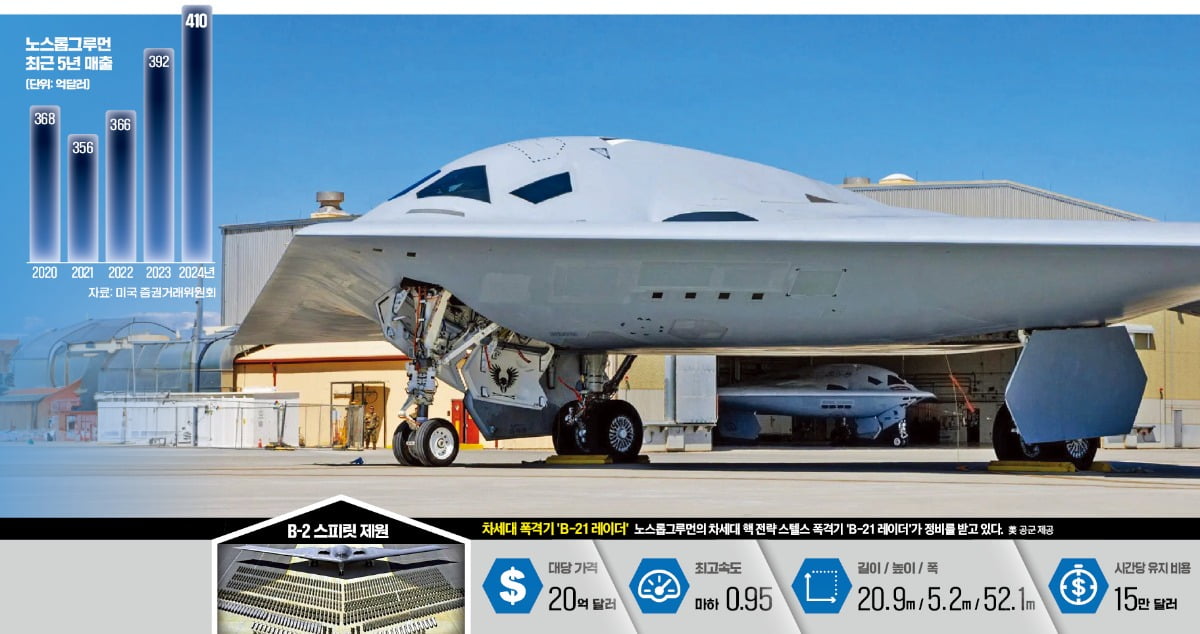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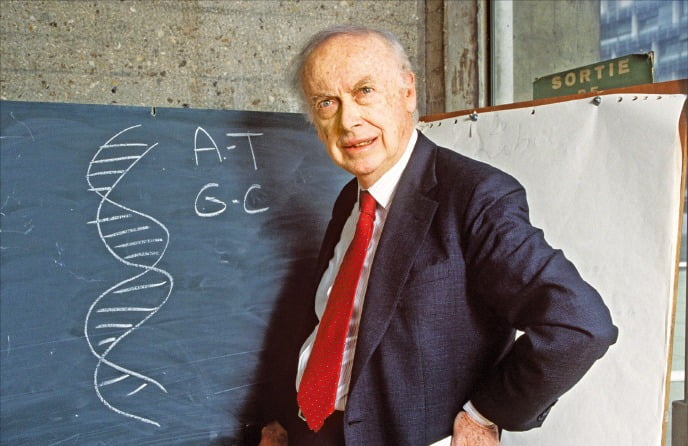







![닷컴 버블의 교훈[김학균의 투자레슨]](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