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올 추석 기차표 예약을 앞두고 KTX 예매 시작 시간인 지난 17일(경부선) 오전 7시에 접속해봤다. KTX 사이트는 대기 시스템 접속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와이파이, LTE 등 통신망을 수차례 반복 실행하다 시도한지 36분 만에 접속됐지만 부여된 대기번호 102만6359번! 기다린다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접속돼도 구매할 수 있는 티켓이 대부분 매진 상태였다.
앞서 명절이나 수강신청일 등, 특정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몰려드는 접속자로 인해 디지털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한때 국가사회적 불편이자 기술적인 난제로 치부됐다. 대부분 장비를 증설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해왔지만 이 또한 막대한 예산 부담의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본연의 공공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년에 몇 번 있는 특정 이벤트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재정당국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때 등장한 접속자를 제한하는 대기번호표(대기열) 기술은 디지털 트랜잭션을 제어 솔루션으로, 급증하는 사용자 접속 요청을 실시간으로 컨트롤해 서버 장애를 예방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시스템 안정화에 중점을 둔 소프트웨어(SW)다. 초과 트래픽을 자동 대기시키고 순차 처리해 사용자가 폭주해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줌으로써 수강신청, 결제, 대규모 이벤트 등 트래픽이 폭증하는 환경에서 서버 다운을 막아준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이 필요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주로 도입했고, 2010년대 이후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됐다. 제한된 수의 접속자만 받아들이고 나머지에게는 대기번호를 부여해서 순차 처리하는 방식은 서비스 마비(중단)를 막는데 분명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체계가 장기화되면서 그 효과가 곧 안일함으로 이어졌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대기번호표(대기열) 솔루션을 시스템 안정화를 유지하는 고육책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시스템 고도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민의 시간을 소비하는 '대기'를 당연한 비용으로 치부하며 혁신 의지를 잃어버렸다. 국민의 시간을 담보로 삼는 방식이 표준처럼 굳어진 것이다.
과연 대기열 화면 앞에서 수십 분, 혹은 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정당하고, 세계 1위라는 대한민국의 디지틸서비스 위상에 걸맞는 디지털정책인지 묻고 싶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토스케일링 또는 핫 스탠바이 서버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최신 기술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과부하 예측 및 대응 솔루션을 도입해 과거 트래픽 패턴을 학습해 과부하 발생 전에 자원을 할당하는 등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트래픽 예측 및 분산처리, 동적 캐싱 등 기존보다 향상되거나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해 사용자 폭주로 인한 서비스 안정화, 대기시간 최소화 등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있는데 정부와 기업의 대민 서비스는 여전히 국민을 대기열에 가두고 있는 것이다.
대기열 솔루션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스템 안정화'의 대책 중의 하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국민의 시간을 볼모로 삼는 현재의 디지털서비스 환경은 근본적인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들이 국민 기다림에 기대지 않고, 국민이 기다릴 필요 없는 서비스를 만드는 날이 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혁신이며,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과 책임을 지키는 길이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khy0@korea.ac.kr

 1 month ago
9
1 month ago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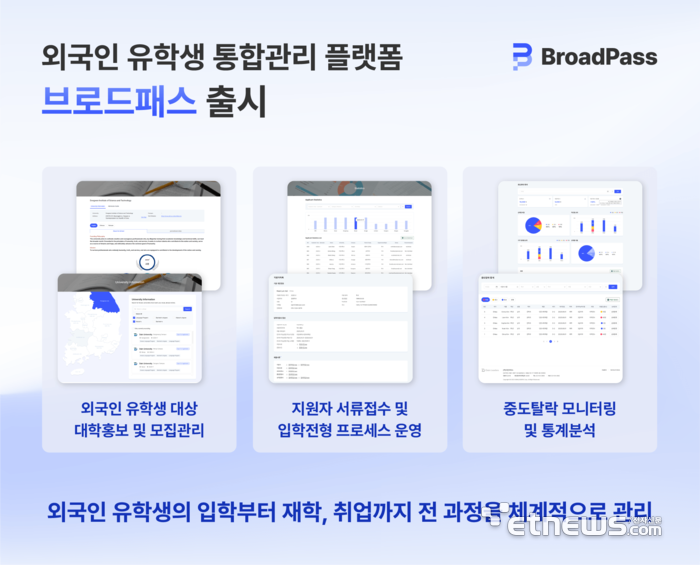
![[이런말저런글] 사약은 하사하는 약, 노점은 이슬맞는 점포?](https://img5.yna.co.kr/etc/inner/KR/2025/11/07/AKR20251107045500546_01_i_P4.jpg)











![닷컴 버블의 교훈[김학균의 투자레슨]](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