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오늘까지 열리는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 ‘현금 지원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됐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주도해 미국 일리노이·텍사스주 저소득층 10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대표적이다.
대회에 참석한 오픈리서치 연구진은 기본소득 월 1000달러 지급 집단의 연 소득(지원금 제외)이 월 50달러를 지급한 비교군보다 2000달러가량 적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시간을 주당 1~2시간씩 줄인 때문이다. 현금 지원으로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나설 것이란 기본소득론자들의 기대도 빗나갔다. 줄어든 근로로 얻은 여유 시간을 교육·재취업 등 생산적 활동으로 대체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분석한 ‘서울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 결과도 비슷하다. 현금을 지원받은 저소득층 수입을 3년간 추적해봤더니 노동소득(지원금 제외) 25% 감소, 고용률 12%포인트 하락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교수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디딤돌 소득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면 자본 축적이 줄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련의 연구 결과는 일시 불평등 완화, 소비 증가라면 모를까 기본소득으로 노동시장 활성화, 경기 진작 같은 중장기 정책목표 달성은 힘들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생지원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에 집중하는 이재명 정부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소비쿠폰이 풀리자마자 내수 회복이 감지된다’며 반색하지만 돈이 풀린 데 따른 ‘반짝 회복’의 성격이 크다.
그제 발표한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대거 포함된 여러 소득 지원 방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 재원 210조원 중 58조원을 ‘기본사회’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젊은 층에 목돈을 쥐어주겠다며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매년 한 살씩 높이는 등 현금 지원 방안이 수두룩하다. 현금 이전보다 교육·재취업·의료 등 다층적 지원망 구축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는 학계 조언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3 hours ago
1
3 hours ago
1
![[다산칼럼] 트럼프 관세 폭탄이 몰고 온 혼돈과 기회](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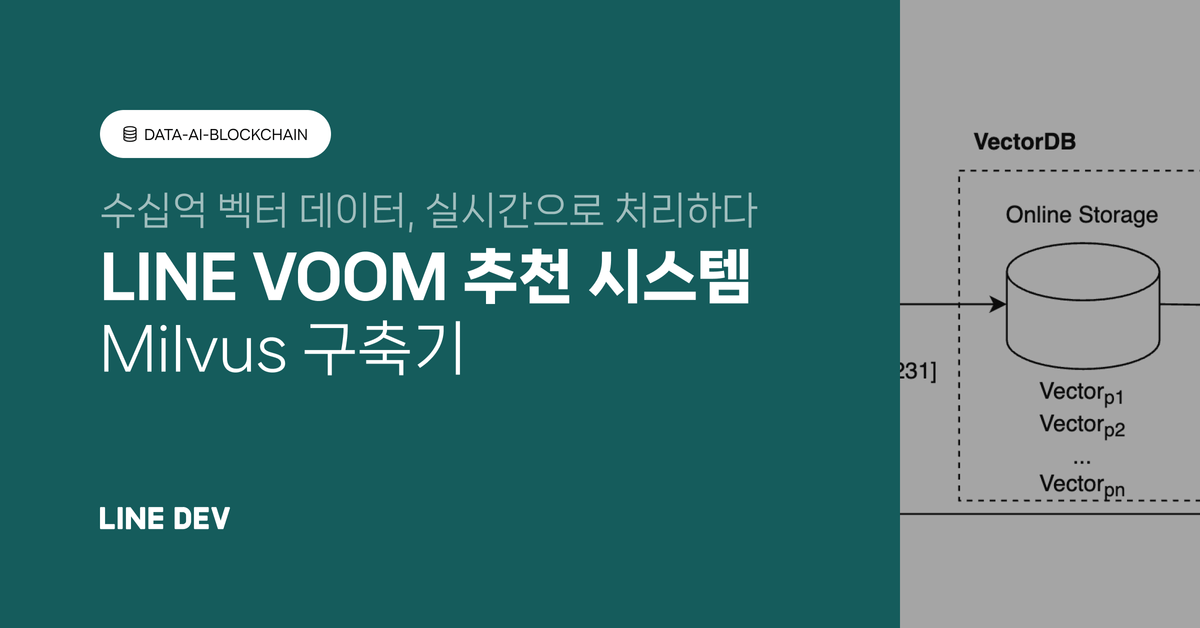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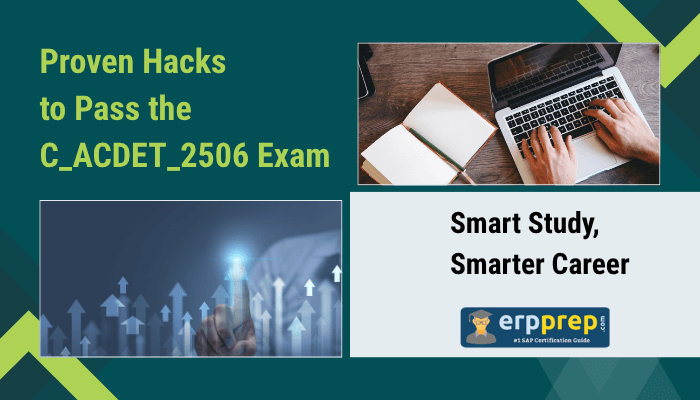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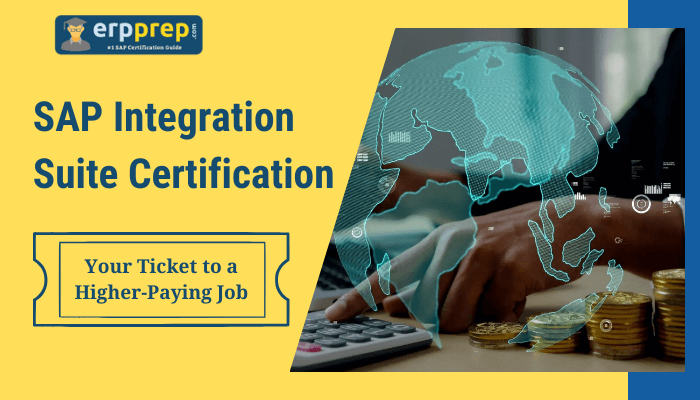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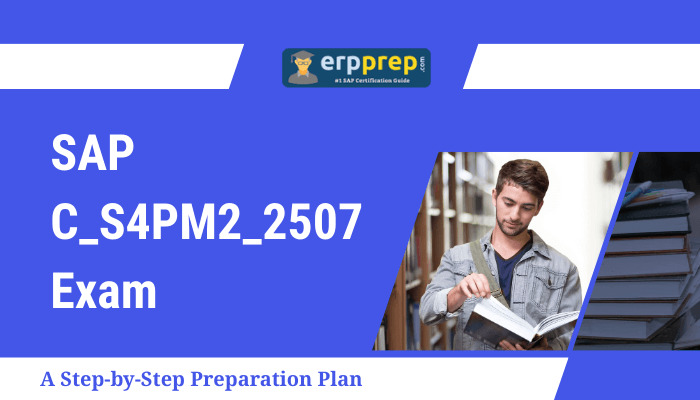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