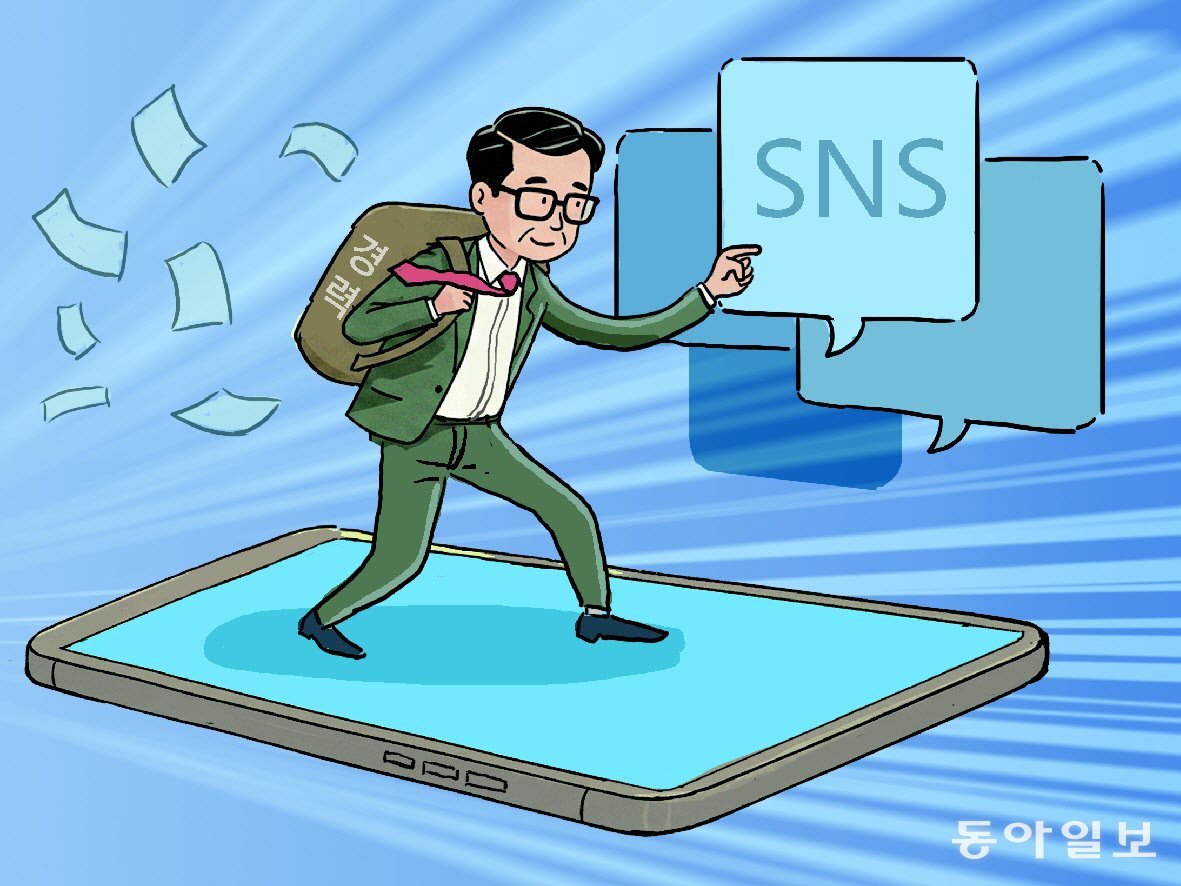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한 청년이었다. 그는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중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면접 서적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었다. 청년은 나를 보고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일어나려는 시늉을 했다. 나는 그에게 괜찮다고 손짓하며 조용히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다 했어요.” 묘한 감정이 들었다. 도서관에서의 상황이 우리네 인생과 닮아 있었다. 나는 퇴직 후 진로 때문에 걱정이 많았고, 청년은 취업을 위해 애쓰는 듯 보였다. 나와 청년, 우리는 서로 다른 세대지만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돌아보면 퇴직 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제는 쉬어도 된다’는 위로였다. 솔직히 나는 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아직은 내게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이런 나의 생각을 바꾼 건 선배의 한마디였다. “우리가 자리를 내줘야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어.” 그 말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욕심을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의문이 들었다. 과연 내가 내어준 자리가 정말 젊은 층에 돌아갔을까? 공채 규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게다가 2024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청년이 첫 일자리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1.5개월로 나타났다. 학업을 마친 청년 상당수가 곧바로 취직을 못 한다는 의미다.결국 기성세대의 퇴직으로 마련된 자리가 청년 세대에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설령 백번 양보해 자리가 그대로 이어진다 치더라도 퇴직자 또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한다. 만약 재취업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 보길 바란다.
첫째, 기존 경력을 살려 전문가가 되자. 퇴직 후에는 다른 일을 구하기보다 해왔던 일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키우는 편이 유리하다. 그러려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우리에겐 경험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나만의 강점을 세상에 맞게 다듬어가면서 컨설팅이나 멘토링 등에 도전해 보면 좋겠다. 초기에는 무료로 시작해 점차 실력을 쌓는다면 훗날 멋진 직업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나는 이 점을 퇴직 후 몇억 원을 날리고서야 깨달았다. 무작정 남들이 잘될 거라는 일을 따라 한 게 화근이었다.
둘째,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적응하자.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빠르게 생겨나고 있다. 디지털화, 고령화 등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해도 전에 없던 일거리를 만날 수 있다. 프리랜서가 대표적이다. 고용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식의 일과 삶을 설계할 바탕이 다져진다. 나 역시 한 회사와 우연한 계기로 작업을 했다. 모 기업 홍보 영상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 제안 메일을 보냈더니 얼마 뒤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덕분에 나는 콘텐츠 기획자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그 후로도 여러 회사와 단기 계약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셋째, 플랫폼을 활용해 기회를 만들자. 퇴직한 뒤에는 주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폭넓은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동문, 직장 동료 등과의 소통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다. 내 경우도 업무 제의가 들어오는 루트가 대부분 소셜미디어다. 내가 쓴 글이나 출연한 영상을 보고 연락을 해온다. 처음엔 할까 말까를 크게 고민했는데 요즘 내게 온라인 플랫폼은 제일 귀중한 보물이 됐다.어쩌면 퇴직 후의 삶은 ‘자리 찾기’의 과정인지도 모른다. 이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고정된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퇴직자인 나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달라졌고 무엇보다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의 형태가 변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소속이나 명함이 아니라 이 순간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다. 앞으로는 ‘어느 회사의 누구’로서가 아닌, ‘어떤 일을 하는 나’로서 살아보자. 내가 하는 일로 나를 설명할 수 있다면 두 번째 퇴직은 없다.
나는 도서관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청년의 취업을 응원했다. 봄은 새출발을 상징한다지만 모든 시작이 봄에 일어나는 건 아니다. 모쪼록 올해가 가기 전에 퇴직자들 저마다 인생 꽃이 활짝 피어나길 소망한다.
정경아 작가·전 대기업 임원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month ago
3
1 month ago
3
![둘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 [권지예의 이심전심]](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