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그 많던 현금은 다 어디 갔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7.40456825.1.jpg)
급여 봉투를 손에 쥐고 집으로 달려가던 가장의 뿌듯함, 설날 세뱃돈을 받고 잔뜩 신난 아이의 웃음 그리고 돼지저금통을 가르며 동전을 하나하나 꺼내던 순간까지. 현금은 오랫동안 우리 삶의 한복판에 있었다. 지폐의 잔잔한 촉감과 동전이 부딪치는 소리는 단순한 의미의 ‘돈’을 넘어 삶의 구체적인 감각이자 한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정서였다. 한때는 지폐와 동전을 손으로 헤아려 값을 치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었다.
오늘날 현금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현금 사용 비율은 10% 남짓으로, 오프라인 결제 금액의 90%는 카드와 페이 등 비현금 수단이 차지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를 실감할 수 있다. 버스에 올라 교통카드를 찍는 중학생, 점심값을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하는 직장인, 동전 하나, 지폐 한 장 없는 지갑. 우리는 어느새 ‘현금 없는 사회’를 너무도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다.
현금은 전기나 통신망에 의존하지 않기에 정전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일본처럼 지진이 잦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현금 사용 비율이 40%를 넘는다. 현금은 분실이나 위·변조가 가능하고, 거래 흐름도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 익명성으로 인해 탈세나 불법 자금 유통에 악용되기도 하니, 현금 사용이 줄어들수록 경제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현금이 사라진 자리는 플라스틱 카드와 모바일 앱이 빠르게 채웠다. 1988년 서울올림픽 직후 본격화한 국내 카드 산업은 ‘후불’이라는 편리함에 포인트와 마일리지 같은 혜택을 얹어 급격히 확산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카드사 앱카드와 테크기업의 ‘페이 군단’이 등장하며 스마트폰 속 작은 아이콘 하나가 지폐와 동전을 대신하고 있다. 기술은 돈의 외형을 축소시키고 본질만 남겨뒀다.
현금의 ‘진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은 블록체인 기반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를 위한 ‘프로젝트 한강’을 시작했다. 현실화한다면 카드나 페이조차도 과거 지폐처럼 구식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기업은 안면인식 결제 매장을 시범 운영 중이며, 미래에는 ‘지갑’이라는 단어조차 사어(死語)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전에는 주머니 안쪽에서 쉬이 잡히던, 그 많던 현금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제는 전산망 어딘가에 0과 1의 디지털 기호로 저장돼 있을 것이다.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 그렇지만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돈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마음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밥을 사고, 고마움을 표현하며, 축하의 뜻을 전한다. 그 도구가 지폐 대신 카드 한 장이 됐고, 이제는 스마트폰 속 아이콘으로 변했을 뿐이다.
언젠가 또 다른 형태의 돈이 등장하겠지만 그때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돈을 통해 나누는 마음, 연결의 의미일 것이다. 지갑은 사라질 수 있어도 함께 나누는 정(情)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현금이라는 따뜻한 감촉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기억과 마음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5 hours ago
1
5 hours ago
1
![[이철희 칼럼]트럼프 넉 달, 요란한 ‘문워크 외교’](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19/131640301.1.jpg)
![[횡설수설/이진영]토종 방송 초토화시키고 ‘넷플릭스 천하’ 연 규제 불균형](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19/131640297.1.jpg)
![[오늘과 내일/박용]청년은 기회, 노년은 소득이 없는 나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19/131640278.1.jpg)
![[광화문에서/김지현]남녀 구분 짓는 공약 자체가 정치권의 낡은 편 가르기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19/131640269.1.jpg)
![[신문과 놀자!/풀어쓰는 한자성어]任重道遠(임중도원)(맡길 임, 무거울 중, 길 도, 멀 원)](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19/131640176.1.jpg)
![[신문과 놀자!/피플 in 뉴스]인도서 무슬림 분리해 파키스탄 건국한 ‘진나’](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19/131637157.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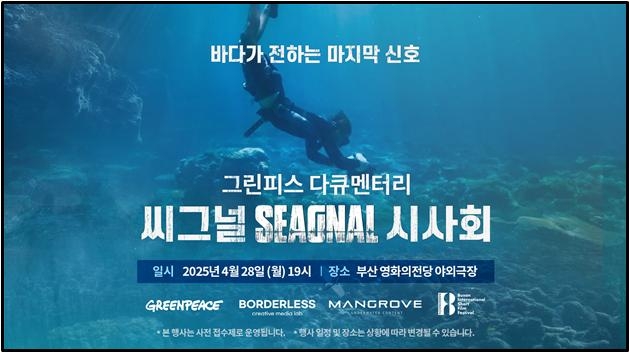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