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국가신용등급은 한 나라의 '빚 갚을 능력'을 재는 지표다. 그 뿌리는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채권 시장에 있다. 남미 독립국들이 채권을 남발하자 채권자들은 부도 리스크를 가늠할 기준이 필요했다. 이후 신용평가가 제도화됐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975년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피치가 합류하면서 국제 신용평가 체계가 세워졌다. 그 파급 효과는 점점 커졌다. 한 단계 하락만으로도 수십조 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한 단계 상승으로 국가 경쟁력이 덩달아 올라가기도 한다.
무디스·S&P·피치 등 '빅3'가 국가신용등급을 쥐락펴락한다. 이들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 채권자와 투자자는 빅3를 신뢰한다. 이에 각국 정부와 기업이 등급 유지에 촉각을 세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AAA' 등급을 부여했다. 치명적 오류였지만, 빅3의 영향력은 줄지 않았다. 국가신용등급 평가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정치적 안정성 등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 산정 방식은 베일 속에 있다. 그래도 세계는 이들의 등급에 따라 움직인다.
피치가 지난 12일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했다. 강등 배경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 정치 분열과 양극화, 연금개혁 반발 등이 꼽히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5.8%로 유로존 평균(약 3.1%)을 크게 웃돌았다. 국가부채는 GDP의 113%를 넘어 유로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마크롱 2기 행정부가 2년이 채 되지 않아 총리를 다섯 차례나 교체할 정도로 긴축 정책을 둘러싼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무디스가 작년 12월 신용등급을 내렸고, S&P도 신용등급 강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복지지출 확대는 주요 선진국의 공통된 고민이다. 복지지출은 한번 늘리면 어지간해선 줄일 수 없는 경직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포퓰리즘이 겹치면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지난 5월 재정적자 확대 우려로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된 바 있다. 유럽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비까지 대폭 늘려 재정 압박이 거세졌다. 신용등급은 미래의 재정 여력을 가늠하는 잣대다. 세계 경제가 둔화하면 신용평가사는 더욱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무디스 'Aa2', S&P 'AA', 피치 'AA-'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기 등급까지 추락했던 것을 상기하면 놀라운 성과다. 하지만 이젠 방어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저출산·고령화, 복지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신용등급은 외국 자본이 그 나라를 얼마나 믿는지 보여주는 척도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등급 하락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성장 둔화로 돌아온다. 한국도 방심해선 안 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9월15일 07시09분 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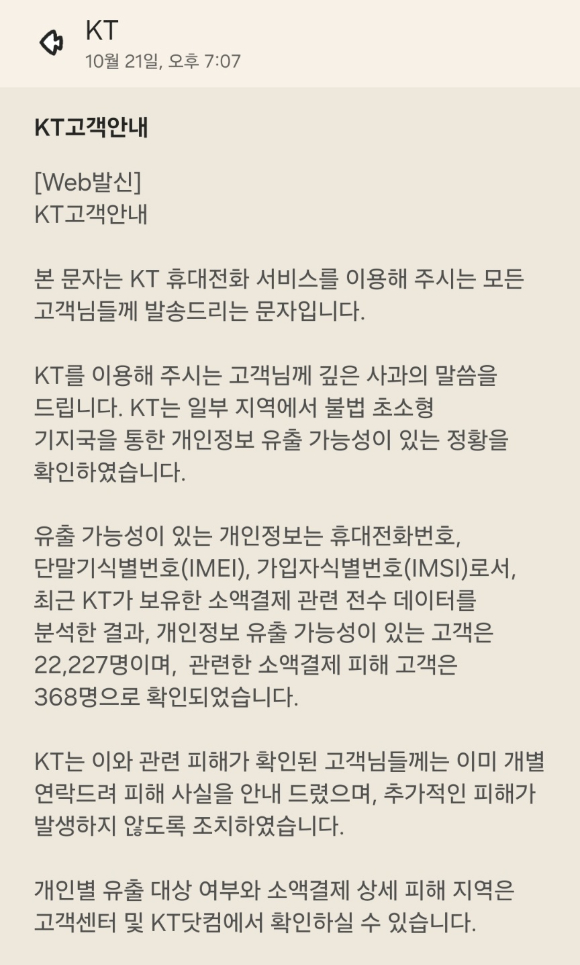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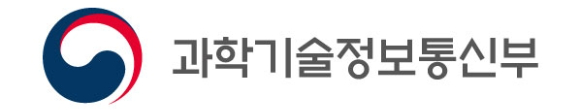
![KT, 위약금 환급 절차 개시⋯전체 가입자 면제 여부는 '아직' [2025 국감]](https://image.inews24.com/v1/ee8954b2754abe.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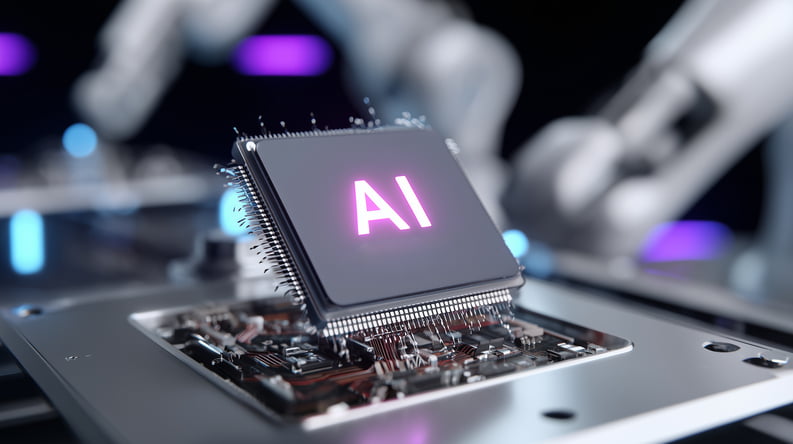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