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투자에는 반드시 실패가 따른다. 투자 리스크가 큰 업종에서는 10개 프로젝트 가운데 두세 개만 건져도 성공으로 평가된다.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 등의 경영 판단은 10년 이상 지나 성패가 결정되는 일도 많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실패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돋보기’를 들이대거나, 적자가 난 특정 시점에 손해의 책임을 물어 배임죄로 처벌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정권 차원의 ‘기업인 손보기’ 수사를 벌일 때 단골 죄목 가운데 하나가 배임죄였다.
한국의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넓고, 처벌 강도도 세다.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은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고의성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한다. 독일의 경우 기업의 경영상 판단일 경우 책임을 면해준다는 점이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영미법 계통에서는 배임은 형사가 아닌 민사로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최근 회사와 함께 주주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기업들은 배임 관련 소송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배임죄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면 긴 미래를 보고 하는 기업의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이런 점 때문에 기업들은 상법 개정 논의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으로 내린 경영 판단으로 인한 손해에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대통령의 배임죄 완화 지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관련 법안들이 이미 여럿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부 여당은 기업들의 투자나 M&A에 걸림돌이 되는 배임죄 족쇄를 풀어주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0 hours ago
1
20 hours ago
1

![[다산칼럼] 스테이블코인과 통화주권](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인사]문화체육관광부](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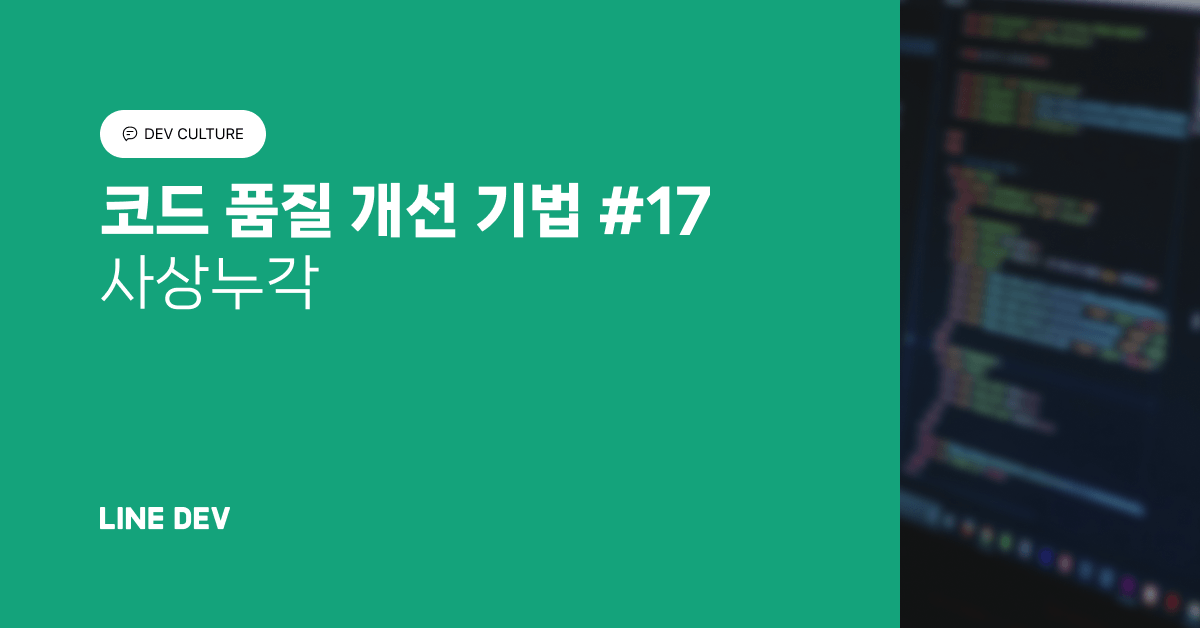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