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칼럼] 사진, 재즈 싱어 그리고 우탱클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7.38750146.1.jpg)
우탱클랜의 새 노래가 나왔다는 소식에 들뜬 마음으로 유튜브에 접속했다. 붐뱁 스타일의 비트 위에 묵직한 랩을 얹은 신곡 ‘만딩고(Mandingo)’가 이어폰을 타고 고막을 때리자 힙합 마니아를 자처하던 2030 시절이 떠오르며 금세 눈가가 촉촉해졌다.
우탱클랜이 누구인가. 1993년 데뷔 후 ‘크림(C.R.E.A.M.)’ ‘프로텍트 야 넥(Protect Ya Neck)’ 등 불후의 명곡을 쏟아낸 미국 동부힙합의 전설이다. 형님들이 돌아왔으니 부정확한 발음으로 돈 자랑이나 해대는 요즘 힙합 가수들은 긴장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찰나.
어? 이들의 뮤직비디오가 좀 이상하다. 여자 주인공의 머리카락이 길어졌다 짧아지기를 반복하고, 남자 주인공의 액션은 어딘가 부자연스럽다. 알고 보니 구글 딥마인드의 ‘Veo 2’라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작품이었다.
팬들 반발 부른 뮤직비디오
미국에서도 이들의 뮤직비디오가 적잖이 논란이 된 모양이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퓨처리즘은 “AI 기술을 통해 뉴욕시를 쿵푸와 검술이 지배하는 신화적 도시로 구현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팬들과 음악계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다수라고 전했다. “어떤 정신이나 감정도 느낄 수 없다” “돈이 없지 않을 텐데 왜 AI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부터 “AI 오물(slop)”이라는 극단적 반응까지 나왔다.
AI 사용에 대한 비판은 대중예술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2월 미술품 경매회사 크리스티가 뉴욕에서 AI로 만든 작품들로만 경매를 열자 6000명 이상이 경매 취소를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세 명의 미국 일러스트레이터가 미드저니 등 이미지 생성 AI 기업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건 일도 있었다.
예술계 한쪽에서는 ‘AI의 침공’에 거부감을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월 국내에서 전시회를 연 프랑스 3인조 아티스트 그룹 오비우스는 모든 창작 과정에 AI를 사용한다. 엔지니어 출신인 이들은 놀랍게도 사람이 상상할 때 나오는 뇌파를 시각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7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상영된 폴란드 영화 ‘그를 찾아서’의 시나리오는 AI가 썼다.
새로운 흐름 막을 수 있나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예술사를 관통하는 오랜 논쟁거리다. 1839년 사진술이 발명되자 초상화가들은 생계와 예술적 성취가 위협받는다며 반발했다. 1862년 프랑스에서는 사진이 예술인지를 두고 소송이 붙기도 했다. 1927년 최초의 유성영화(토키) ‘재즈 싱어’가 개봉하자 영화의 예술적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배우의 과장된 몸짓과 자막에 익숙했던 이들은 유성영화가 상상의 자유를 축소시킨다고 여겼다.
이를 둘러싼 논쟁의 결과는 다 아는 대로다. 새로운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예술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지금은 사진과 유성영화가 예술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저작권 침해 논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AI가 예술의 일부가 됐다는 점을 부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거대한 흐름에 저항할지 올라탈지 선택만이 남았다.

 21 hours ago
3
21 hours ago
3
![[이런말저런글] 온밤을 기다린 갓밝이, 하루를 엽니다](https://img0.yna.co.kr/photo/cms/2022/01/03/40/PCM20220103000240990_P4.jpg)
![면세점 의존 인천공항 생태계 다시 설계해야[기자수첩]](http://thumb.mt.co.kr/21/2025/07/2025073113203121157_1.jpg)
![[우보세]사라진 탕후루와 대왕카스테라](http://thumb.mt.co.kr/21/2025/07/2025073116331759916_1.jpg)
![[목멱칼럼]지자체판 ''나는 솔로''가 놓친 것들](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광화문]불편한 휴가, 반가운 재회](http://thumb.mt.co.kr/21/2025/07/2025073022334347469_1.jpg)
![[MT시평]기후변화는 '사기'다](http://thumb.mt.co.kr/21/2025/07/2025073013532495756_1.jpg)
![[투데이 窓]친환경 음악활동은 이제 시대정신이다](http://thumb.mt.co.kr/21/2025/07/2025073016202493277_1.jpg)
![[팔면봉] 韓美 통상 협상 타결, 관세 10%p 낮추는 데 4500억달러 펀드·구매 약속.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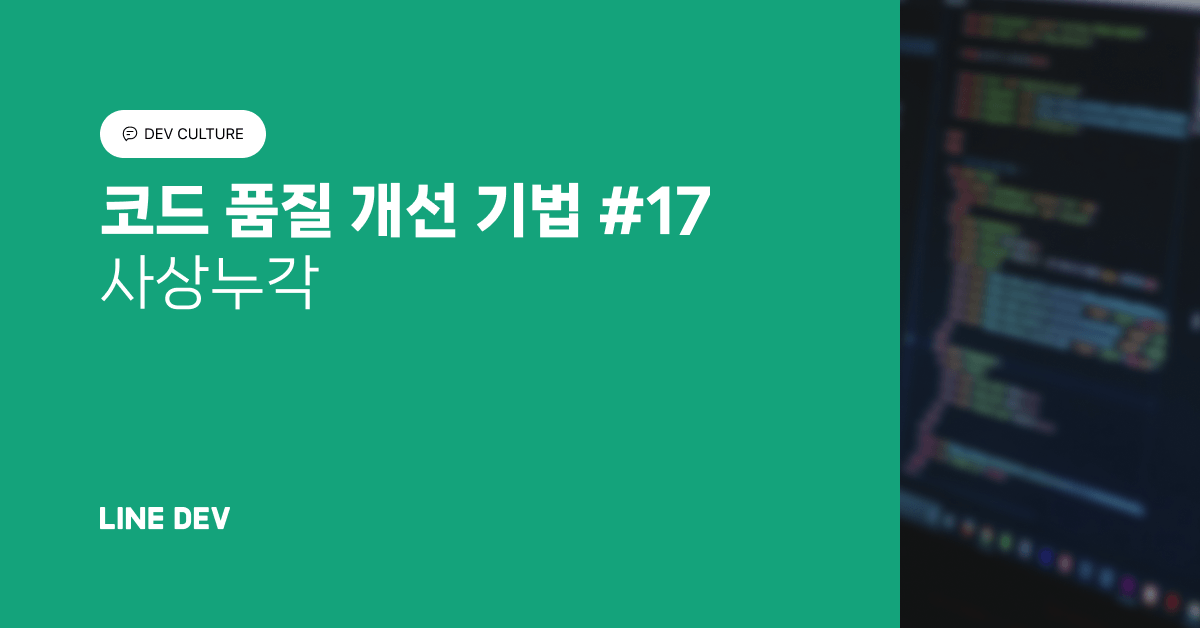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