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석 칼럼] 극우의 약진과 스페인의 '이민 역주행'](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7.21244658.1.jpg)
남유럽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스페인은 붕괴 직전이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9%까지 추락했고, 거리엔 실업자가 넘쳤다. 정부도 빚더미에 앉았다. 채권을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메우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국채(10년 만기) 금리가 연 7.7%까지 치솟았다. 당시 유럽에선 금리 7%를 ‘국가 부도 마지노선’으로 여겼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스페인은 아예 다른 나라다. 이 나라의 지난해 GDP 증가율은 3.2%로 유로존 평균(0.7%)의 4~5배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세계 15위이던 스페인의 달러 기준 명목 GDP 순위가 올해 12위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경제 규모 면에서 한국(지난해 12위)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다.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은 적극적인 이민정책이다. 최근 4~5년간 스페인엔 매년 50만~100만 명의 외국인이 들어왔다. 저출생, 고령화 위기에 빠진 스페인으로선 가뭄의 단비였다. 이들은 노동자와 소비자, 납세자라는 1인 3역을 충실히 수행하며 스페인 경제를 떠받쳤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GDP 성장 중 20%가 이민에 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민자를 활용한 경제 성장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국가 부흥책이다. 단기간의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론 예외 없이 생산성과 국민 소득을 높였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최근 스페인을 제외한 주요국의 움직임은 정반대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 프랑스 국민연합(RN), 일본 참정당 등 ‘외국인 배제’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 각국에서 무섭게 세를 불리고 있다. 이들은 이민자가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에 무임승차하고 있으며,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범죄와 테러 사건을 이민자와 엮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켜 지지층을 결집하게 하는 전략이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도 정책 방향이 확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없애는 등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을 쓰고 있다.
요즘은 한국도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된다. 체류 기간이 3개월 넘는 외국인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미 건설 현장과 농어촌은 외국인 일손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신랑이나 신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국제결혼의 비중도 10%를 웃돈다.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의 평균 연령은 36세로 내국인 평균보다 열 살 이상 젊다. 체류자 신분인 이들을 한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성장 기조 극복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굼뜨기만 하다. 이민 관련 업무를 총괄할 이민청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제기됐지만 아직도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다. 이번 정부도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엔 이민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활동을 시작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 이민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정도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폈다가 독일과 프랑스처럼 여론의 역풍을 맞을지 모른다는 부담이 작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숙제를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민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사회복지를 지속시키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말로 불안해하는 국민을 설득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인구대책과 연계한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가 됐다.

 21 hours ago
3
21 hours ago
3
![[기고]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단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8/01.41287643.1.jpg)
![[이런말저런글] 온밤을 기다린 갓밝이, 하루를 엽니다](https://img0.yna.co.kr/photo/cms/2022/01/03/40/PCM20220103000240990_P4.jpg)
![면세점 의존 인천공항 생태계 다시 설계해야[기자수첩]](http://thumb.mt.co.kr/21/2025/07/2025073113203121157_1.jpg)
![[우보세]사라진 탕후루와 대왕카스테라](http://thumb.mt.co.kr/21/2025/07/2025073116331759916_1.jpg)
![[목멱칼럼]지자체판 ''나는 솔로''가 놓친 것들](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광화문]불편한 휴가, 반가운 재회](http://thumb.mt.co.kr/21/2025/07/2025073022334347469_1.jpg)
![[MT시평]기후변화는 '사기'다](http://thumb.mt.co.kr/21/2025/07/2025073013532495756_1.jpg)
![[투데이 窓]친환경 음악활동은 이제 시대정신이다](http://thumb.mt.co.kr/21/2025/07/2025073016202493277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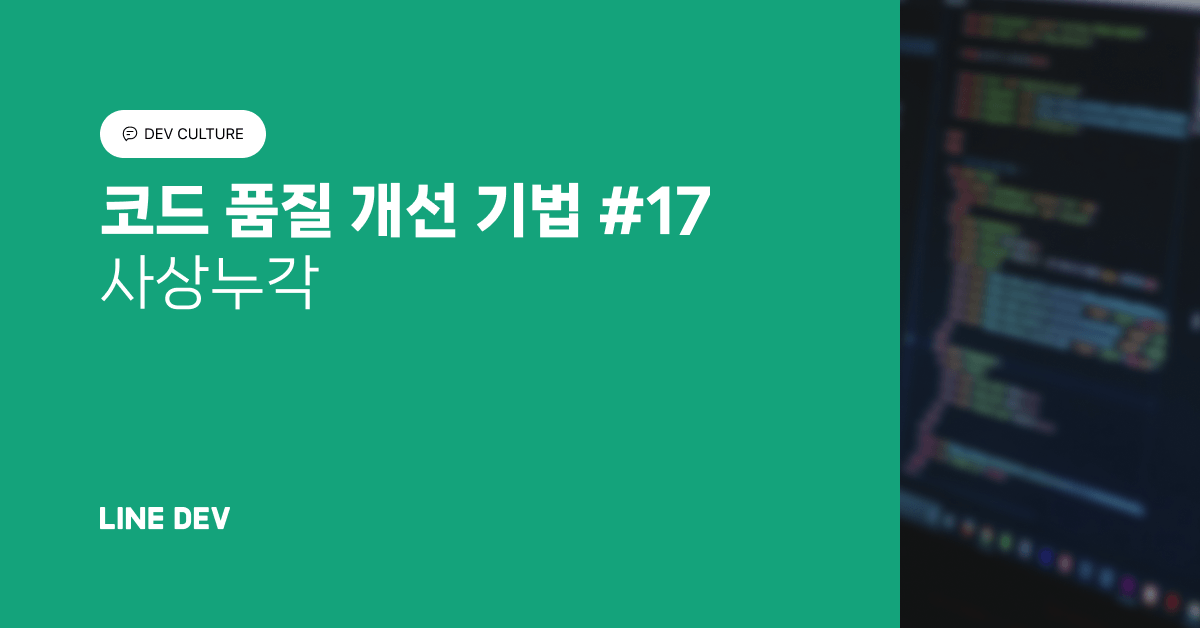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