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들 사법의 정치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7.36775473.1.jpg)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공언하고 30명 이상의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우리 헌법의 제도적 취약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탄핵과 함께 허술한 사법부 독립 보장 제도가 ‘민주주의에 숨겨진 시한폭탄’이었음이 확인됐다.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원장과 대법관까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탄핵소추를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원조직법도 일반 법률과 개정 절차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헌법에 대법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국회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 조직을 바꿀 수 있다.
대법원장 탄핵은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권과 파키스탄 페르베즈 무샤라프 정권에서 두 차례 이뤄진 사례가 있다고 한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증원한 뒤 새로운 자리에 측근들을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법은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정권과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정권이 써먹던 고전 방식이다.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하는 ‘4심제’ 추진 방침도 논란거리다. 대법원 확정판결조차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힐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헌법재판관 9인 중 국회 다수 여당과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지명의 재판관 각 3인을 임명하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헌재를 장악하는 결과가 돼 사법의 정치화는 심화되고 권력 분립 원칙은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프랑스 헌법은 법관 지위에 관한 사항을 ‘조직법 loi organique’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프랑스 조직법은 법률보다 상위에 있고 제·개정에 상원과 하원의 특별다수결이 필요하다. 반드시 사전에 헌법위원회 위헌심사를 거쳐야 한다. 프랑스 의회는 법관을 탄핵소추할 수 없고 대통령도 법관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이 없다. 이를 모두 헌법상 독립기구인 최고사법평의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법관은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보 또는 승진되지 않는다는 ‘법관 부동성(不動性)의 원칙’도 헌법에서 규정한다.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의 지배’가 아니다. 법치국가에 의해 구속을 받는 민주주의, 즉 다수의 정치적 지배를 법치국가적으로 제한하는 ‘자유민주주의’다. 문제는 아무리 숭고한 민주주의 원리도 정교한 법과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사법권 독립 보장을 위한 우리 헌법과 프랑스 헌법의 근본적 차이가 의미하는 바도 법과 제도의 중요성이다.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검찰 개혁 문제도 핵심은 인사권이라는 제도다. 수사기소권 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 검찰을 폐지하고 기소청으로 만들어도 경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한 검찰과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대선 이후 본격화될 헌법 개정 논의에서도 중요한 것은 정교한 제도 설계와 디테일이다. 헌법의 검사 영장청구권 규정을 폐지하면 경찰도 영장청구권을 가진 이승만 자유당 정권 시절의 형사소송법으로 회귀하게 된다. 그렇다면 4·19 혁명은 무엇이었나. 법과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번영과 몰락을 결정한다. 영국 산업혁명은 1623년 잉글랜드 의회의 지식재산권보호법 등이 기반이 됐다. 미국도 1787년 연방헌법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 보호를 명시해 산업 패권 국가의 토대를 만들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3위를 차지했지만 법 체계 효율성은 45위, 정부 규제의 기업 활동 부담은 87위를 기록했다. 민간의 역동성을 후진적인 법과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재산권 보장, 법치주의, 정치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가난한 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효과적인 정치제도가 없어서 가난한 것이다. 인간의 선의를 믿을 것이 못된다. 누가 와도 흔들 수 없는 튼튼한 법과 제도만이 국가의 번영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7 hours ago
2
7 hours ago
2
![[에스프레소] ‘불멸의 윤순신’](https://www.chosun.com/resizer/v2/DVFILSMD3REERNEIST7OEASWUU.png?auth=85e70c9747652fa3b0dd3b748818fdc9b33aa9d44777c20fbd7aa07bb2319ed2&smart=true&width=500&height=500)
![[기자의 시각] 새마을금고가 왜 알약을 수거할까](https://www.chosun.com/resizer/v2/OLBHG2ZZRZE7PAHU7GYJS3Y57A.png?auth=f7469ee244bcdb32416ca4056c4048a9055341ff6377c2b892504f4539b3ed6b&smart=true&width=500&height=500)
![[논설실의 뉴스 읽기] 美 해군, 韓 조선소 잇단 방문… 트럼프에 “최고 기술, 국방비 절감 가능” 설득하라](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카페 2030] 프로야구 ‘先先예매’의 벽](https://www.chosun.com/resizer/v2/XIHLFQUU4ZHTZHLFJJOYGPRSAY.png?auth=c5fdb546304db298ae5f7d0c0a3ee8ffb76a977ed56a38cc1071e193b377e575&smart=true&width=500&height=500)
![[김교석의 남자의 물건] [14] NBA 전설 포퍼비치… 티셔츠에 새긴 ‘보스’의 품격](https://www.chosun.com/resizer/v2/CT3IH6VBKZGIZERPH6AMFF357I.png?auth=5513cbfba45c4e129e31646a79ce3be431cbe9cb345504c2323f2a9e64b7da7c&smart=true&width=877&height=469)
![[유광종의 차이나 別曲] [348] 새치기 문화와 인터넷 해킹](https://www.chosun.com/resizer/v2/36SDIHUHUZBS3K3XP5GJUHDL7M.jpg?auth=eb67ced4f0c239a76f0a54f97d58978843ee66850291cfbc08c330da7c72b179&smart=true&width=275&height=183)
![[양해원의 말글 탐험] [248] ‘사고 발생’ 피하기](https://www.chosun.com/resizer/v2/STLCG3PWBVP5RHKEYT56BCOXSE.jpg?auth=6c012f2545b509376454807a2ebf6006d3441e21dcf838beae6760daa0b58467&smart=true&width=3280&height=4208)


![[세상만사] 길잃은 치매노인 구하는 한 통의 문자](https://img3.yna.co.kr/etc/inner/KR/2025/05/09/AKR20250509107800546_01_i_P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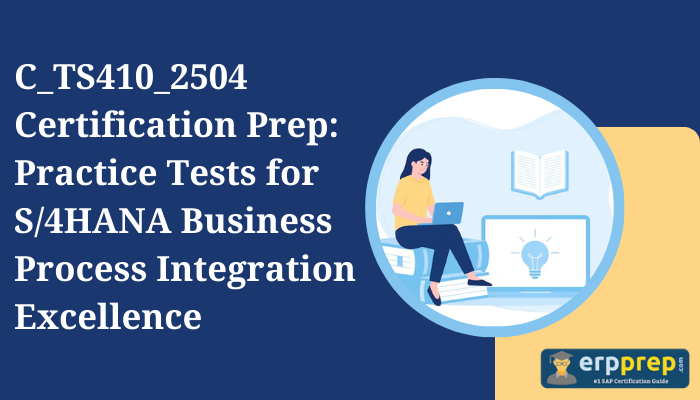
![[KLPGA 최종순위]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https://r.yna.co.kr/global/home/v01/img/yonhapnews_logo_1200x800_kr01.jpg?v=20230824_1025)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