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동훈 한국공학대 교수
현동훈 한국공학대 교수“메타옵틱은 평판 표면(메타물질)에 나노급 구조물을 형성해 광학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두꺼운 구면 렌즈(결상 광학)를 대체하는 혁신 기술입니다. 미래 차 전조등, 6G 안테나, 극초소형 내시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동훈 한국공학대 교수는 “십여년간 메타옵틱 개발에 매진해 왔지만 국내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독일·일본과 '인공지능(AI) 메타옵틱스 국제공동연구소'를 지난 15일 개소했다”라고 밝혔다.
현 교수는 메타옵틱 기술 개발은 일본과 미국에서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선 6G 통신용 안테나 개발이 진행 중이다. 건물 내 별도 안테나 설치 없이 필름 형태로 메타옵틱 패턴을 성형하면 6G 안테나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에선 메타옵틱 기술을 적용해 소량 혈액만으로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바이오센서와 기존 대비 10분의 1 크기로 소형화된 내시경을 개발 중이다.
그는 “한국공학대도 자동차에 메타옵틱을 적용한 차세대 전조등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초소형 전조등을 중앙에 하나만 설치해도 충분한 조명 기능을 발휘해 차량 디자인에 대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산업에서 메타옵틱이 주목받고 있지만 '왜 상업화가 더딜까'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 교수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사항을 꼽았다.
첫 번째 메타옵틱의 요소기술 개발 완성도가 낮다.
현 교수는 메타옵틱 기술이 사업화되려면 이에 맞는 광원 소자를 개발해야 하지만 아직 완성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일본, 미국 등 기업과 LED 광원 소자를 개발한 한국공학대가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양산화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그는 “6G 안테나, 자동차 전조등 등 메타옵틱 설계는 가능하지만, 양산화 기술인 초미세 금형·성형 기술이 뒷받침되지 못해 초미세 패턴 형상을 양산화할 수 없다”라면서 일본· 유럽 기업과 협업할 방침이다.
마지막은 모듈화와 AI 융합 기술 부족이다. 현 교수는 “기존엔 광학 설계 후 시뮬레이션 도구로 검토·수정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하는 방법론에 의지했지만, AI를 활용하면 무한 반복 검증 과정을 대체해 광학 설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고 말했다. 국내·외 광학 설계 솔루션 기업과 협업해 AI 융합 기술을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수집, 전달, 처리, 활용 등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전기·전자·통신·빅데이터·로봇 등 기술과 AI를 융합한 메타옵틱 모듈 기술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는 “메타옵틱 기술은 국방, 바이오,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기술이지만, 광원 소자 개발부터 최종 제품화까지 공급망 전체를 개발하려면 한 국가만의 역량으론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를 중심으로 각국이 개발 역할을 분담해 6G 안테나, 차세대 전조등 등의 개발 결과물을 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공학대는 메타옵틱 기반 자동차 차세대 전조등용 모듈 기술 초보 단계지만 개발 경험이 있다”면서 “메타옵틱 제품 사업화를 앞당기려면 정부와 대기업의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1 month ago
10
1 month ago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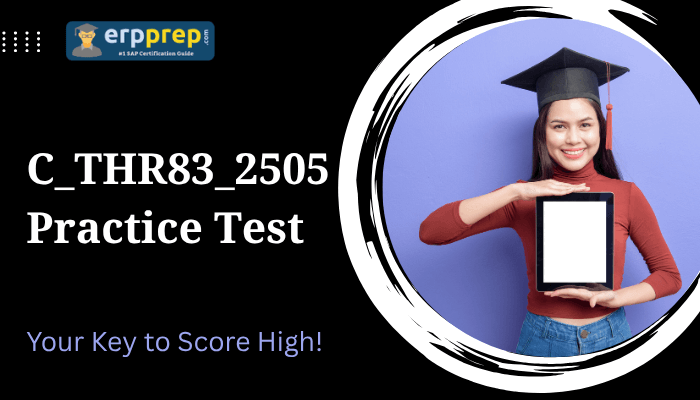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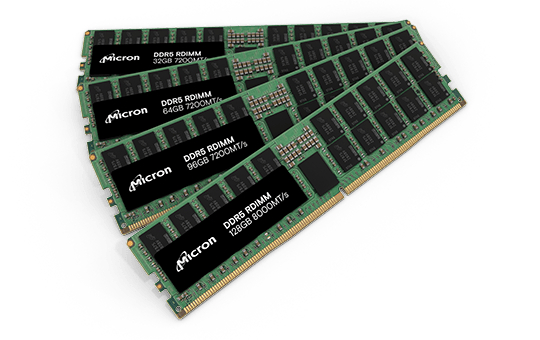



![[朝鮮칼럼] 신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대중국 정책](https://www.chosun.com/resizer/v2/RKK4RNGVFNH35JRLLXTTU2RAP4.png?auth=b176df5e9a825f7cfcf8abb8fe5e68d3b8bee2e5054afd5d9ff84d10209fa8ca&smart=true&width=200&height=267)
![[에스프레소] 피터 틸이 묻는다 “AI 강국, 말로만 외칠 건가”](https://www.chosun.com/resizer/v2/N5NWTT7NHJBCFHEEP5IQLW7DKU.png?auth=0e06d154dcf135b7a87bd56824433b79d36da0c6b19e5fa7db13ee646301dc8f&smart=true&width=500&height=500)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