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인공지능(AI)으로 사라질 직업을 걱정하기 보다 AI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와 기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AI 시대에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확산적 사고' 기반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움직이는 지능 '피지컬 AI'로 제조 인력을 디지털화하고 새로운 고용 창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장영재 KAIST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제조업 생태계를 재편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으로 '피지컬 AI'를 제안했다.
제조업은 전 산업 종사자 수의 약 18%를 차지하며 비중이 가장 큰 만큼 향후 AI 등 첨단기술을 제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내 고용 창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날 전문가들은 AI와 같은 신기술이 발전하면 노동 기회가 창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기술이 탄생해 배포되기 전까지 기술 인력이 재배치되고 본격적인 기술 배포기에 들어서며 실제 고용이 창출되고 기술인력이 배출된다.
장 교수는 “AI 분야 또한 다양한 AI 기업들이 등장해 창업 고용효과가 나타나고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인력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I의 경우 서비스업에서는 기술 도입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성과 지표로 나타나는 반면, 제조업에서는 기업 성과나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 AI가 많이 활용되는 AI산업, 정보통신(IT)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산업별 뚜렷한 차별성이 보인다”면서 “반면 제조업은 실제 하드웨어(HW)를 다루기 때문에 고용 파괴적 특성이 IT에 비해 덜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전문가들은 '피지컬 AI'를 단순한 정보 처리에 머물지 않고 '움직이는 지능'을 구현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대한민국 제조 산업과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장 교수는 “챗 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은 사람의 언어를 학습해 사람의 언어 사고 능력을 모사한다”면서 “이러한 언어 사고 능력에서 더 나아가 '피지컬 AI'란 말 그대로 물리적 시공간을 이해하고 그 맥락을 파악해 인간의 시공간 지능을 모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지컬 AI의 경우 기존 IT기반 AI와는 달리 하드웨어 기반 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면서 “직업 파괴적 일반 AI기술과 달리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IT기술 이외 다양한 직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6 hours ago
1
6 hours ago
1

![[AI BUS 2025] AI 교실 시대… 전문가들 “사고력은 빼앗기지 말아야”](https://cdn.newstheai.com/news/thumbnail/202507/8382_12988_3637_v150.jpg)
![[AI BUS 2025] “교사가 만든 ‘AI 교실’ 현실로”… 부산 AI 교육 컨퍼런스 성료](https://cdn.newstheai.com/news/thumbnail/202507/8391_13001_4158_v15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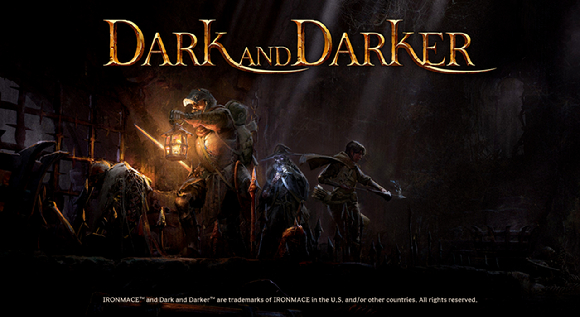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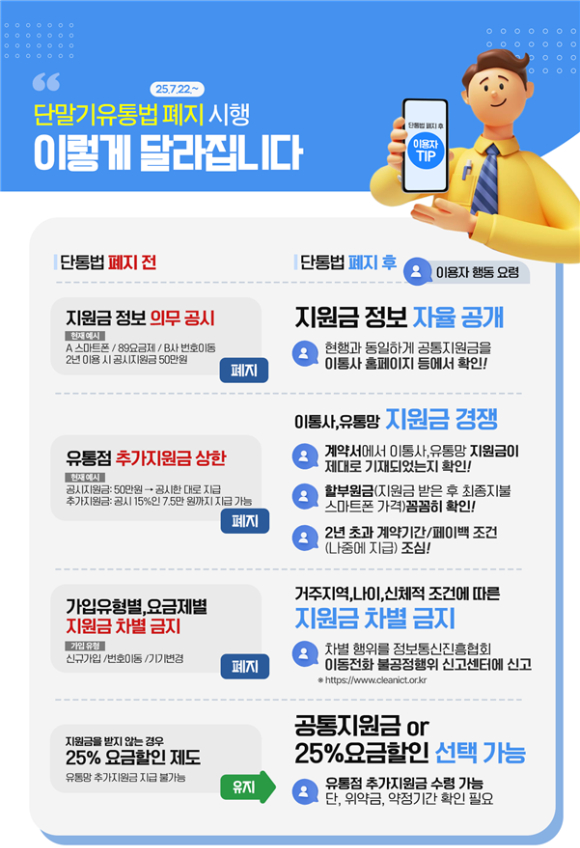

![[KPGA 최종순위] KPGA 선수권대회](https://r.yna.co.kr/global/home/v01/img/yonhapnews_logo_1200x800_kr01.jpg?v=20230824_1025)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