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팥이 망가진 만성 신장 질환자가 병원 대신 집에서 투석받을 수 있는 복막투석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인지도가 낮은 데다 이를 지원하는 보상체계도 갖춰지지 않아서다. 의료계에선 재택 환자 관리 지원책과 함께 국산 장비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격히 줄어드는 재택 투석

7일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복막투석 환자는 5253명으로 전체 투석 환자의 4.5%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2013년 7540명이 복막투석을 받아 전체 투석 환자의 12.6%를 차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급격히 줄었다. 2033년께 국내에서 복막투석이 자취를 감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투석은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 제 기능을 못 하는 환자의 혈액 속 노폐물 등을 제거해주는 치료다. 혈액투석은 환자 동맥과 정맥을 연결한 동정맥루에 바늘을 꽂아 혈액을 빼낸 뒤 투석기로 노폐물 등을 제거해 다시 넣어주는 방법이다. 환자가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복막투석은 아랫배 쪽에 관을 넣은 뒤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투석법이다. 자동투석기를 활용하면 집에서 잠자는 8~10시간 동안 투석받을 수 있다. 신장이 망가진 환자도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다니는 등 일상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사회비용 절감에 美선 권장
복막투석은 병원을 덜 방문하는 데다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혈액투석보다 사회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신장학회에 따르면 혈액투석 환자는 월평균 13.3회 병원을 찾는 데 비해 복막투석 환자는 한 달에 한 번만 병원에 간다. 자연히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비율도 복막투석 환자가 61%로 혈액투석 환자(34%)보다 1.8배 높다. 혈액투석 환자는 연간 진료비로 3000만원을 지출하지만 복막투석은 2200만원 정도를 쓴다. 복막투석은 환자가 병원을 오가는 데 드는 교통비 등 부수적인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외 각국 정부는 앞다퉈 복막투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재택 투석 환자를 돌보면 의료진이 혈액투석보다 1100만원가량 진료비를 더 받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일본도 1998년 재택 투석 관리료를 신설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미국의 복막투석 환자 비율은 12%, 재택 투석을 모두 포함하면 15% 정도로 추정된다. 의료계에선 최근 이 비율이 20%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 제도적 지원 마련해야”
복막투석이 명맥을 유지하려면 정부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선희 경북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병원 중심 치료 문화에 익숙한 한국에선 재택 치료가 가진 자기 관리 등의 강점이 가려지고 있다”며 “복막투석이 환자와 보호자에겐 어렵고 귀찮은 치료가 됐고, 의료진에겐 비용만 더 드는 치료가 됐다”고 했다. 의료진이 복막투석을 환자에게 교육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이를 마땅히 보상받을 방안이 없다.
장비 국산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동형 대한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는 “국내 투석 장비와 소모품 시장 규모만 1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사실상 100% 수입에 의존한다”며 “정부가 복막투석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5 hours ago
2
5 hours ago
2


![AI 데이터센터 전력 대란 경고등…해법은 '지방 분산' [AI브리핑]](https://image.inews24.com/v1/63f5dd4520101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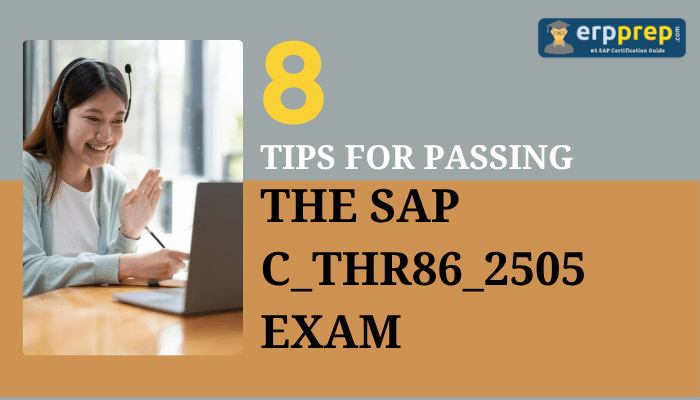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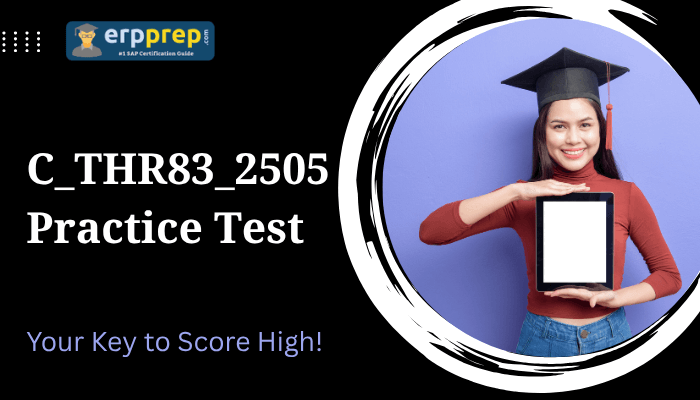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