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중소기업모태펀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성장금융) 등 주요 모펀드 운용기관의 투자 업종과 투자 단계가 겹쳐 비효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운영기관 간 투자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각 기관의 성격이 모호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모태펀드 예산(한국벤처투자 소관) 1조1000억원 중 절반 이상인 5500억원을 인공지능(AI)과 딥테크 분야에 넣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AI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중기부가 모태펀드 예산을 확보하면 산하 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집행을 담당한다.
또 다른 모펀드 운용기관인 성장금융도 1조4700억원의 신규 출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자 키워드를 AI로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출범한 성장금융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주요 정책펀드 운용을 담당해 공적인 성격이 많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투자관리 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도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벤처투자는 초기 기업 투자, 성장금융은 중·후기 투자 중심으로 출자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업 식품기업에 특화됐다. 최근 이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게 투자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지난해 모태펀드가 마중물을 댄 전체 벤처 투자에서 업력 3년 이하 초기 비중은 18.6%로 전년(24.6%)보다 떨어졌다. 한 벤처캐피털(VC) 관계자는 “모태펀드는 루키(신생 VC) 리그를 운영하면서 신생 VC들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었지만 최근 후기 투자를 늘리면서 차별화가 잘 안되고 있다”고 했다.
펀드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운용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2년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모태펀드 업무를 한국벤처투자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벤처 투자의 다양성을 위해 통폐합보다는 각 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성장금융의 출자가 수익률로 줄을 세워 이뤄진다면 모태펀드는 여러 정성적 요인이 반영된다”며 “벤처 투자의 다양성을 위해선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3 days ago
5
3 days ago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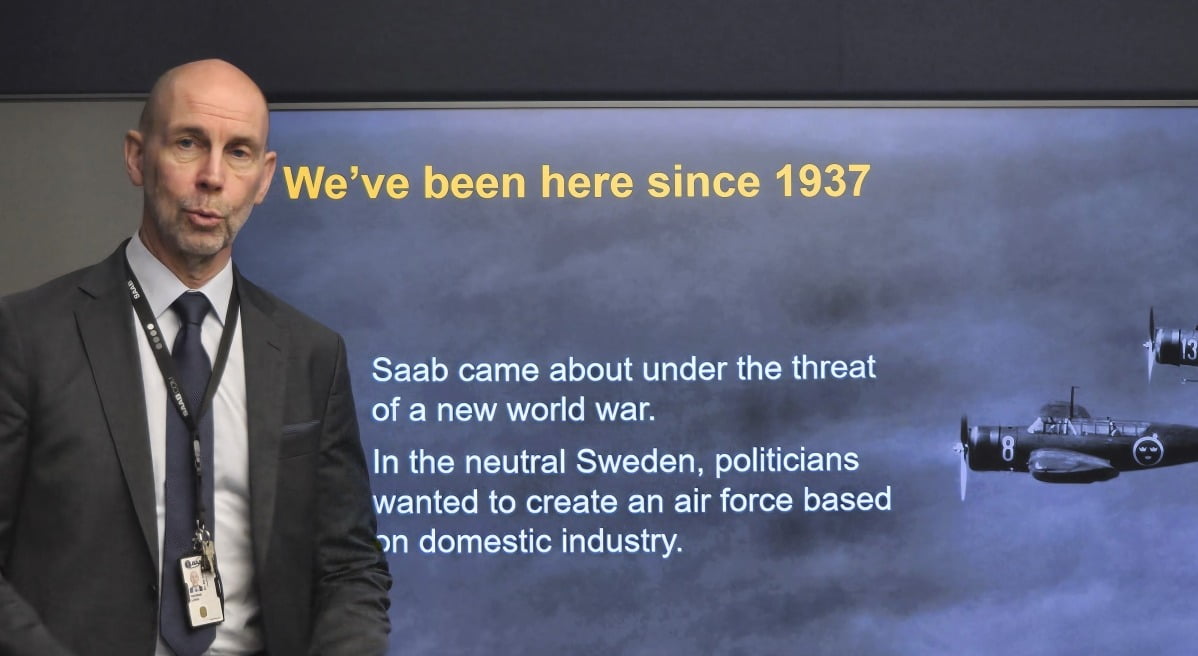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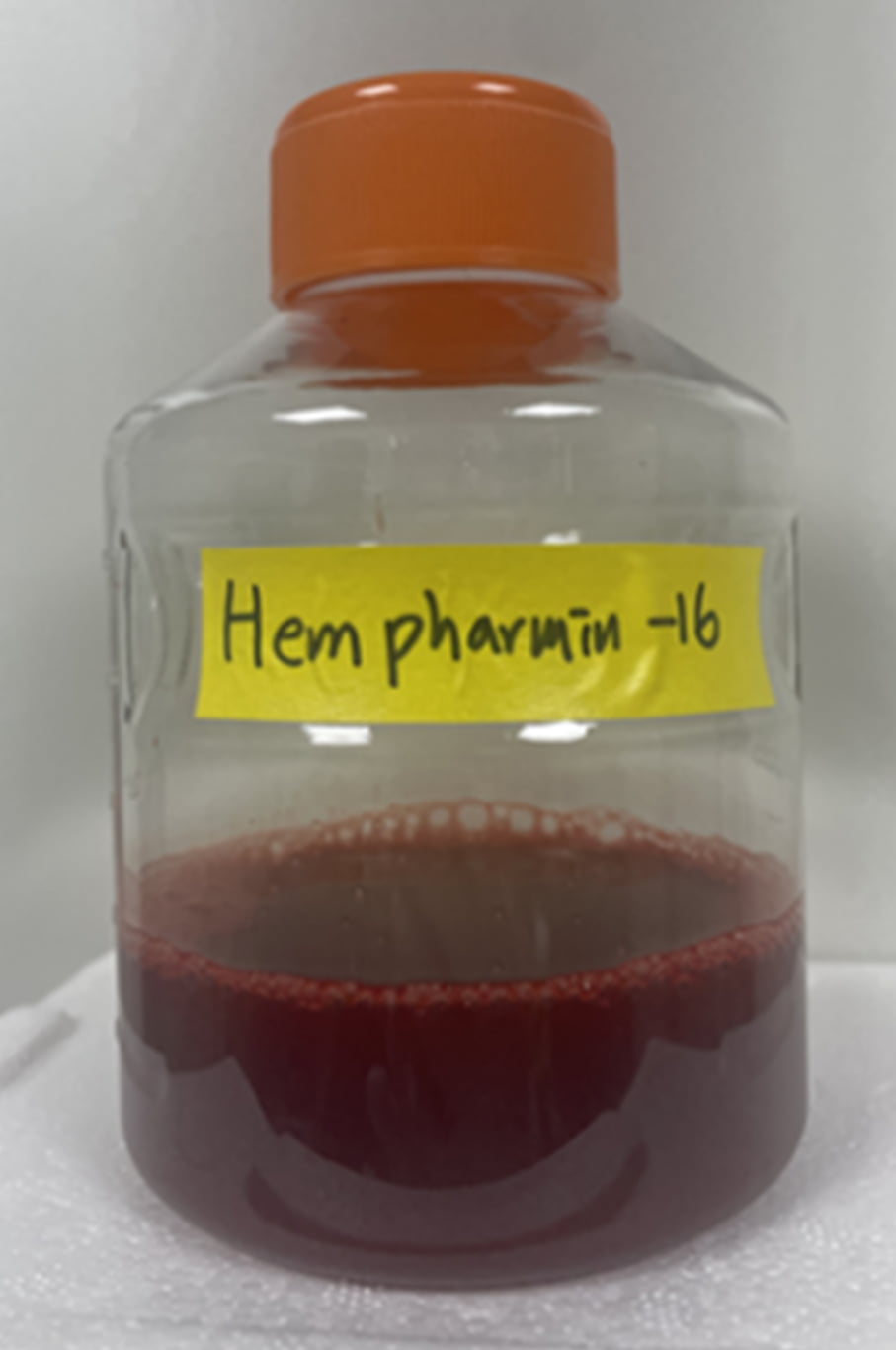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