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배우의 경력이 켜켜이 쌓일수록 '첫 경험'은 좀처럼 찾아오기 어렵다. 하지만 이병헌에게 '어쩔수가없다'는 예외였다. 베니스 경쟁 부문 초청, 토론토 영화제 공로상, 그리고 내년 아카데미 도전까지. 박찬욱 감독과의 25년 만의 협업은 그의 영화 인생에 새로운 자취를 남기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이병헌은 "'어쩔수가없다'를 통해 여러가지 첫 경험을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베니스국제영화제에 경쟁작으로 출품한 것도 처음이고, 작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토론토 영화제에서 난생처음 공로상도 받아봤다. 앞으로 또 해야 할 새로운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어쩔수가없다'는 내년 3월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영화상 국제장편영화 부문의 한국 대표작으로 선정됐다. 그는 "아직 아카데미에서 후보작으로 뽑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카데미 레이스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남은 1년 계속 그 일에만 매달릴 거다. 이런 물리적인 변화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개봉한 '어쩔수가없다'는 25년간 몸담은 제지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가장 만수가 벼랑 끝에서 선택하는 계획을 그린 작품이다. 이병헌은 치밀하면서도 어설픈 '전쟁'을 벌이는 만수 역을 맡아, 절박함과 허술함을 동시에 담아냈다.
영화 속 만수는 인물은 하루아침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처지다. 이병헌은 "저 역시 할 줄 아는 게 연기밖에 없는 사람"이라며 "만수처럼 직업을 잃는다면 저 역시 갈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공감했다.
그는 캐릭터에 몰입하는 과정에 대해 "만수를 연기해야 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를 응원할 수밖에 없었다"며 "관객은 거리감을 두고 비판적으로 보다가도 빠져나오지만, 저는 끝까지 그를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수가 결심하기 전까지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이 충분히 설득력을 갖도록 감독과 끊임없이 대화했다"고 덧붙였다.

해외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후 외신과 평론가들은 '어쩔수가없다'를 슬랩스틱 혹은 블랙코미디 장르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병헌은 장르적 구분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영화를 찍으면서 슬랩스틱이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베니스에서 평론가들이 '박찬욱·이병헌의 슬랩스틱'이라고 평했을 때 그렇게 규정지어지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배우가 던진 아이디어가 영화에 반영된 경우도 많았다. 이병헌은 "범모(이성민), 아라(염혜란)와 음악실에서 몸싸움하다 총이 굴러 들어오는 장면은 제가 제안한 것"이라며 "셋이 정신없이 싸우는 상황이라면 총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수가 붙잡힐 줄 알고 손을 모으고 서 있는 장면도 내 아이디어였다"며 "박찬욱 감독과 제 유머 결이 다르지만, 제 쪽 성공률이 좀 더 높았던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2000년 '공동경비구역 JSA' 이후 25년 만에 다시 만난 박찬욱 감독과의 호흡은 남달랐다. 이병헌은 "예전에는 감독이 배우 얘기를 잘 듣긴 해도 실제 반영은 적었는데, 이번에는 80% 가까이 적용됐다"며 "자꾸만 아이디어가 반영되다 보니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박 감독이 늘 열린 자세로 대화하는 건 변함없었다"고 강조했다.
작품 선택의 이유에 대해선 "박 감독과 오랜만에 함께한다는 점이 가장 컸다"며 "'어쩔수가없다'는 웃음과 유머 속에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품고 있고, 여러 번 볼수록 다르게 다가오는 매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병헌은 과거 박찬욱 감독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우리는 망한 배우, 망한 감독이었다"고 표현한 바 있다. 그는 과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0회 '라크마 아트+필름 갈라'(LACMA Art+Film Gala)에서 스피치를 맡았던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과 아티스트에게 공로를 주는 자리였다. 그때 박 감독님께 상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고, 내가 시상을 맡게 됐다. 다만 5분 이상의 영어 스피치를 준비해야 했는데 부담스러워서 한글로 적은 뒤 영어로 번역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병헌은 원고에서 박 감독과의 첫 만남을 솔직하게 담았다고 했다. "감독님은 한 편을 말아먹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었고, 나는 두 편을 말아먹고 세 번째 시사회장에 있었다. 조감독이 누가 찾는다고 해서 나갔더니 포니테일 머리에 독특한 패션의 사람이 시나리오를 읽어달라고 하더라. 솔직히 '안 하게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읽어보니 너무 재밌었다. '우리 둘 다 망할 데까지 망했으니 더 망할 것도 없지 않나, 한번 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 작품이 바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였다. 이병헌은 "이런 내용의 스피치를 마치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박 감독과 포옹하며 상을 드렸던 그 순간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떠올렸다.
이병헌은 특유의 유머를 발휘하며 비호감이던 박 감독의 첫인상은 촬영장에서 곧바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JSA' 첫 촬영 때 감독님이 현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고 바로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박찬욱 감독을 어떤 동료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기댈 수 있는 분, 인생의 큰 형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이어 "작품적으로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분이다. 할리우드 진출을 앞두고도 '지.아이.조'를 할지 말지 고민됐을 때 박 감독과 김지운 감독에게 상담을 드렸다. '하는 것도 괜찮다'고 조언해 주셨는데 김 감독은 만류했다. 결국 내가 정해야하는 것이었지만 그만큼 제게는 영화계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헌은 이번 작품을 자신의 필모그래피에서 특별한 이정표로 꼽았다. 그는 "카메라가 내 감정을 따라가며 처음부터 끝까지 맺는 영화는 흔치 않다"며 "내 경력에서 오래도록 자랑할 수 있는 작품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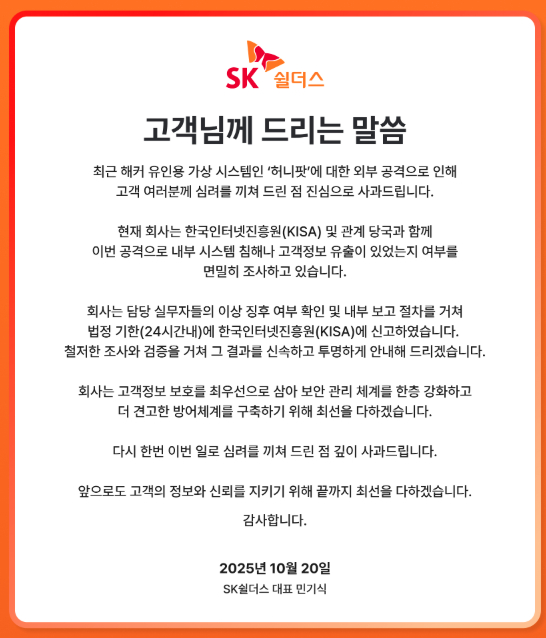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