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하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7.32519856.1.jpg)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15일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구글은 한국에서 2008년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비자에게는 무료로 동영상을 제공하고 동영상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받는 전형적인 양면시장 플랫폼 사업으로, 구글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을 장악해 나갔고 2006년 인수한 유튜브를 유일무이한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무료 이용으로 시장을 장악하자 구글은 2018년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출시했다. 동시에 구글은 유튜브 뮤직을 출시하며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이라는 유료 음악 서비스를 바로 출시했고, 유튜브 프리미엄에도 끼워서 팔았다.
끼워팔기의 위력은 대단했다. 당시 한국 시장은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 국내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유튜브 뮤직은 시장의 강자로 부상했고, 앱 리테일 분석업체 추정에 따르면 음악 스트리밍 앱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2023년 국내 1위 브랜드 멜론을 넘어섰다. 유튜브 뮤직이 점유율 1위에 올라서자 2023년 공정위는 끼워팔기 조사에 착수했다. 올봄 구글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결국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싸게 출시하고 국내 음악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구글의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사실 끼워팔기가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다. 끼워팔기는 결합 판매의 한 유형으로 두 상품을 동시에 소비하고 싶은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가격상 이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의 끼워팔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주 상품(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부상품(온라인 음악)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유튜브 동영상만 보고 싶은 소비자라도 유튜브 뮤직을 함께 구매해야 했고, 잘나가는 유튜브에 끼워 팔았기 때문에 유튜브 뮤직이 단기간에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위 브랜드가 됐다. 향후 유튜브 뮤직이 시장점유율을 더 끌어올려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면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의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생태계 확장을 노리는 플랫폼 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활용한 핵심 영업 전략이다. 하지만 이는 종종 한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다른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플랫폼의 끼워팔기를 자사 우대 등과 더불어 사전에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동의의결로 종결하는 것이 공정할지를 두고서는 이견이 있다. 그간 공정위의 동의의결은 주로 외국 기업에 적용됐다. 통신사와 맺은 계약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에서 애플이 그랬고, 삼성전자와의 칩셋 공급 계약과 관련해 브로드컴도 그랬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시정명령보다 실행 시간을 단축해 소비자 보호와 경쟁 질서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자국 플랫폼에 대한 제재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겠다는 마당에 공정위의 동의의결이 무역 차원에서도 나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동의의결을 유도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에는 시정명령과 벌금으로 일관해 상급 법원에서 그 조치가 뒤집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공정위가 이번 동의의결안 개시에서 강조한 것처럼 동의의결이 소비자에게 더 나을 수 있고 행정력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봐주기식은 안 되고 시장의 경쟁을 확실히 복원하는 자진 시정이 전제돼야 한다.
순식간에 시장을 장악하는 플랫폼 사업의 속성상 공정위 개입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공정위 조사가 늦은 감이 있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는 애초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었는데, 5년이 흐르고 조사에 착수해 이미 유튜브 뮤직이 음악 서비스 시장을 장악한 후였다. 인력이 늘 부족한 공정위가 새로운 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건 중 동의의결이 효과적인 사건은 이를 유도하고 신속히 종결하는 관행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1 week ago
2
1 week ago
2
![[만물상] ‘소림사 CEO’의 몰락](https://www.chosun.com/resizer/v2/TZIN5IVVDNFHHFYAHEDQ3SLBYI.png?auth=20b0c3dfd611df121ef3429a22abd6caf3ad3d40385eb08aef38ba8bc7c49aeb&smart=true&width=600&height=334)
![[다산칼럼] 스테이블코인과 통화주권](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인사]문화체육관광부](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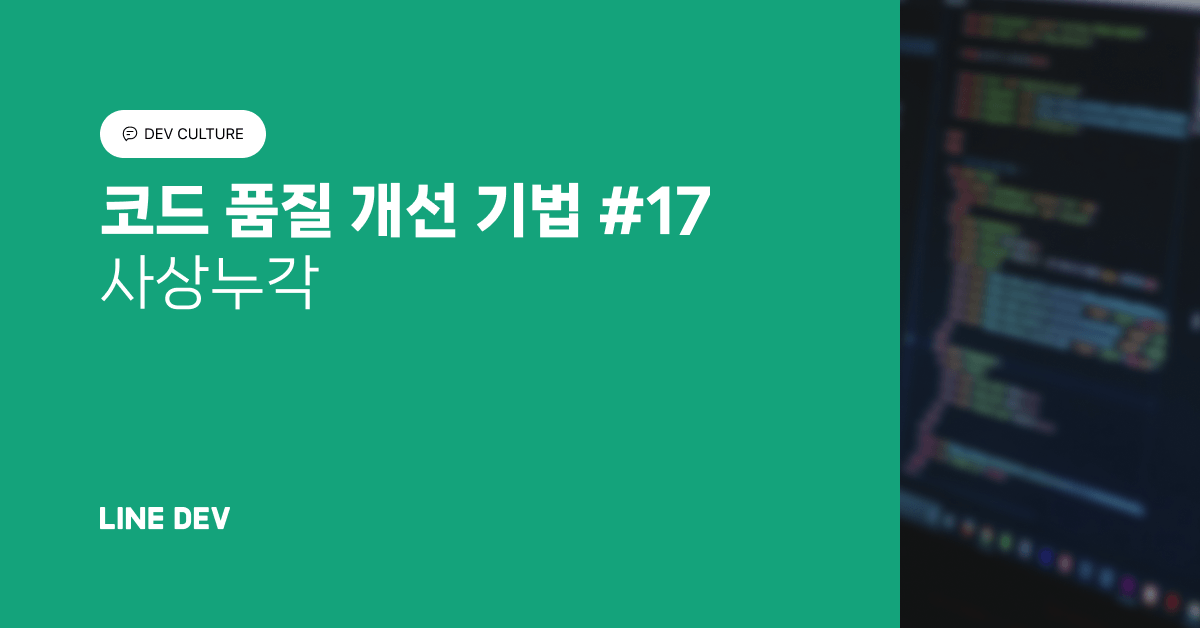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