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명 김동원 기자
- 입력 2025.04.25 18:56
현 정책 모델 개발에만 집중 “활용 없는 모델은 전시용”
추론형으로 진화하는 AI, 韓 CoT 데이터 부족
AX 전략과 국민 눈높이 맞춘 AI 리터러시 중요

“지금 정부는 너무 거대 모델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하는 건 산업과 일상에 AI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AX(AI Transformation)’입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의 말이다. 25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민간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강연하며 민간 기업에서 느끼는 한국 AI 정책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발표에서 현재 정부가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지금 한국은 월드베스트 LLM 개발에만 쏠려 있는 분위기”라며 “진짜 중요한 것은 모델이 아니라 그 모델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해외에서는 모델 개발보단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이미 AI 기술을 다양한 산업 현장에 융합해 상용화하는 사례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스타트업인 포티투마루조차 다양한 산업군에서 실제로 AI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AI 활용보단 모델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국가 정책 차원에서는 ‘AX’라는 개념조차 사라진 상황”이라며 “AI를 산업화·사업화하는 전략이 없다면 초거대 모델도 그저 전시용으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개발의 원료가 되는 데이터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2~3년 사이, 국내에서는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공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이 거의 없었다”며 “데이터댐 같은 프로젝트도 자취를 감췄고, 현재 AI가 추론형으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그에 필요한 CoT(Chain of Thought) 데이터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처럼 고비용·고정밀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가공하는 데 민간의 역량만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과 전송권 문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AI가 대규모 텍스트와 영상, 음성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기존 저작권 체계로는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며 “이전 시대의 프레임으로 AI 시대를 규제하거나 논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인프라 격차도 심각한 문제로 짚었다. 김 대표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수십만 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 전체를 합쳐도 겨우 수천 장 수준”이라며 “이번 정부가 2조 원을 투입해 4만 장 규모의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글로벌 경쟁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GPU 확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확보한 인프라를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AX를 위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GPU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산업 전체의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I 인재 양성에 있어서는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AI는 고급 인재 역할이 두드러지는 분야”라며 “양적 인재 양성도 중요하지만, 박사급 이상의 고급 인재를 얼마나 육성하고, 또 해외에서 유치해 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3년 전만 해도 AI 인재 순유입 국가였지만, 지금은 순유출 국가가 됐다”며 “인재들이 실리콘밸리와 중국 등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극복할 사례로 일본을 소개했다. “일본은 정책적으로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며 최근 순유입 국가로 전환한 사례”라고 소개하며 “한국도 주거·생활 지원까지 포함된 전략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AI 리터러시’, 즉 국민 전체의 AI 이해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인터넷 검색 포털과 같은 독자적인 IT 생태계를 가진 몇 안 되는 나라지만, AI 시대에 들어서며 국민의 AI 이해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자국 검색 엔진을 유지하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한국뿐인데, 정작 일반 국민이 생성형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모순”이라며 “지브리 생성기 앱처럼 잠깐의 유행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활용과 이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모두를 위한 AI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리터러시가 우선”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리터러시 정책과 교육 체계가 병행돼야 진정한 AI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금 한국은 기술, 데이터, 인프라, 인재, 리터러시 무엇 하나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는 명확하다”며 “현실 가능한 기술로 산업 현장을 혁신하는 AX 전략과 국민 눈높이에 맞춘 AI 리터러시 제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출범한 인공지능민간특별위원회는 AI 주체를 국민에 두고, 민간 중심 실행 전략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 주도의 선언적 전략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실질적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국정책학회와 THE AI가 공동 설립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국내 1세대 AI 연구자인 김진형 KAIST 명예교수가 취임했다.
저작권자 © THE A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스타트업-ing] 리뉴어블스 플러스 “산불로 탄 나무, 활용을 넘어 지역 상생까지 꿈꾼다”](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5/4/25/a9689523a7d342c9-thumbnail-1920x1080-70.jpg)

![[투자를IT다] 2025년 4월 4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주가 흐름](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5/4/25/c776efe22c87475d-thumbnail-1920x1080-70.jpg)
![[신차공개] 현대차 ‘2025 코나’·’2026 아반떼’ 출시](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5/4/25/e1bdd0ae54804ea6-thumbnail-960x540-7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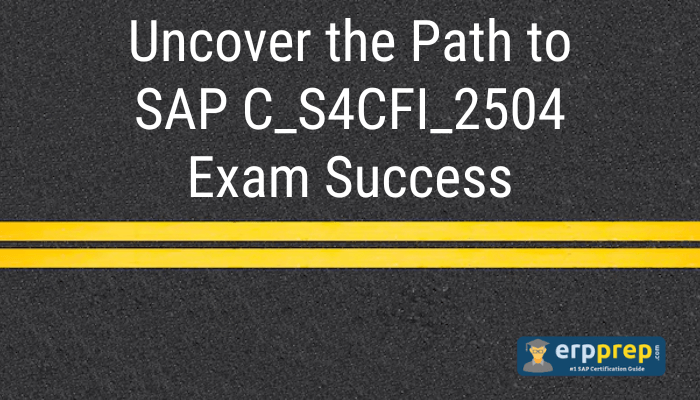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