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재설계할 때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7.39480033.1.jpg)
보험산업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고령화, 기후 위기 등 거대한 구조 변화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보험은 위험을 보장하는 전통적 기능을 넘어 사회 안전망과 자금 중개자 역할을 더욱 많이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보험산업은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한계는 단순히 시장 여건 때문만은 아니다. 산업을 둘러싼 제도적 틀이 여전히 과거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점도 문제다. 자산 운용 관련 규제가 대표적이다. 현행 제도는 보험회사가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정해두고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 외화자산, 자회사 관련 자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정량적 비율 규제는 안정성과 위험 분산이라는 명분 아래 유지돼 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보험회사의 전략적 판단과 시장 대응 능력을 제약한다. 헬스케어, 웰니스 등 사회적 요구는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보험회사는 여전히 정해진 자산 비율의 틀 안에서만 운용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수익성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 모두 쉽지 않다.
주목할 점은 보험회사를 둘러싼 규제 체계가 이미 사후적이고 간접적인 관리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도입된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2023년 시행된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모두 보험회사가 스스로 위험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올해부터 대형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이 본격화했다. 요컨대 규제 체계는 점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와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운용 비율 규제만은 여전히 과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규제 체계 전반의 실효성과 일관성마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규제 철학을 전환해왔다. 영국 독일 일본 등도 과거에는 우리와 비슷하게 자산운용 비율을 사전에 규제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이를 폐지하거나 크게 완화했다. 대신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투자 관련 위험을 평가·공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독의 중심축을 옮겼다.
이제는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 규제는 산업의 위험을 관리함과 동시에 성장을 유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모든 것을 사전에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도 이제는 ‘사전 통제’가 아니라 ‘사후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일부분을 손보는 미세조정이 아니다. 규제 철학 전체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변화한 환경에 맞춰 규제의 틀을 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는 역설에 빠질 수 있다.

 1 week ago
2
1 week ago
2
![[만물상] ‘소림사 CEO’의 몰락](https://www.chosun.com/resizer/v2/TZIN5IVVDNFHHFYAHEDQ3SLBYI.png?auth=20b0c3dfd611df121ef3429a22abd6caf3ad3d40385eb08aef38ba8bc7c49aeb&smart=true&width=600&height=334)
![[다산칼럼] 스테이블코인과 통화주권](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인사]문화체육관광부](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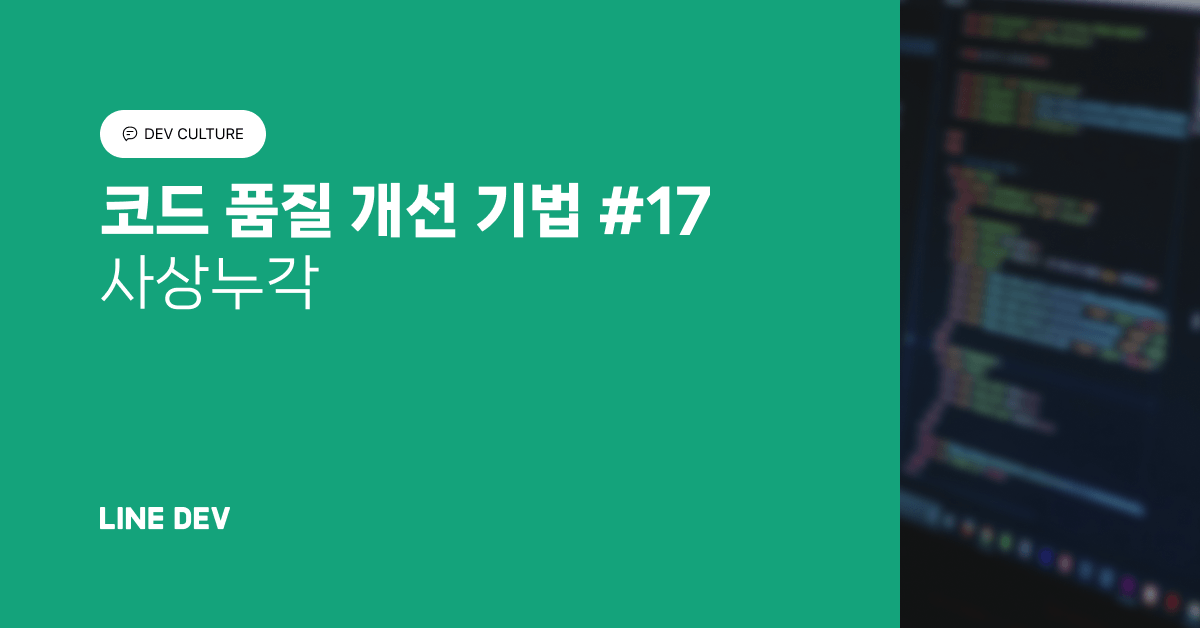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