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랑혁 구루미 대표
이랑혁 구루미 대표인공지능(AI)은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됐다. 그러나 국내 AI 산업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비수도권 지역은 디지털 소외와 디지털 산업 성장 정체의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때 파산 직전까지 갔던 애플이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으로 도약한 전략은 지방 AI 생태계 조성에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애플의 성공 요인을 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애플은 복잡한 제품군을 정리하고 핵심 제품에 집중해 부활했다.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와 산업계는 지역의 고유 자원과 산업 기반에 맞는 특화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예컨대 충청북도는 방사광가속기를 중심으로 AI 기반 신소재·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증평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AI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가능케 한다. 정부는 차별화된 전략과 시장이 있는 지역을 공정하게 선정해 AI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기술 수용성이 곧 혁신의 속도를 결정한다' 애플은 기술을 사람 중심으로 설계해 소비자 경험을 극대화했다. 지방도 AI를 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로 구현해야 한다. 농촌의 스마트팜, 고령층을 위한 AI 돌봄 서비스는 주민의 삶에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 기업과 AI 전문기업 간의 협업이 중요하며 주민, 공무원,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통해 기술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애플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를 조성했듯 지방도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개방형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AI인프라를 권역별 거점 지역에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AI스타트업 육성과 기업 유치에 집중한다. 더불어 AI 제품이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AI 솔루션 도입을 통해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한다. 정부는 '국가 AI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방의 AI기업이 국가와 글로벌 시장의 동향과 정책을 빠르게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AI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불과 2~3달 전의 정책이나 개발한 기술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빠르게 분화하고 융합하는 글로벌 AI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학·연·관 전문가들간 빠른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현재 소통의 범위가 우리나라 AI컨트롤 타워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중앙기관 중심이었다면 넥스트는 지방정부의 AI리더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확대해 AI 정책과 산업의 방향성을 함께 맞추며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
정부와 지방정부 리더의 강력한 비전과 추진력은 혁신의 출발점이다. 광주는 'AI 중심도시'를 선포하고 관련 인프라와 기업 유치에 나섰으며, 경기도는 AI빅데이터산업과를 통해 실생활 중심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지역 주도형 혁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과 함께 실행 역량을 갖춘 전문가 조직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5년 AI 관련 추경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방 스스로 AI 발전 로드맵과 컨트롤타워를 갖추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지방은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각 지역만의 강점을 살린 AI 특화 전략을 구축하고, 지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수요 기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강력한 비전과 실행력을 갖춘 리더십, 그리고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개방형 생태계가 더해진다면, 지방은 '넥스트 실리콘밸리'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맞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가 AI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도가 될 것이다.
이랑혁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초거대AI추진협의회 부회장·구루미 대표 lucas.lee@gooroomee.com

 1 month ago
12
1 month ago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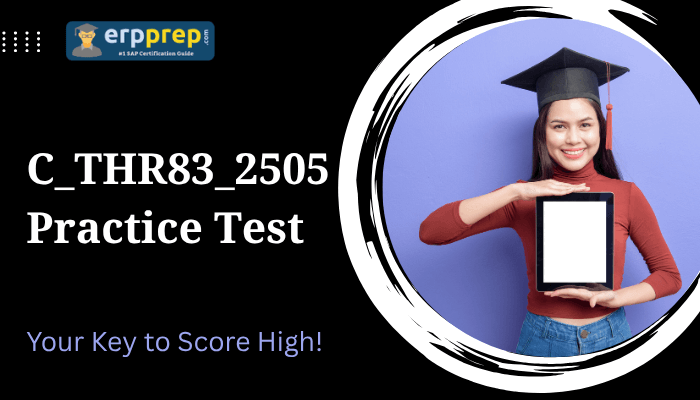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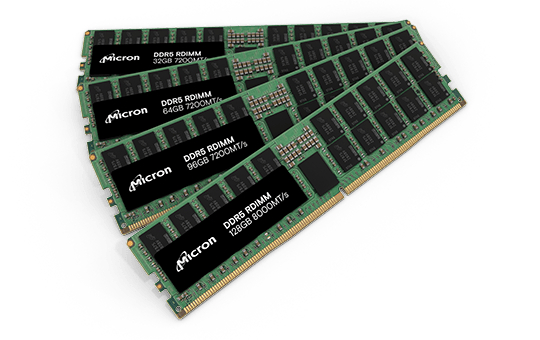



![[朝鮮칼럼] 신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대중국 정책](https://www.chosun.com/resizer/v2/RKK4RNGVFNH35JRLLXTTU2RAP4.png?auth=b176df5e9a825f7cfcf8abb8fe5e68d3b8bee2e5054afd5d9ff84d10209fa8ca&smart=true&width=200&height=267)
![[에스프레소] 피터 틸이 묻는다 “AI 강국, 말로만 외칠 건가”](https://www.chosun.com/resizer/v2/N5NWTT7NHJBCFHEEP5IQLW7DKU.png?auth=0e06d154dcf135b7a87bd56824433b79d36da0c6b19e5fa7db13ee646301dc8f&smart=true&width=500&height=500)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