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풍경의 운율, 색채디자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8/07.41039298.1.jpg)
오래전부터 사물과 대화하는 습관이 있다. 골목 모퉁이 벽, 종일 빛을 머금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표지판. 그들이 건네는 표정과 색의 온도를 읽는다. 빛이 스치면 표정이 달라지고, 계절이 바뀌면 목소리도 변한다. 색은 사물의 언어이자 삶의 기록이다.
학교에서 색채학을 가르칠 때 나는 단순한 색채연출만 다루지 않았다. 반드시 색채인문학을 포함시켰다. 색의 기원과 상징, 시대를 건너온 사연을 아는 것은 색을 다루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색채학자 미셸 파스투로는 색을 시대와 문화, 권력과 신념을 품은 살아 있는 역사로 풀어냈다. 나의 강의에도 그의 인문학적 시선을 담았다.
그가 들려준 색의 여정은 장편소설처럼 흥미롭다. 보라는 고대 로마에서 황제와 귀족만이 누린 귀한 색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사치의 상징으로 몰락했고 20세기 들어 예술과 창조성, 페미니즘의 색으로 부활했다. 빨강은 생명과 권력에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혁명과 투쟁을 품었으며, 파랑은 고대 그리스·로마에서 천한 색이었으나 중세 성모 마리아의 로브를 물들이며 순수와 신뢰의 색으로 바뀌었다. 녹색은 한때 변덕과 불안을 상징했지만 르네상스 이후 자연과 재생, 희망의 언어로 변모했다.
해외에서 일하던 시절, 나는 신도시 색채계획 공모전을 접했다.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멀리서의 원경은 ‘보디컬러’, 가까워질수록 드러나는 중경은 ‘페이스컬러’, 발걸음을 멈췄을 때의 근경은 ‘이펙트컬러’로 설계했다. 사람과의 첫 만남이 인상에서 친밀함으로 깊어지듯, 도시도 색으로 인사를 건넨다고 믿었다. 이 계획은 1등을 차지했고 귀국 후 김현선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하는 출발점이 됐다.
서울은 한때 구마다 알록달록한 시설물이 난립한 혼돈 속에 있었다. 서울10색, 250색, 상징색을 만들고 버스정류장과 표지판, 가로시설물의 색을 기와진회색 같은 뉴트럴 톤으로 정리했다. 색을 줄이자 건물, 사람, 하늘이 또렷해졌다. 절제된 배경은 도시를 단정하게 하고, 시선을 진짜 주인공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절제에서 멈추면 이야기는 반쪽이다. 부라노섬의 파스텔톤 골목, 자이푸르의 ‘핑크 시티’, 프랑스 리옹의 ‘빛의 축제’처럼 전략적인 스폿 컬러와 빛은 도시를 브랜드로 만든다. 국내에서도 전남 신안군의 ‘보라섬’, 담양군의 ‘담양초록’이 색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나는 ‘천년담양’ 엠블럼을 디자인하며 그 초록이 단순한 색이 아니라 천년 숲의 숨결임을 느꼈다.
서울, 담양, 신안의 사례에서 나는 확신했다. 도시를 바꾸는 힘은 디자이너의 제안보다 정책결정자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색은 영혼의 미묘한 터치다.” 바실리 칸딘스키의 말처럼 색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언어로 사람의 마음과 도시의 기억을 빚는다. 오늘도 사물과 도시와 대화를 나누며 생각한다. 언젠가 이 색과 빛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 도시를 영원히 사랑하게 만드는 첫 문장이 되기를. 그 순간 나의 색채 디자인은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3 hours ago
1
3 hours ago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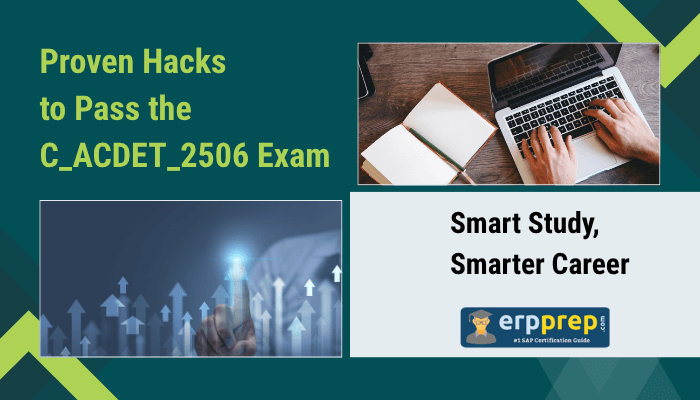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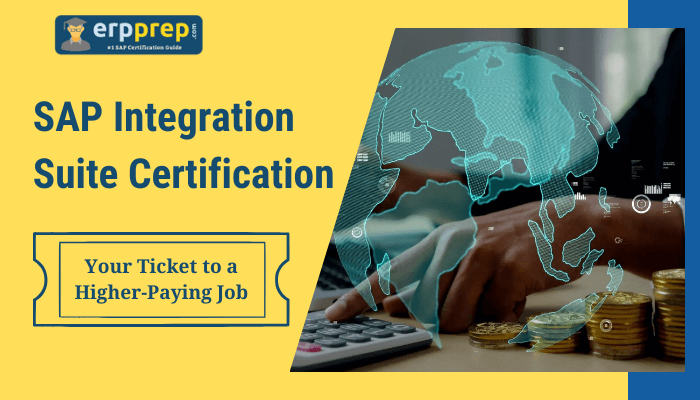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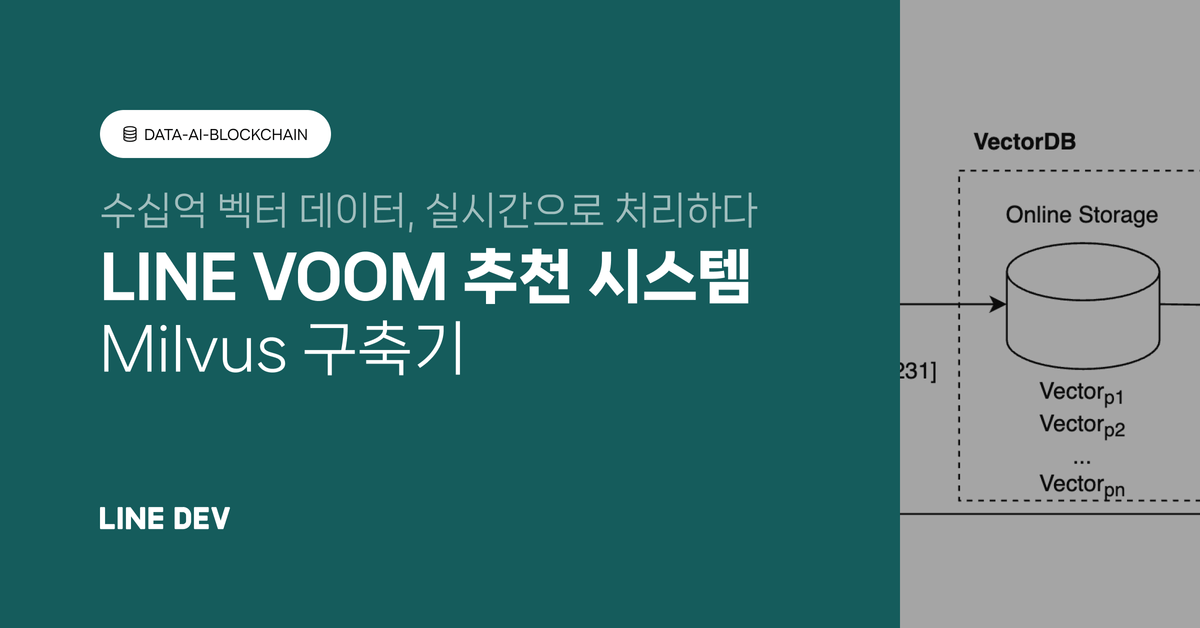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