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아침 산책 중 진주성 촉석루를 걷다 오래된 화포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수백년 전 이 무거운 대포가 성을 지키던 모습을 떠올리며,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무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조선은 세계적으로도 이른 시기에 화약 무기를 개발한 나라였다. 최무선이 화약 제조를 시작하고, 세종 대에는 천자총통, 지자총통 등 강력한 화포를 운용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췄다. 그러나 이 무기들은 크고 무거워 이동과 실전 활용에 한계가 있었고, 주로 성곽 방어에 집중되었다.
반면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사용한 조총은 작고 가벼워 개인이 휴대하며 즉시 사용할 수 있었다. 조총 자체의 기술이 조선을 압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전 운용을 중시하는 무사 문화가 전술적 활용을 빠르게 발전시켰다. 조선은 성리학 중심의 문치주의 국가로, 제도와 학문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고 총기의 개량과 대량 배치에는 신중했다.
그러나 진주성은 달랐다. 김시민 장군은 화포를 단순한 방어 수단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 관군과 주민이 함께 협력하고 반복 훈련을 거듭해 무기, 사람, 공간을 하나의 방어 시스템으로 융합했다. 그 결과 1592년 임진왜란 1차 진주대첩에서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경찰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치안은 국민과의 접촉면이 가장 넓은 공공서비스이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가 기술 성공의 열쇠다.
경찰 현장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적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예를 들면 112 신고를 실시간으로 요약해 상황실에 전달하는 AI, 보고서 초안을 자동으로 제안하는 텍스트 도우미, 민원 응대를 지원하는 음성 기반 AI 챗봇 등이 있다. 이들은 마치 조총처럼 즉시 활용 가능하고, 기동성과 효과성을 갖춘 기술이다.
작고 실용적인 AI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뿌리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축적되는 경험과 사례가 초거대 AI 같은 중장기 전략을 더욱 빠르게 현실화할 기반이 된다.
AI 대전환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김시민 장군이 관군과 주민을 함께 훈련시키고 진주성과 일체를 이룬 것처럼, 오늘날의 AI 혁신도 각자의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다.
사용자는 일상 속에서 AI를 적극 활용하고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조직 관리자는 AI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운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개발자와 정책입안자는 우리 사회에 맞는 독자적 기술 생태계, 즉 소버린 AI 구축에 나서야 한다.
특히 경찰 현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인 만큼, 작고 실용적인 AI 성공 사례를 가장 먼저 축적해야 할 공간이다.
진주성의 화포는 단지 기술적 성과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사람, 조직, 훈련, 실전 경험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강력한 힘이 만들어졌다. AI도 마찬가지다. 기술이 크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기술이 진짜 '강한 기술'이다.
우리는 AI를 거대한 무기처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과 조직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형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
AI 대전환은 작고 실용적인 변화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큰 혁신을 이끌어낼 것이다.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bonijae@police.go.kr

 1 month ago
13
1 month ago
13
![[세상만사] 어느 공직자의 이임사](https://img0.yna.co.kr/etc/inner/KR/2025/07/11/AKR20250711126800546_01_i_P4.jpg)
![[팔면봉] 관세, 국방비, 전시 작전권, 정상회담 개최… 쏟아지는 韓美 현안.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주가 더 올린다고 선의의 기업들까지 희생양 삼나](https://www.chosun.com/resizer/v2/EIAOQU6MIND7NMWYYAIC3GVJFI.jpg?auth=22b4b80de50de03ec478a39add9039a6265040c8f2f3253015797f83562a33a6&smart=true&width=3034&height=1962)
![[사설] 국민·기업 직격탄 관세 협상은 누가 책임지고 있나](https://www.chosun.com/resizer/v2/OTR4TZP56VAATAUKE5WIH37C4I.jpg?auth=1caee60695374db57fdfecf90f551592a97a1f4d8c055cf179c89135f563904d&smart=true&width=3230&height=2023)
![[사설] 기이한 행태 강선우 후보자, 가족부 장관 맞지 않다](https://www.chosun.com/resizer/v2/D5UZJUAX7XRU2E2AOO5MNK75SY.jpg?auth=5df69625837633ae4549e59029807f2721e600c9b0b38e970731cdf372fd1d6a&smart=true&width=2341&height=1757)
![[박정훈 칼럼] “노벨상 받을 정책”](https://www.chosun.com/resizer/v2/SNU6Z2T7D5FPFOV5RU7SQYCRGQ.png?auth=8706222c40791eea37121382644492ea5bb4f71a3903720bd1b454569f16705b&smart=true&width=1200&height=855)
![[태평로] 등번호 7번 영웅의 유니폼 갈아입기](https://www.chosun.com/resizer/v2/5FJ4T2PFOFEGZNUT2QQMBGQOSU.jpg?auth=6a07451c56c4fd89272f75092d0eea4689c88e892cdd0b4e2c4a7083f539ed98&smart=true&width=500&height=428)
![[데스크에서] 정권 따라 먼저 눕는 금융권](https://www.chosun.com/resizer/v2/CVK3U4ZCRNBU5CDBQIEWCA7L5Q.png?auth=4996f952b11aa0808ba34969c2cfbf3b73f027df2b3cfa42ca9fc56ea95d8848&smart=true&width=500&height=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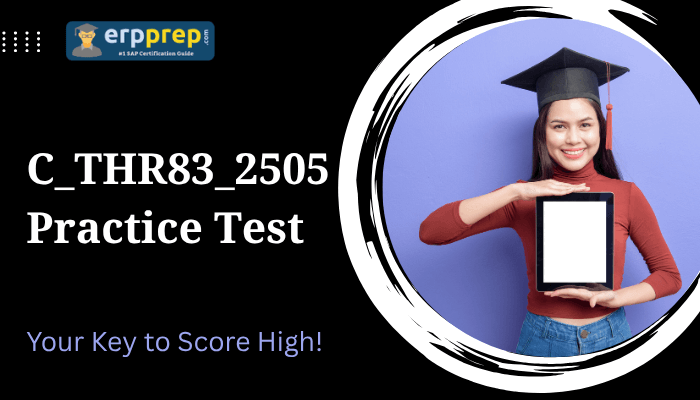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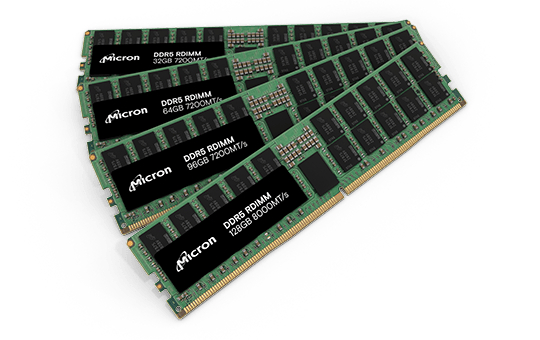



![[朝鮮칼럼] 신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대중국 정책](https://www.chosun.com/resizer/v2/RKK4RNGVFNH35JRLLXTTU2RAP4.png?auth=b176df5e9a825f7cfcf8abb8fe5e68d3b8bee2e5054afd5d9ff84d10209fa8ca&smart=true&width=200&height=267)
![[에스프레소] 피터 틸이 묻는다 “AI 강국, 말로만 외칠 건가”](https://www.chosun.com/resizer/v2/N5NWTT7NHJBCFHEEP5IQLW7DKU.png?auth=0e06d154dcf135b7a87bd56824433b79d36da0c6b19e5fa7db13ee646301dc8f&smart=true&width=500&height=500)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