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김동진 기자] AI 고도화와 적용 범위 확대로 민간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속속 단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10배 이상 전력을 소모하는 AI 데이터센터 발열 관리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AI 데이터센터 확대 구축에 따라 2030년 약 41조 원 규모로 성장할 냉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냉각 솔루션 개발, 공급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데이터센터 내부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데이터센터 내부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발열 잡을 냉각 솔루션 속속 등장
AI 데이터센터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 학습과 사용자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추론 기능 등을 뒷받침한다. 대규모 AI 연산을 수행하므로 기존 직렬 연산이 아닌 병렬 연산에 최적화된 그래픽처리장치(GPU)나 텐서처리장치(TPU) 등 특수 프로세서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여기에 실시간 연산 처리를 위한 초고속 네트워크와 데이터 저장·활용을 위한 고속 SSD, 대용량 HDD 등을 조합해 성능을 발휘한다.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하드웨어들이 AI 데이터센터 한곳에 모이다 보니 가뜩이나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전력 소모량이 기존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소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기존 방식으로는 발열을 잡을 수 없었다. 기존 데이터센터에는 서버의 빈 곳으로 찬 바람을 넣는 공랭식 냉각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공랭식 냉각 방식은 설치 비용이 저렴하지만 소음과 전력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냉각용 액체가 흐르는 파이프를 회로에 붙여 설치하는 수랭식 냉각 방식이 다수 채택됐다. 수랭식 냉각 방식은 공랭식에 비해 월등히 비싸지만 그만큼 발열 제어 능력이 뛰어나 데이터 처리량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 냉각 방식 / 출처=동아일보
데이터센터 냉각 방식 / 출처=동아일보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랭식 냉각 방식으로도 데이터센터 발열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워지자 등장한 기술이 액침 냉각이다. 서버를 아예 냉각용 액체에 직접 담그는 방식이다. 누가 얼마나 더 빠르게 서버를 냉각시킬 수 있느냐가 AI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냉각 기술 개발의 축이 액침 냉각으로 이동한다. 수요도 가파르게 상승한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 규모는 2023년 148억5000만 달러(약 20조6000억 원)에서 2030년 303억1000만 달러(약 42조850억 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액침 냉각 방식을 채택한 대표적인 기업은 미국 반도체 설계·제조 기업 엔비디아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인공지능 그래픽처리장치인 ‘블랙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액침 냉각 솔루션 도입을 공식화했다.
늘어나는 액침 냉각 수요에 관련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일례로 글로벌 6위 규모 석유회사이자, 일본 최대 종합 에너지 기업 ‘에네오스(ENEOS)’는 CES에서 미래 신사업으로 데이터센터용 액침 기술을 선보였다.
 에네오스의 데이터센터용 액체냉침 기술이 적용된 장치 / 출처=IT동아
에네오스의 데이터센터용 액체냉침 기술이 적용된 장치 / 출처=IT동아 에네오스의 데이터센터용 액체냉침 기술이 적용된 장치 / 출처=IT동아
에네오스의 데이터센터용 액체냉침 기술이 적용된 장치 / 출처=IT동아
에네오스 관계자는 “AI 활용처가 확대되면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졌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냉각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전용 액체냉침 기술을 선보였다”고 말했다. 반도체 설계 제조 기업 인텔도 미국 휴스턴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액침 냉각 시스템 기업인 GRC와 손잡고 기술 개발에 나섰다.
국내 기업도 발 빠르게 움직인다. 국내 최초로 액침 냉각 전용 플루이드를 개발한 SK엔무브는 SK텔레콤 전용 데이터센터에 해당 제품을 공급 중이다. SK엔무브는 앞서 언급한 미국 GRC에 2500만 달러(약 350억 원) 규모 지분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LG전자도 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기술 개발에 나섰다. 이 기업은 중량과 설치 면적을 줄인 냉방 칠러를 개발했으며 엔비디아에 액체 냉각 솔루션 공급 방안을 협의 중이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등 정유사들도 앞다퉈 액침 냉각유를 개발하며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천연 냉각수 활용 ‘해저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 진행 중
천연 냉각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해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MS 나틱 프로젝트 / 출처=MS
MS 나틱 프로젝트 / 출처=MS
마이크로소프트(MS)는 해저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나틱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나틱 프로젝트는 컨테이너 형태의 데이터센터를 해저에 설치·운영하는 MS의 개발 프로젝트다. MS는 지난 2015년 나틱 프로젝트 1단계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6월, 해저 데이터센터의 효율성 및 실용성·친환경성을 확인하는 2단계 실험을 스코틀랜드 오크니섬 해저 약 117피트(약 36.5 미터) 지점에서 진행했다. 총 864대의 서버와 27.6PB(페타바이트) 용량의 스토리지, 냉각 시스템 등을 장착한 약 12미터 길이의 데이터센터 ‘나틱 노던아일(Natick Northern Isles)’을 해저에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후 약 2년간 MS 내 18개 이상의 그룹이 데이터센터를 사용하며 서버 성능과 안정성을 테스트했다. 그 결과 MS는 해저 데이터센터가 지상 데이터센터에 비해 고장률이 8분의 1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상과 달리 해저 데이터센터는 산소보다 부식성이 적은 질소에 노출되는 환경적 특성이 있고 무인으로 운영되므로 물리적인 충돌과 같은 위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난 앞바다에 해저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하이랜더 / 출처=하이랜더
하이난 앞바다에 해저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하이랜더 / 출처=하이랜더
중국 데이터센터 기업 하이랜더도 해저 데이터센터를 실험 중이다. 이 기업은 중국 하이난 섬 인근 해저에 상업용 수중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지난 6월부터는 상하이 앞바다에 새로운 수중 데이터센터를 설치 중이다. 하이랜더는 수중 데이터센터 내부를 질소로 채운 덕분에 지상 데이터센터보다 고장이 적고 운영 효율이 높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해저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현대건설, SK텔레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23개 기업·기관과 손잡고 울산 앞바다 수심 30m 지점에 건설할 ‘해저기지’를 통해서다. 2027년 완공 예정인 해당 기지의 한 부분에 GPU 80개로 구성한 ‘수중 데이터센터 모듈’이 설치된다. 해당 모듈의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닷물을 활용할 예정이다.
 해저기지 내부도 / 출처=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저기지 내부도 / 출처=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저기지에 설치할 데이터센터 환경 모사 실험을 진행한 결과, 기존보다 전체 운영 비용이 약 38% 줄었다고 밝혔다. 실제 운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면 2035년까지 최대 10만 대 서버를 수용하는 해저 데이터센터 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저 데이터센터 단지 예상도 / 출처=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저 데이터센터 단지 예상도 / 출처=한국해양과학기술원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8 hours ago
1
8 hours ago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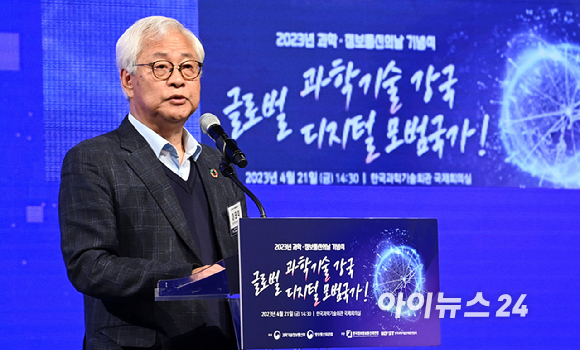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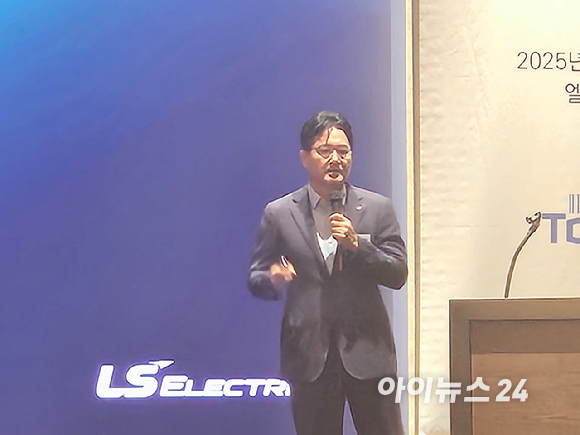






![[KPGA 최종순위] KPGA 선수권대회](https://r.yna.co.kr/global/home/v01/img/yonhapnews_logo_1200x800_kr01.jpg?v=20230824_1025)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