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UPI·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중국 춘추시대 정(鄭)나라는 남쪽의 초(楚)와 북쪽의 진(晉) 사이에 낀 소국이었다. 강한 쪽에 기대 살아남으려는 줄타기 외교가 유일한 생존수단이었다. 초나라가 세를 떨치면 초에 붙고, 진나라가 기세등등하면 진에 붙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전쟁터는 늘 정나라 땅이었고, 백성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정나라는 결국 두 강대국의 신뢰를 잃었다. '줄을 잘 서면 산다'라는 말은 허상이었다.
전국시대 위(魏)나라도 사정은 비슷했다. 한때 중원의 패자로 군림했지만, 서쪽 진(秦)과 동쪽 제(齊)가 급성장하자 두 강대국 사이의 완충지대가 됐다. 위 혜왕(惠王)은 장의(張儀)가 제시한 연횡책(聯橫策), 진나라와 손잡아 국면을 돌파하려는 외교전략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진의 팽창 야욕을 채워줄 뿐, 위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날로 약해졌다. 전략적 선택도 국력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신기루에 불과했다. 이 사례들은 2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본질은 오늘날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은 춘추·전국시대보다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영토가 아닌 관세·자원·기술·금융의 다차원 전면전이다. 이 틈바구니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점점 늘고 있다. 중국산 자동차를 수입하는 멕시코는 미국 압력에 굴복해 50% 관세를 부과했고,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7년 만에 베이징을 방문하며 줄타기를 시도했으나 양쪽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문제는 냉전 때처럼 한쪽에 줄을 선다고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강대국들은 각국에 일방적 수용을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중 양국은 노골적으로 한국에 "누구 편이냐"라고 묻고 있다. 미국은 안보를, 중국은 경제를 무기로 내민다.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현금성 대미 투자 3천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와 발전 이익을 침해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러한 양국의 압박과 함께 한국 경제는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천400원을 훌쩍 넘어섰고, 수출은 줄고 수입 물가는 오르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의 기업과 가계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다.
냉엄한 국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상대가 필요로 하는 히든카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희토류, 제조기술력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은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과 엔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방패로 삼고 있다. 한국도 반도체, 배터리 소재, 초대형 선박 등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구축해야 한다. 내수시장 확대와 공급망 다원화 확보도 과제다. 미·중 양국이 한국 없이는 곤란한 영역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한국이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10월18일 08시14분 송고


![모더나 수석부사장 "mRNA 백신, 암 치료 새 시대 연다" [ESMO 2025]](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01.42090683.1.jpg)
![[국정자원 화재, 정부시스템 마비]화재 발생 3주만 복구율 50% 넘어](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30/news-p.v1.20250930.0bce3c0c43be41cda624cd0de1659f9f_P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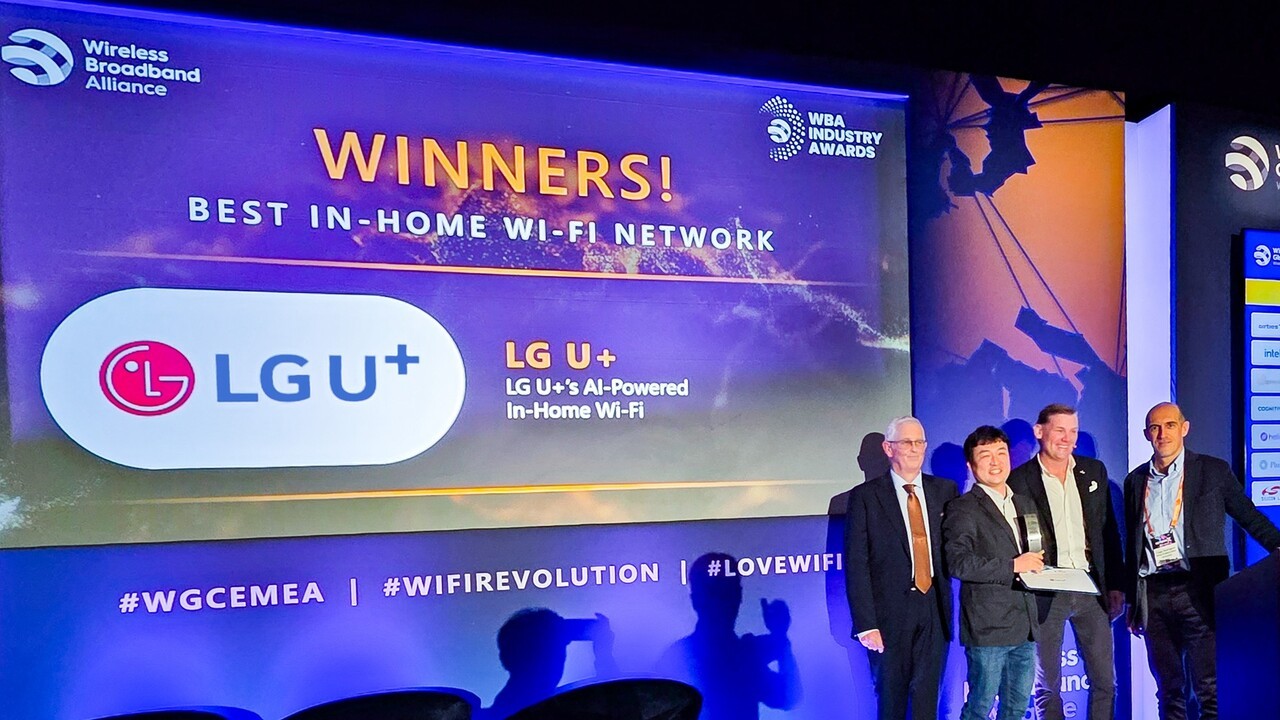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