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디지털 생활자' 저자)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디지털 생활자' 저자)조선백자의 성공은 어떻게 이뤄진 걸까. 조선 초기엔 분청사기가 유행했다. 청자를 만들던 흙으로 그릇을 만든 뒤에 하얀 흙과 유약을 발라 굽는다. 도자기 겉면에 상감, 인화, 귀얄 등 다양한 기법으로 꽃, 물고기 등 무늬를 입혀 다채롭게 했다. 그러나 새로운 왕조인 조선을 대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세종은 왕실의 금, 은, 금속 그릇을 백자로 대체했다. 그릇 바닥에 제작자 이름을 기록해 장인의 자존감을 높였다. 왕은 백자를 사용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백자가 가진 극한의 하얀 색은 왕, 신하와 백성을 하나로 만들었다. 백자의 인기가 높아지고 품질도 좋아졌다. 명나라가 조선에 백자를 보내줄 것을 요구할 정도였다.
백자는 청자보다 고온에서 구어야 뭉개짐을 막고 단단함을 유지한다. 가마의 온도를 높이고 열을 고르게 유지해야 한다. 가마 천장 또는 옆에 출입구를 만들어 땔감을 넣었다. 가마 안에도 기둥을 설치하고 방을 만들었다. 경사진 언덕에 굴 모양으로 가마를 만들었다. 아궁이에 땔감을 넣어 불을 지피면 경사를 타고 열이 위로 올라가며 그릇을 굽고 맨 뒤 굴뚝으로 연기를 내보낸다. 중국이 화려한 채색의 도자기 생산에 열을 올릴 때에 우리는 최고의 기술로 순백의 탄탄한 백자 생산에 집중했다. 단순함, 고고함, 탄탄함으로 고품격의 감동을 주는 극한의 '미니멀리즘'이 탄생한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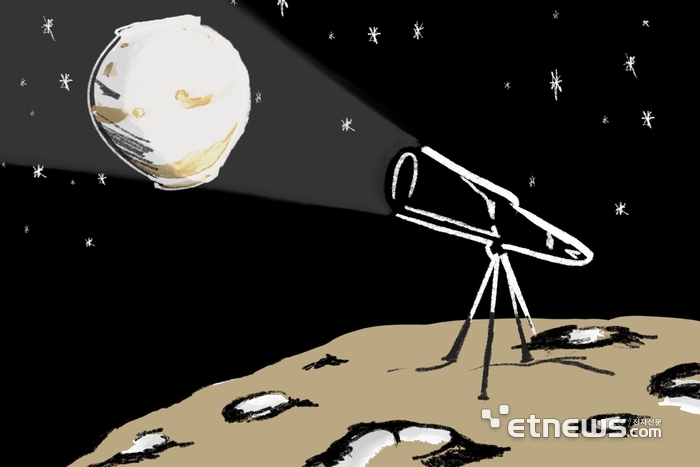 그림작가 이소연 作
그림작가 이소연 作조선 후기에는 푸른색의 청화 안료를 수입해 산수화 등 무늬를 입힌 백자가 주류를 이룬다. 청화 안료의 수입이 어려워지면 철, 구리 등 국산 안료를 개발했다. 고급안료가 부족하면 도자기를 도화지 삼아 아름다운 그림을 입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 정부에 소속된 화가들이 나서 선비가 좋아하는 매화, 난, 국화, 대나무 등을 수놓거나 산수화, 한시를 도자기에 새겼다. 국가가 안정된 영조 이후 백자의 전성기를 이뤘다.
백자 중의 압권은 둥그런 모양에 높이 45cm 내외의 백자 '달항아리'다. 해외 크리스티 등 경매에서 약 40억원 내지 60억원에 낙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국보 3개, 보물 4개가 지정되어 있다. 뭉개짐을 막기 위해 두 개의 반원을 따로 만들어 붙인 뒤에 가마에서 굽는다. 18세기에 조선에서만 백년간 제작됐는데 이유와 용도를 모른다. 그 중 국보 309호 달항아리는 보는 각도에 따라 원의 모양이 다르고 얼룩덜룩한 무늬가 자연스레 배어 있다. 2007년 성분조사에서 오동나무 기름과 같은 패턴이 확인되어 고급기름을 보관하는데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오랫동안 쓰임을 당해 검버섯처럼 얼룩이 배였지만 고고한 자태와 빛깔을 잃지 않았다. 순백의 매끈한 아름다움도 좋지만 살짝 이지러지고 얼룩이 묻은 것이 더욱 애틋하다. 손잡이가 없으니 사람이 온 몸으로 안고 살아 정이 들어 그럴지 모른다. 그런 것이야말로 뛰어난 작품성이 아닐까. 달을 보듯 물을 보듯 달항아리를 보며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마냥 좋다. 김환기, 최영욱 등 많은 작가들이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작품 활동을 했다.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아모레퍼시픽 용산 사옥을 설계할 때에 모티브를 주기도 했다.
서구의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목을 매는 현 시점에서 곰곰이 생각해보자. 뭣이 중한가. 서구가 만든 게임의 틀과 룰에 종속되지 말자. 조선이 백자를 만들고 가치를 더했던 것처럼 AI혁신이나 소버린 AI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가치체계와 원칙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품질증대와 시장창출에 나서야 한다. 서구 AI에 대한 단순 모방은 불필요한 중복이 되어 버려지기 쉽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뿐이다. 조선, 방산, 반도체, 통신, 콘텐츠, 장비 등 우리의 장점과 AI를 연결해 글로벌 AI생태계에서 핵심 축과 연결고리로 만들어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그것만이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AI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디지털 생활자' 저자)

 2 days ago
2
2 days ago
2
![[송평인 칼럼]윗물이 뻔뻔하니 아랫물도 뻔뻔하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7/09/131972915.1.png)
![[횡설수설/신광영]7년 허송… 길 잃은 고교학점제](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7/30/132102749.2.jpg)
![[오늘과 내일/정임수]방시혁의 ‘분노’ vs 개미들의 ‘분노’](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7/09/131972909.1.png)
![[광화문에서/이유종]‘폭염의 일상화’ 생존 위협… 함께 살아가는 법 배워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7/10/131980341.1.png)
![[고양이 눈]“무슨 잘못을 한 거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7/30/132101220.5.jpg)
![2초 찰나를 위한 열정[이은화의 미술시간]〈381〉](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7/30/132101233.5.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