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낭만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허먼 멜빌이 고래잡이 경험을 녹여 쓴 야심작 <모비 딕>. 24만 단어에 이르는 이 방대한 소설은 포경선에 승선한 청년과 자신의 다리를 앗아간 흰고래 모비 딕을 증오하며 광기를 부리는 선장, 합리적 그리스도교도인 일등항해사, 이민족이지만 통찰력을 지닌 작살잡이 등이 거대한 고래를 쫓는 과정을 그린다. 작품 속에는 고래잡이에 관한 온갖 지식과 인간에 대한 성찰적 명상이 밀도 있게 응축돼 있다.
그러나 독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흥미로운 고래잡이 얘기에 철학적이고 종교적이며 신화적인 주제까지 담아냈지만 대중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서점에서도 문학 코너가 아니라 수산업 코너에 꽂혀 있었다. 멜빌은 죽을 때까지 그 벽을 넘지 못했다. 남북 전쟁과 이후의 서부 개척, 산업화 열풍에 휩싸인 사회에서 해양 모험담은 관심을 끌기 힘들었다. 그가 이 작품으로 얻은 수익은 556달러에 불과했다.
서랍에서 발견된 유고시 1800편
그의 말년은 궁핍했다. 식구는 많은데 출판사의 파산으로 인세도 못 받고 빚만 늘어났다. 우여곡절 끝에 세관에 일자리를 얻어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그사이에 두 아들이 자살하거나 객사하는 아픔을 당했다. 작가로서는 완전히 잊히다시피 했다. 1891년 72세로 세상을 떴을 때 그를 문학계 인사로 기억하는 이는 드물었다. 당시 부고란에 ‘문단 활동을 했던 한 시민’이라고 기록될 정도였다.
그는 사후 30년이 다 돼서야 재평가됐다. 그의 탄생 100주년인 1919년을 맞아 연구자들이 생애와 작품을 잇달아 연구하면서 ‘멜빌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마침내 19세기를 대표하는 영문학계의 금자탑으로 인정받게 됐다. “멜빌의 <모비 딕>은 셰익스피어의 <햄릿>, 단테의 <신곡>과 같은 수준의 문학작품”(루이스 멈퍼드)이라는 찬사가 잇따랐다.
그와 비슷한 시기를 살다 간 여성 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생전에 발표한 시가 10편도 되지 않았다. 나머지 약 1800편은 죽고 난 뒤 서랍 속에서 발견됐다. 그의 시는 당시의 관습과 너무 달랐다. 리듬과 문법, 주제가 워낙 파격적이어서 출판사도 고개를 저었다. 유품을 정리하던 동생이 수많은 원고 더미를 발견한 뒤 그의 천재성과 독창성이 알려졌다. 그의 작품에는 인간 존재의 무게, 사랑과 상실의 깊이, 언어 이전의 침묵이 흘러넘쳤다. 살아서 ‘백의의 은둔 노처녀’로 불린 그는 죽어서 미국 현대시의 한 원형이 됐다.
<변신>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생전에 작품을 거의 출간하지 않았고, 발표한 것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죽기 전에는 친구에게 “모든 원고를 불태워 달라”고 유언했다. 친구가 이를 어기고 원고를 출간한 덕분에 세계적인 작가로 거듭났다. ‘카프카적’이라는 말은 부조리와 억압 구조를 상징하는 단어가 됐다.
진정한 문학은 당대의 평가를 초월한다. 세상이 늦게 알아본다고 해서 가치가 퇴색되는 것도 아니다. 늦게 인정받는 것은 성숙의 또 다른 증거일 수 있다. 이들은 누구보다 자기 신념에 충실했고, 남의 인정보다 창작 자체에 몰입했다. 어느 시대든 진실한 문장은 독자에게 도달하는 길을 스스로 찾아낸다. 사후에 빛난 명성이 더 깊은 감동을 주기도 한다.
음악사에도 뒤늦게 ‘재발견’된 인물이 많다. ‘가곡의 왕’으로 불리는 프란츠 슈베르트는 31년의 짧은 일생에 998개 작품을 작곡했다.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멜로디가 솟아 나왔다. 하지만 그는 죽기 1년 전까지 피아노 살 돈이 없어 가곡 대부분을 기타로 작곡했다. 그는 시대를 노래했으나 시대는 그를 듣지 않았다. 사후 친구들이 유고작을 출판하면서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 ‘겨울 나그네’ 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외로운 영혼의 노래는 때로 천천히 퍼져 더 멀리 닿는다.
러시아 민중의 목소리를 담은 작곡가 무소륵스키도 당대 음악 아카데미와 평단에서 “조악하다”는 혹평을 받았지만 42세에 요절한 뒤 재평가를 받았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역시 “너무 길고 복잡하다”며 외면받았다가 훗날 레너드 번스타인 같은 지휘자들에 의해 현대 교향악단의 필수 레퍼토리로 화려하게 부상했다.
한때 "형편없는 화가" 소리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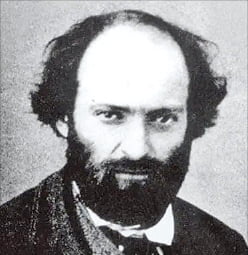
미술 쪽은 어떤가. 빈센트 반고흐가 생전에 그림을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오래 산 화가 중에서도 인생 후반에 들어서야 인정받은 사례가 즐비하다.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폴 세잔은 20번 가까이 국전 심사에서 낙방하며 “형편없는 화가” 소리를 들었다. 인상주의자들조차 그를 불편해했다. 말년에 이르러서야 그의 그림을 알아보는 이들이 생겼다.
그가 즐겨 그린 것은 사과 한 개, 혹은 산 한 봉우리였다. 언뜻 단조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가 평생 몰두한 색채와 형태, 시선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인간의 시선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림 속 사과는 정지된 대상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는 존재였다. 생전의 그가 외로웠던 것과 달리 그의 사과는 결국 세상을 뒤집었다.

‘빛의 화가’ 클로드 모네도 빛을 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모네는 초기 인상주의 화풍 때문에 한동안 소외됐다. 가족은 가난에 시달렸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다. 그러나 노년에 ‘수련’ 연작과 지베르니의 정원 그림들이 점차 인기를 얻으면서 대가의 대우를 받았다.

이들은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도 자신만의 언어와 색채를 포기하지 않았다. 살아서 번민했으나 죽어서 불멸이 된 이들의 예술은 시공을 넘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사과 한 알, 시 한 줄, 밤하늘의 별빛, 교향곡 한 악장이 수백 년 뒤 우리 가슴을 여전히 적시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이름 없는 디킨슨과 가난한 고흐, 무대 밖의 말러가 번민하고 있을지 모른다. 에밀 졸라의 말처럼 “천재는 세상보다 앞서 도착한 손님”이며, 세상은 이들을 너무 늦게 이해하거나 너무 이르게 놓치곤 한다.

 1 month ago
15
1 month ago
15
![[사설] 檢 항소 포기, 대장동 일당과 李 대통령에 노골적 사법 특혜 아닌가](https://www.chosun.com/resizer/v2/MVRDCYLFGU2DOYLCGEZTCZRXME.jpg?auth=e7208408e32f3c86fca96d1cc26ab946aa0573ff3afc88149eaf47be452d2014&smart=true&width=4501&height=3001)
![[팔면봉]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여권 인사도 놀란 듯.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권력 앞에 검찰권 포기, 용기 있는 검사 단 한 명 없었다](https://www.chosun.com/resizer/v2/GRSDOM3GGRTDMMZVMIZWEMRSGI.jpg?auth=3660099caccde3b5cc42f8a35fb1d3d3ed7245720ce0ddba78c999c2772ee0ad&smart=true&width=399&height=255)
![[사설] 국힘 대표 부인이 김건희에게 가방 선물, 민망하다](https://www.chosun.com/resizer/v2/MVQTQNLDMJSDONRTMVQWINDBG4.jpg?auth=8141846de3d24a96723f9b1cff26e76f746dd63a88bb3beb44b86fbf01793855&smart=true&width=6673&height=4246)
![[朝鮮칼럼] ‘진보 정권의 아이러니’ 재현하지 않으려면](https://www.chosun.com/resizer/v2/VXXDKUIJUJCOLIT4M4DA47BFKY.png?auth=47d5c0a683690e4639b91281f2cab5fd3b413998a70d2183f12a92e1f1b8119d&smart=true&width=500&height=500)
![[강헌의 히스토리 인 팝스] [287] K팝, 그래미상 ‘빅4′ 고지 오를까](https://www.chosun.com/resizer/v2/5XHK7PZ56NHTTKH7COJFQ4M54Q.png?auth=664876bab5cee8d9c73896a7d01b64f27386130e62bef9ae4289fdb3837c803b&smart=true&width=500&height=500)
![[동서남북] 원산·갈마 리조트에서 이산가족 상봉을](https://www.chosun.com/resizer/v2/273GIBFF3NCHBC5LVGUUIDK3GM.png?auth=2dc473a67ab5cc661f563ad05832554564124579b2d90352af8c3782f593b38f&smart=true&width=500&height=500)
![[문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詩] [95] 밥그릇 심장](https://www.chosun.com/resizer/v2/JZ2DPK7OZBANLBLB5SS5OH3S6I.png?auth=9fb621a8d43376974dd4c21736aba72e87fd3876911d9303e1df9f5adebb9cb7&smart=true&width=500&height=500)







![닷컴 버블의 교훈[김학균의 투자레슨]](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