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시 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임금 협상을 보면 임금체계 개편이 얼마나 풀기 힘든 난제인지 알 수 있다.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규정 탓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칼자루를 노조가 쥐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를 뒤집으면서 기업들 부담이 크게 늘었다.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로 인건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사측이 버스노조에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한 것도 여기서 비롯됐다.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짜인 임금 구조인 만큼 느닷없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요지부동이다.
실제로 서울 버스의 경우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따르면 각종 수당 인상률이 15%에 달한다. 여기에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8.2% 인상이 더해지면 임금 인상률이 25%에 이른다. 전체 인건비 증가액은 3000억원으로, 모두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게다가 서울 시내버스는 누적 부채가 1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서울 버스만의 문제도 아니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정년 연장’이나 ‘주 4일제’ ‘주 4.5일제’를 약속하고 있지만 기존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고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는 등 생산성을 높일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기업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당장 눈앞의 표만 바라보고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정치권과 법원은 모든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는데 이웃 일본만 해도 다르다. 사회적 합리성을 갖춘 경우 노조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노동법에 명문화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노조의 동의 없이는 어떤 유연화 시도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에서 기업에 혁신과 경쟁력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지 모른다.

 10 hours ago
1
10 hours ago
1
![[MT시평]오래된 시계를 고쳐 써야 할 때](http://thumb.mt.co.kr/21/2025/05/2025051815400889487_1.jpg)
![[투데이 窓]다가오고 있는 원격진료 시대](http://thumb.mt.co.kr/21/2025/05/2025051918363239662_1.jpg)
![[팔면봉] 민주당, “대선 압승 언급하면 징계” 내부 입단속 세게 해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SKT 해킹도 중국계 추정, 中 앞에 무방비인 나라](https://www.chosun.com/resizer/v2/XKLBRBVIKNOHZHKX3QXTRUABCQ.jpg?auth=82c639edb9af34a01c58fdf86dffaa1267eb1ee611f6f898156cae691d3ab940&smart=true&width=5806&height=3827)
![[사설] 퍼주기 아닌 참신한 민생 공약들, 박수받을 만](https://www.chosun.com/resizer/v2/Q2BTRLP3QTKWIWC5354G3EIGAM.jpg?auth=9e717a505b3ef2a2edaec861904707288023663d7a6b35677603d5b86b3129e9&smart=true&width=3452&height=2124)
![[최준영의 Energy 지정학] 석탄의 나라서 바람의 나라로… 英 에너지산업 바꾼 ‘해상풍력+경쟁입찰’](https://www.chosun.com/resizer/v2/BAUYW2TIXBH5JH7USSVZCG7IXQ.png?auth=f5fa048e888151afb801a0bd5e40c5d55b76d0d008ec39cdec4d4bdc5db7a37e&smart=true&width=1600&height=900)
![[현예림의 함께 신문 읽어요] 종이 신문의 ‘디톡스’](https://www.chosun.com/resizer/v2/CUG5R4SUWVB6FIYFMP2BNPPIKI.png?auth=e4b4178d95929cffde64bbf3fd0fe798cadb50922697c69748f86e03dd92ccc6&smart=true&width=500&height=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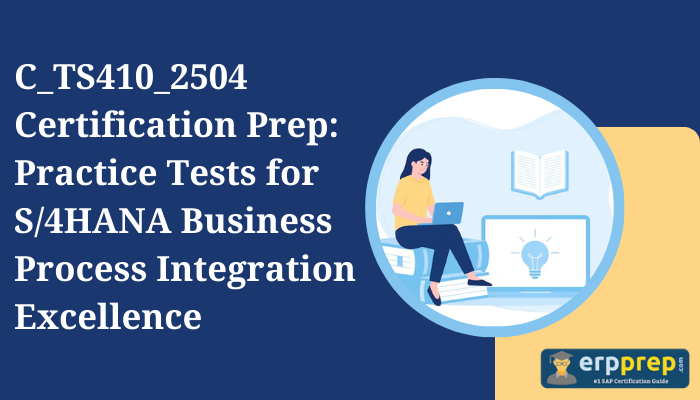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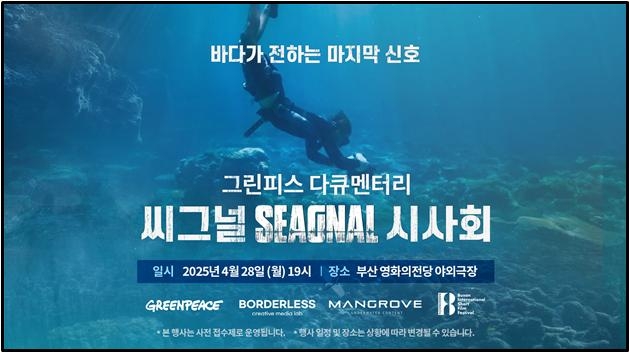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