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자 연구를 왜 하냐고요? 아무도 걷지 않은 길에서 매력과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올해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양자과학과 기술의 해’다. 양자역학을 태동시킨 슈뢰딩거 방정식과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 발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상자 속 고양이’로 상징되는 양자역학은 이제 신약 개발, 암호통신, 금융 최적화 등 기존 과학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양자컴퓨팅 관련 제조기업 SDT에는 이 같은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모인 20대 초·중반 인턴 연구원 다섯 명이 있다. 박선우, 권훈범, 주지원, 길재현, 마크 랜캐스터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양자를 택한 이유로 호기심과 유망성을 꼽았다. 권 연구원은 “학문적 흥미로 시작했다”며 “인턴을 하면서 산업과 학문 양쪽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신약 개발과 초미세 반도체 소자에 적용되는 양자 물질 연구에 주목하고 있다.
양자 기술 선진국에서 온 이들은 한국을 인턴십 무대로 선택한 이유로 산학연 협력이 활발한 연구환경을 꼽았다. 박 연구원은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물리학 학·석사를, 주 연구원은 일본 도쿄대에서 물리공학 학·석사를 거쳤다. 미국 프린스턴대 전기·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랜캐스터 연구원은 연세대 어학당에 다니던 시절 SDT에 연락해 인턴으로 합류했다. 그는 “학계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한국 양자 연구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인턴 연구원들은 전공서적에서 배운 것보다 더 넓은 세계를 봤다고 강조했다. 주 연구원은 “양자 칩이나 정보 계산이 핵심인 줄 알았는데 연산 과정에서 냉각기 같은 하드웨어가 필수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권 연구원도 “학계에서 사소해 보이는 문제도 산업 현장에서는 심각한 변수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주 연구원과 길 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한 양자 인턴십 ‘KQIC’ 프로그램을 통해 SDT에 합류했다. 인턴들의 눈에 비친 산업계 현실은 어떨까. 권 연구원은 “교수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국내 양자기술 박사급 핵심 인력이 6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이를 250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연구계·산업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박사 1000명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양자 연구를 한다고 하면 주위에선 흔히 “정말 가능한 일인가”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들은 도전이 주는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양자컴퓨팅은 고전 알고리즘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학문적으로 아직 빈 공간이 많은 만큼 먼저 나서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랜캐스터 연구원은 “양자컴퓨터가 곧 상용화될 텐데 그 흐름의 초입에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1 month ago
14
1 month ago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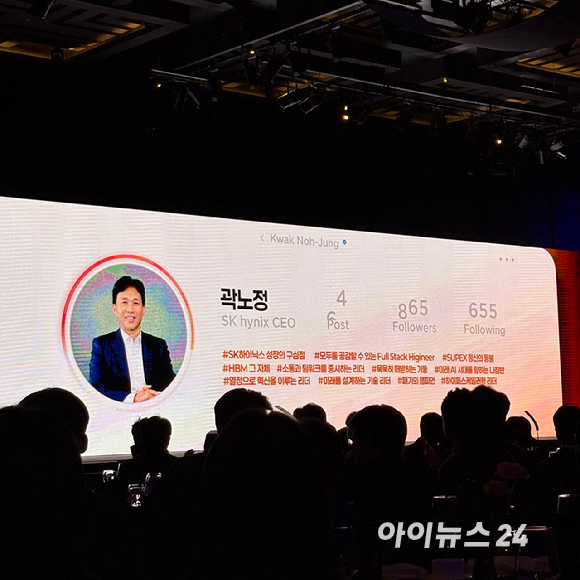



![화장품 소재 발굴부터 생산까지 과학자가 직접 책임진다…’위튼컴퍼니’ [혁신스타트업 in 홍릉]](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5/10/22/ea54ec91c13a4986-thumbnail-960x540-70.jpg)
![[뉴스줌인] 삼성 갤럭시 XR 출시, 애플 비전 프로 넘을까?](https://it.donga.com/media/__sized__/images/2025/10/22/f058c9cc5c174d9e-thumbnail-960x540-70.jpg)
![해킹 사고 반복 시 징벌적 가중 처벌...신고 안 해도 직권 조사 [일문일답]](https://image.inews24.com/v1/80c7ccc1af216f.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