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코스피 5000' 주문이 치러야 할 대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9/07.32531306.1.jpg)
‘기업의 자사주 매입(stock buyback)이 사상 최고치다. 주식회사 미국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 10년 전인 2015년 로이터 기사의 제목이다. 이 헤드라인은 한국 등 철혈 동맹의 뒤통수를 치면서까지 자국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는 미국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다. 초일류 강국 미국은 적어도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시쳇말로 속 빈 강정이자 빈털터리나 다름없었다.
美 자사주 매입 역대 최고치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오랜 고질병이다. 2024년의 공공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8%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중국의 굴기가 겹치면서 글로벌로 흩어져 있는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미 연방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제조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은 한국 등 해외 기업에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이 정책의 약점을 훤히 꿰뚫었다. 자칫하다간 한국·일본·대만 등 고도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에 안방을 속절없이 내준 채 재정적자는 악화하고, 종국엔 달러 가치가 흔들릴 위험성이 컸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직면한 더 큰 문제는 대형 제조기업 대부분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S&P500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지난해 약 9425억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주주환원에 경도된 경영의 폐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인텔이다. 2005~2023년 배당을 포함한 인텔의 누적 환매액은 1290억달러에 달했다. 주주환원에 매달리는 사이 인텔의 전문경영인들은 선제 투자를 통한 기술 선점이라는 반도체산업의 공식을 따라가지 못했다. 인텔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부로부터 긴급 자금을 수혈받기로 했고, 업력이 절반도 안 되는 엔비디아를 구원투수로 불러들였다.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는 ‘린(lean) 매뉴팩처링’으로 불리는 적기공급생산의 ‘오남용’에서 비롯됐다. 린 생산은 본래 도요타가 근원이다. 최소한의 부품과 원자재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원 낭비를 극한으로 줄인 ‘저스트 인 타임’ 전략을 미국의 컨설턴트들은 공급망의 세계화로 진전시켰다. 그들은 창고를 없애고, 자본을 효율화하라고 끊임없이 외쳤다. 이 과정은 창업가에서 전문경영인으로 최고경영자(CEO)의 구성이 바뀌면서 극적인 효과를 냈다. CEO들은 경영 효율화를 통해 만들어 낸 현금을 주주와 그들의 인센티브에 아낌없이 썼다.
'린 경영' 시대의 종말
주식회사 미국의 쇠퇴를 가져온 이 같은 장기 추세를 되돌리려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후에나 어울릴 법한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을 동원해 달성하려는 목표다. 미국이 제조업을 금융과 소프트웨어산업으로 대체하면서 빅테크가 가장 큰 수혜를 봤지만, 그들은 AI 전쟁에 참전하느라 투자 여력이 제한적이다. 메타, 구글, 엔비디아 등은 배당을 거의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배당성향이 대부분 소수점 이하다. 기축통화국이자 세계 최강 미국조차 동맹의 고혈을 짜내서라도 자국 산업을 키우려는 마당에 한국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미래를 위해 악착같이 쌓아둔 곳간을 털어서라도 ‘코스피지수 5000’을 만들라는 주문(呪文)이 허망하게 들리는 이유다.

 1 month ago
15
1 month ago
15
![[IT's 헬스]수면 중 뇌 깨우는 '카페인', 턱 건강도 무너뜨린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10/news-p.v1.20251110.e225b2f1261643cfb6eeebb813e01dff_P1.jpg)
![[부음] 유규상(서울신문 기자)씨 외조모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5분 칼럼] ‘진보 정권의 아이러니’ 재현하지 않으려면](https://www.chosun.com/resizer/v2/XUGS65ZOHFNDDMXKOIH53KEDRI.jpg?auth=f32d2a1822d3b28e1dddabd9e76c224cdbcdc53afec9370a7cf3d9eed0beb417&smart=true&width=1755&height=2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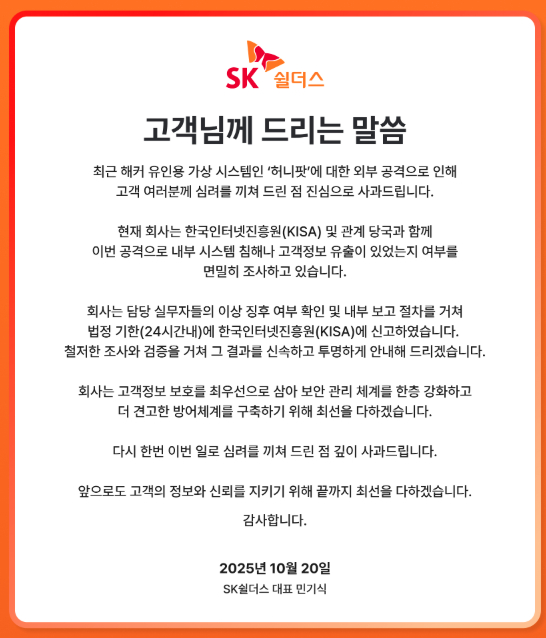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