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정체성의 기준점, 주적
장관끼리도 ‘主敵’ 규정 엇갈려… 한국 정체성 불확실하다는 방증
정체성 부각에 유용한 존재 ‘敵’… 적이 없을 때조차 만들어내기도
‘오랑캐’ 청이 중원의 패권 잡자… 주적으로 상상, 가치 혼란 극복

당시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를 치르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고 대답했다. 이쯤 되면 주적이 누구냐보다 주적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 더 흥미롭다. 대한민국의 주적에 관해서 여야 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정부의 장관들 사이에도 견해가 엇갈린다. 이 주적 논란은 청문회에서 발생한 정쟁이었지만, 원론적으로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논점을 포함하고 있다.
주적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는 복되다. 그러나 그 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 않는다.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는 ‘적을 만들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적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 체계를 측정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그것에 맞서는 장애물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적이 없다면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는 늘 어려운 법, 적의 존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데 유용하다.
한국의 주적에 대해 여야뿐 아니라 장관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다는 것은 현대 한국에 정체성 이슈가 있다는 방증이다. 분단 현실은 지속되고 있지만, 통일의 당위는 약화됐다. 강대국의 위세는 여전하지만, 21세기의 국제 정세는 한층 다극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강대국이 아닌 한국의 정체성은 결코 다루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도 종종 있었다. 중원의 패권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간 17세기 이래의 조선이 그 좋은 예다.줄곧 상국으로 모셔오던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들어서자, 조선의 정체성은 유례없는 위기를 맞게 된다. 줄곧 오랑캐로 멸시하던 상대가 이제 상국이 되었다? 이것은 단지 외교 방침을 바꾸는 전략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그동안 조선을 지탱한 가치관이 와해되는 정신적 대격변의 사태다. 기존 가치관과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청나라와 마주 싸우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병자호란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인조가 삼전도에서 어떤 굴욕을 겪었는지 잘 알고 있다. 약자 조선은 강자 청나라를 받들어 모시지 않을 방법이 없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청나라가 명실상부한 상국인 것이다.
이렇게 받들어 모실 상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조선의 정체성이 바뀌었을까. 조선의 주적이 바뀌었을까. 조선시대에 그려진 ‘무관평생도’라는 그림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한다. ‘평생도(平生圖)’라는 장르화는 태어나서 결혼하고, 과거시험을 거쳐 고관이 되는 조선 엘리트의 이상적 일생을 묘사한다. 대부분의 평생도는 문관 엘리트에 대한 것이지만, 무관 엘리트의 일생을 다룬 무관 평생도도 있다.


물론 그림과 현실은 다르다. 현실 외교의 현장에서는 그 어떤 조선 관료도 대놓고 청나라를 오랑캐 취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명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는 청나라가 아니라 조선이 중화문명의 주인이라고 내심 자부했다. 세월이 지나면서 청나라의 위상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차츰 늘어갔지만, 그런 자부심은 면면히 이어졌다. 다만, 현실 정치를 고려해 청나라를 상대로 그러한 정체성을 표방하지 않았을 뿐. 오랜 세월이 지나 대한제국이 수립될 때 조선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오래전 멸망한 명나라의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3 weeks ago
3
3 weeks ago
3
![[만물상] 미남이란 말 싫어했던 로버트 레드퍼드](https://www.chosun.com/resizer/v2/B7QQUC3MSBB53L66C6LPFZYYBA.png?auth=e01e4b4e0f49a3ced1cbaa6a3c940e7324fc13fe9f04ae65913babdf6422645e&smart=true&width=580&height=323)
![[사이언스온고지신]역대 최대 규모 R&D 예산, 과학기술 생태계의 새로운 도약](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5/news-p.v1.20250915.0c8c257b8a664665adfb11ec74909079_P3.jpg)
![[한경에세이] 축소경제 시대의 성장해법](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윤성민 칼럼] 프랑스병의 주범, 주 35시간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9/07.4164851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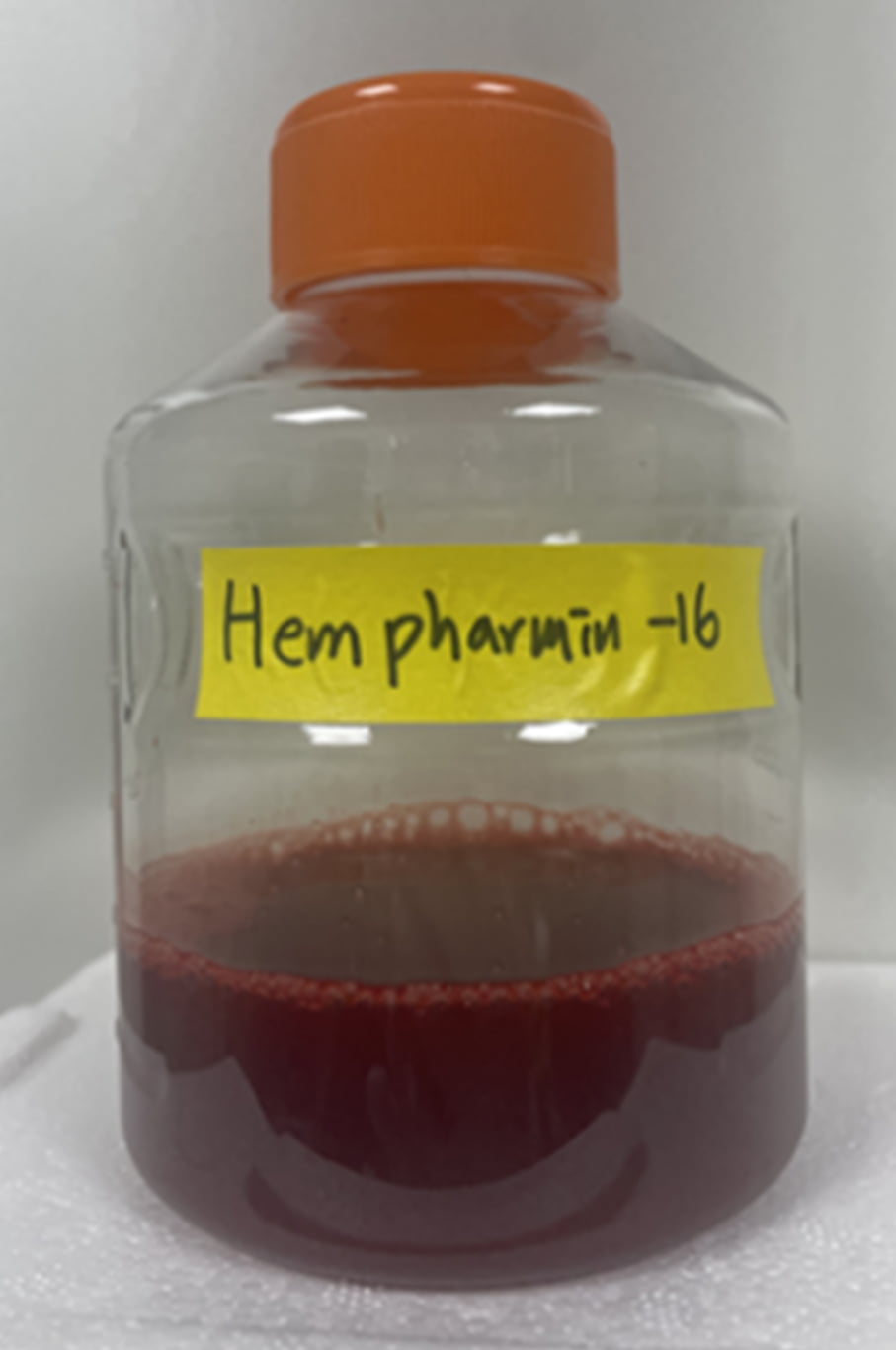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