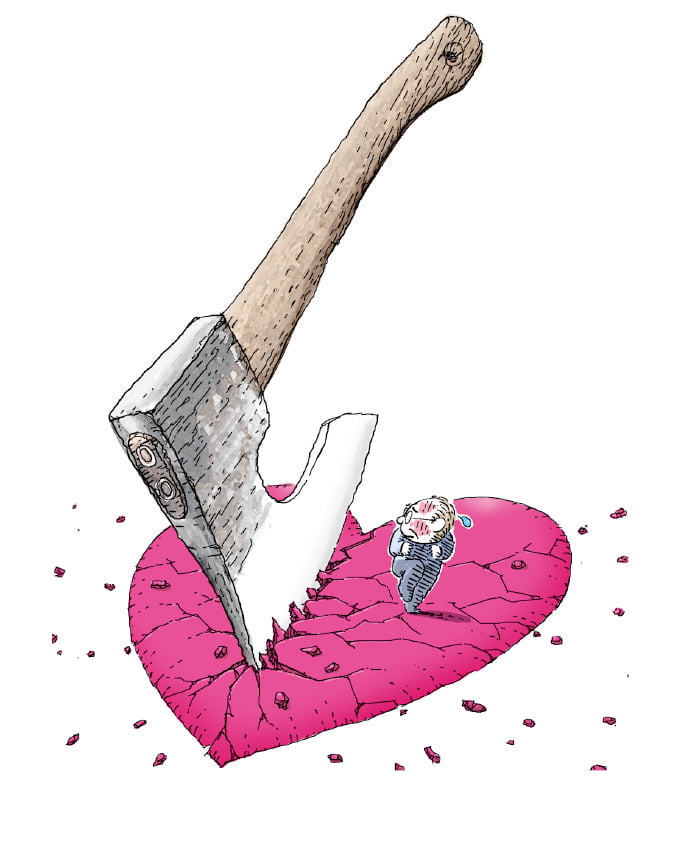
그러니까 우리 문학관이 처음 문을 연 것은 2014년 10월의 일이다. 충남 공주 봉황산 기슭에 있는 적산가옥 한 채를 공주시청에서 사들이고 복원한 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문화원장이었던 내가 나서서 문학관으로 활용해 보겠다고 해서 비공식적으로 개관했다. 그로부터 11년 세월이 지났다. 이제 새롭게 문학관이 지어져 개관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꿈만 같은 일이다.
이것은 도저히 내 힘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두루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성원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공주시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특별한 지원과 실천이 컸다. 나아가 동료 문인들의 관용과 인내가 바닥에 깔렸음을 나는 모르지 않는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다. 어찌 시골 사는 한 작은 시인이 제 이름을 걸고 문학관을 연다는데 거기에 무덤덤한 선배 문인이 있을 것이며 동료 문인이 있겠는가.
"그 집을 대신 사서 도와드리…"
![[나태주의 인생 일기] 문학관 옆집에 얽힌 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9/07.39479997.1.jpg)
어쨌든 여러 가지 감회 속에 문학관이 새롭게 지어지고 내부 시설을 마친 뒤 무사히 개관 행사까지 마쳤다. 나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셈이다. 그런데 새롭게 문학관이 열리기까지 10년이 넘는 동안 나에게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단 일본식 가옥 한 채를 이용하여 문학관을 개관하기는 했으나 문학관이 그냥 가정집 한 채일 뿐이어서 공간이 옹색하고 불편했다. 어쨌든 새로운 공간 확보가 필요했다.
자연스럽게 나의 눈길은 문학관 주변의 집으로 향했다. 주차장 쪽에서 문학관을 바라볼 때 왼쪽에는 슬래브집이 한 채 있고 오른쪽에는 주황색 양철지붕 집이 한 채 있었다. 왼쪽 집은 정원을 사이에 두고 제법 떨어져 있지만 오른쪽 집은 아예 문학관과 담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처지였다. 그 집을 구매해서 문학관의 부속건물로 사용하면 안성맞춤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 그 집은 1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이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는 그만한 돈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했던가 보다. 어느 날 나를 만나러 온 지인 한 사람이 그 말을 들었다. 그 사람은 내가 예전 교직 생활할 때 만난 사람으로 30년 넘게 나와 친교를 맺어 온 여성이었다. 상호 간 신뢰가 있었고 친밀감 또한 두터웠다.
그런 뒤 갑자기 그 여성이 자기 남편을 대동하여 공주로 와서 나를 만나자고 했다. 만난 자리에서 그 여성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자기 아내에게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 집이 문학관에 필요할 것 같아서 자기들이 대신 구매해서 문학관에 도움 되는 쪽으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싶노라는 것이었다. 나는 뛸 듯이 기뻤고 어디서 의인이 나타났다고까지 생각했다. 내가 직접 나서서 구매를 서둘렀고 심지어 복덕방 비용까지 토지 중개업자에게 대신 대주면서까지 도왔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은 그 여성과 남편의 손에 넘어갔다.
그런데 그다음이 문제였다. 일단 집을 수중에 넣은 여성의 남편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우리 문학관을 위해서 도움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은 그 집을 사기 위해 나를 속인 하나의 술책일 뿐이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집을 고치지도 않고 그 어떤 의사 표현을 나에게 하지도 않고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무료하게 몇 년을 보낸 뒤 그 집이 매물로 나왔다. 구매할 때보다 세 배나 높은 가격으로 복덕방에 내놓은 것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그렇게 다시 몇 년 세월이 흐른 뒤, 정말로 그 집이 구매할 때보다 세 배나 높은 가격으로 팔리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여성과 그녀의 남편은 나를 속여 그 집을 사서 몇 년 지니고 있다가 큰돈을 벌고 물러난 셈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였던 것이다. 정말로 나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생각에 아찔했다. 그렇구나. 사람은 돈 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구나. 진실도 우정도 그냥 헌신짝이구나.
하지만 그 일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끝나지는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뒤 나는 문학관 왼쪽의 슬래브집에 눈을 돌렸고 연로한 그 집주인이 단독주택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는 눈치를 알고 공주시청과 합심하여 그 집을 구매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 뒤에는 또 그 집 뒤에 있는 밭을 사들여 새롭게 문학관 지을 부지를 확보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공주시청에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계획서를 제출, 채택된 것이다.
그렇게 하여 건평 300평 규모의 문학관이 새롭게 건축된 것이다. 이야말로 전화위복이 아닌가 싶다. 만약에 문학관 오른쪽 집을 내가 구매했다면 오늘과 같이 아담한 대로 웅장한 문학관 건물이 새롭게 지어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말한다. 인생이란 짧게 보아서는 실패일지라도 길게 보면 성공일 수도 있는 일이라고. 결국 오른쪽 집을 내가 사들이지 않은 것은 잘된 일이고 그 일을 위해 뒤에서 누군가 커다란 손이 조정하기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토록 헛되고 헛된 사람의 마음
이제는 예전 문학관, 일본식 가옥은 새로운 문학관의 부속건물로 사용될 것이고 이름조차 ‘공주풀꽃문학관’에서 ‘시인의 집’으로 바뀌었다. 오며 가며 보면 예전 문학관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양철지붕 집은 그 초록색 대문 앞에 ‘매매’란 쪽지가 붙어 있고 그 아래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다. 새롭게 사들인 집주인이 다시 그 집을 팔겠다는 얘기인 것이다. 문학관에 들르는 사람마다 그 쪽지를 보며 나에게 묻곤 한다. 저 집값이 얼마나 되느냐고. 자기가 사서 살고 싶다고. 아마도 멀리서 와서 보는 사람 눈에는 수풀 속에 싸인 주황색 지붕의 집이 아무래도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가 싶다.
하지만 나는 그 집을 볼 때마다 인간 인연의 부질없음과 사람 마음의 헛됨을 뼈저리게 느끼곤 한다. 저 집을 처음 사들인 그 여성. 짧은 세월도 아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1년에 여름과 겨울, 두 차례씩 성지순례처럼 공주를 찾아오고 또 나를 만나러 오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그 집을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연은 끊어지고 만 것이다. 아니, 새하얗게 탈색되고 만 것이다. 사람의 일이 참 부질없음과 헛됨을 넘어 거짓스럽고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나 또한 그런 가증스러운 존재 가운데 하나임을 부정하지 못한다.

 1 month ago
7
1 month ago
7
![[IT's 헬스]수면 중 뇌 깨우는 '카페인', 턱 건강도 무너뜨린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10/news-p.v1.20251110.e225b2f1261643cfb6eeebb813e01dff_P1.jpg)
![[부음] 유규상(서울신문 기자)씨 외조모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5분 칼럼] ‘진보 정권의 아이러니’ 재현하지 않으려면](https://www.chosun.com/resizer/v2/XUGS65ZOHFNDDMXKOIH53KEDRI.jpg?auth=f32d2a1822d3b28e1dddabd9e76c224cdbcdc53afec9370a7cf3d9eed0beb417&smart=true&width=1755&height=2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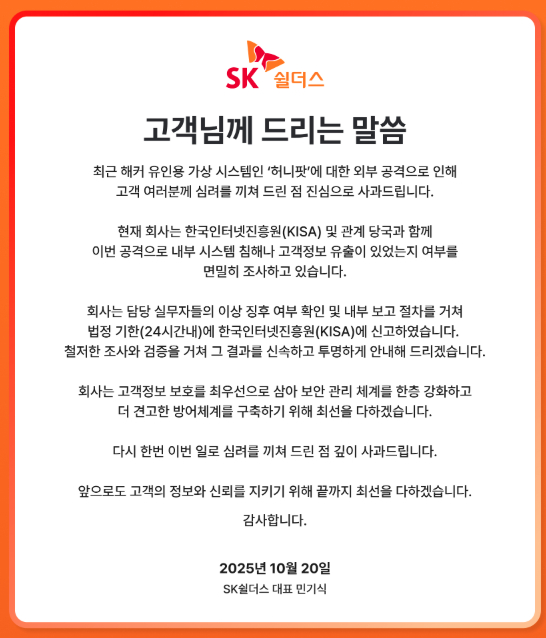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