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행과 연평도 곳곳을 둘러본 뒤 어촌계 사무실을 찾았다. 4월 말인데도 꽃게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다. 예년에는 금어기가 풀리는 4월 1일부터 꽃게 어획으로 섬 구석구석 비린내가 진동하지 않았느냐며 어촌계장에게 물었다. 올해는 저수온으로 금어기가 해제된 지 한 달이 됐는데도 꽃게를 잡지 못하고 있어 어민들이 공황 상태라고 했다.
골목길을 걷다가 알고 지내던 어민을 만났다. 산더미처럼 쌓인 꽃게를 기대하고 왔다며 인사를 건넸더니 푸념을 늘어놨다. 그는 “지난해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이 최근 5년 사이 최저치였다. 꽃게잡이는 4, 5년 주기로 풍어와 흉어를 반복하는데 지난해가 흉어였으니 올해는 많이 잡을 줄 알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연평도에서 사흘을 보내는 동안 꽃게를 한 마리도 보지 못한 채 돌아가는 여객선을 탔다.
인천항에 도착해 경기 파주시로 귀가하는 중 방송작가로부터 꽃게와 참게에 관한 인터뷰 요청 전화를 받았다. 집에 다다랐을 때 인근 음식점에서 크게 써 붙인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점심 메뉴 참게매운탕 할인’이라는 글귀였다. 우연한 사건이 겹치면 필연이라고 했던가. 꽃게잡이 전진기지인 연평도에서 해꽃게를 맛보지 못한 아쉬움을 참게로 풀자는 생각이 스쳤다. 파주는 임진강을 품고 있어서 참게잡이의 중심지가 아니던가.사실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가까운 하천에서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참게를 많이 먹었다. 어해도 등 조선의 회화에 나타나는 게 종류도 꽃게가 아니라 대부분 참게다. ‘참’이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 참게는 게를 대표하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참게의 위상은 작아졌다. 폐디스토마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섭취를 꺼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1924년 5월 2일자 동아일보는 ‘원래 게장은 특별한 풍미가 있는 음식으로 술상과 밥상에 없으면 안 될 진미가 되었으나, 실상은 이 맛있는 음식이 해소와 혈담을 자아내는 토질(폐디스토마)의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또 농약 사용, 하천 오염 등으로 참게 개체 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든 반면 꽃게 어획량은 증가했다.
1960년대까지는 조기 어장과 꽃게 어장이 겹쳤는데 꽃게가 잡히면 물고기에 상처를 내고 그물에 걸린 꽃게를 떼어내기도 어려워서 꽃게를 성가시게 여겼다. 또 꽃게는 상온에서 빠른 속도로 부패하기 때문에 많이 잡더라도 냉동시설이 없으니 유통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1960년대 후반 조기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대체 어종으로 꽃게가 떠올랐고 1970년대에는 외화벌이 수단으로 꽃게가 일본으로 수출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급랭창고가 보급되고 유통이 발달하면서 국내 소비가 늘었다. 내륙의 도시인이 본격적으로 꽃게탕과 꽃게찜 등의 음식을 먹은 건 1970년대 이후라 할 수 있다. 꽃게 음식이 대중화되면서 게를 대표하는 이름은 참게에서 꽃게로 옮겨갔다.
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month ago
12
1 month ago
12
![[세상만사] 어느 공직자의 이임사](https://img0.yna.co.kr/etc/inner/KR/2025/07/11/AKR20250711126800546_01_i_P4.jpg)
![[팔면봉] 관세, 국방비, 전시 작전권, 정상회담 개최… 쏟아지는 韓美 현안.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주가 더 올린다고 선의의 기업들까지 희생양 삼나](https://www.chosun.com/resizer/v2/EIAOQU6MIND7NMWYYAIC3GVJFI.jpg?auth=22b4b80de50de03ec478a39add9039a6265040c8f2f3253015797f83562a33a6&smart=true&width=3034&height=1962)
![[사설] 국민·기업 직격탄 관세 협상은 누가 책임지고 있나](https://www.chosun.com/resizer/v2/OTR4TZP56VAATAUKE5WIH37C4I.jpg?auth=1caee60695374db57fdfecf90f551592a97a1f4d8c055cf179c89135f563904d&smart=true&width=3230&height=2023)
![[사설] 기이한 행태 강선우 후보자, 가족부 장관 맞지 않다](https://www.chosun.com/resizer/v2/D5UZJUAX7XRU2E2AOO5MNK75SY.jpg?auth=5df69625837633ae4549e59029807f2721e600c9b0b38e970731cdf372fd1d6a&smart=true&width=2341&height=1757)
![[박정훈 칼럼] “노벨상 받을 정책”](https://www.chosun.com/resizer/v2/SNU6Z2T7D5FPFOV5RU7SQYCRGQ.png?auth=8706222c40791eea37121382644492ea5bb4f71a3903720bd1b454569f16705b&smart=true&width=1200&height=855)
![[태평로] 등번호 7번 영웅의 유니폼 갈아입기](https://www.chosun.com/resizer/v2/5FJ4T2PFOFEGZNUT2QQMBGQOSU.jpg?auth=6a07451c56c4fd89272f75092d0eea4689c88e892cdd0b4e2c4a7083f539ed98&smart=true&width=500&height=428)
![[데스크에서] 정권 따라 먼저 눕는 금융권](https://www.chosun.com/resizer/v2/CVK3U4ZCRNBU5CDBQIEWCA7L5Q.png?auth=4996f952b11aa0808ba34969c2cfbf3b73f027df2b3cfa42ca9fc56ea95d8848&smart=true&width=500&height=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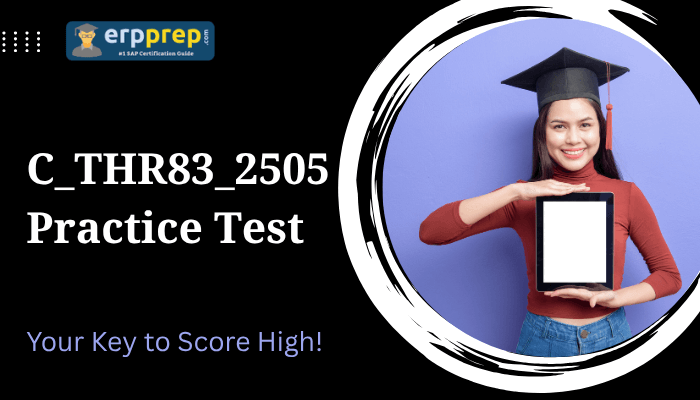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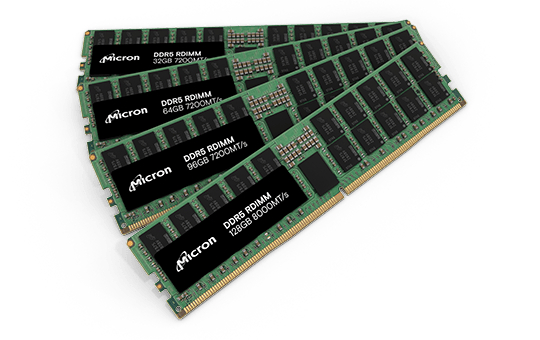



![[朝鮮칼럼] 신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대중국 정책](https://www.chosun.com/resizer/v2/RKK4RNGVFNH35JRLLXTTU2RAP4.png?auth=b176df5e9a825f7cfcf8abb8fe5e68d3b8bee2e5054afd5d9ff84d10209fa8ca&smart=true&width=200&height=267)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