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9/07.40921376.1.jpg)
새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화려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조기 폐지 등 말 그대로 ‘기후위기 대응 중심 국가’로 가는 듯하다. 겉으로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동참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발목 잡을 불안 요소가 적지 않다. 목표는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로드맵이 없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 유럽처럼 이웃 국가와 전력을 주고받는 대륙형 계통이 아니라 철저히 고립된 섬 계통이다.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주변국 전력망이 충격을 흡수해 줬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계통이 흔들리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정전을 외부 지원으로 막을 수 없다. 이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고 석탄을 조기 퇴출하려는 접근은 안정적 전력 공급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충돌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이들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절대적 안정성이 필요하다. 반도체 공장은 순간적인 전압 강하에도 라인이 멈추고, 데이터센터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운영할 수 없다. 산업 전략은 초격차를 외치지만, 에너지 정책은 오히려 전력 불안정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 성장동력을 스스로 제약하는 셈이다.
전기요금 문제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금 당장 올리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실제 의사 결정은 없었으나 요금 인상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는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과 전력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요금 현실화를 미루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민과 산업계 모두에게 더 큰 짐을 남긴다.
간과되는 또 하나의 현실은 집행기관의 피로감이다. 장밋빛 목표는 정치권이 정하지만, 실행은 전력거래소, 한전, 공무원, 발전사가 떠안는다. 계통 안정, 송전망 확충, 유연성 자원 확보는 모두 이들의 몫이다. 그러나 재정도, 제도도 뒷받침되지 않는다. 실패하면 책임은 현장으로 돌아간다. 목표와 실행의 괴리가 반복될수록 현장 인력은 지쳐가고, 정책 신뢰는 약화한다.
에너지는 하루하루의 삶과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실물 기반이다. 비현실적 계획은 반드시 현실의 위기로 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치가 아니다. 한국의 섬 계통 현실,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집행기관의 실행 능력을 냉정히 고려한 정직한 에너지 정책이다. 보여주기식 수사(修辭)는 그만두고, 실행 가능한 길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기후 대응도, 산업 경쟁력도, 에너지 안보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1 month ago
11
1 month ago
11
![[IT's 헬스]수면 중 뇌 깨우는 '카페인', 턱 건강도 무너뜨린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10/news-p.v1.20251110.e225b2f1261643cfb6eeebb813e01dff_P1.jpg)
![[부음] 유규상(서울신문 기자)씨 외조모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5분 칼럼] ‘진보 정권의 아이러니’ 재현하지 않으려면](https://www.chosun.com/resizer/v2/XUGS65ZOHFNDDMXKOIH53KEDRI.jpg?auth=f32d2a1822d3b28e1dddabd9e76c224cdbcdc53afec9370a7cf3d9eed0beb417&smart=true&width=1755&height=2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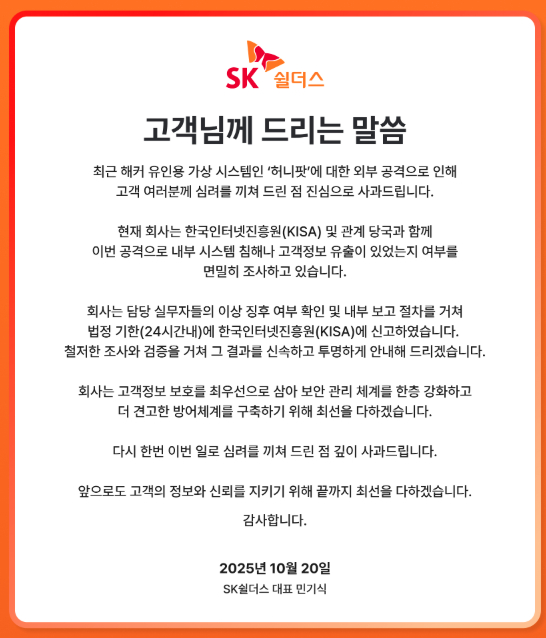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