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날 한국에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앞에서 다시 ‘한일 경제연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처음 한일 경제연합을 제안한 뒤 의원들 사이에서 “회장님 참 용감하시네”라는 말이 나온 지 보름 뒤였다. 언제든 한 끗만 건드리면 위험할 수 있는 양국 간 민족 감정을 두고 나온 반응이었다.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합을 제안하며 “우리도 이제 대외적으로 ‘룰 세터(rule setter·규칙을 만드는 자)’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거세지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한일 양국이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힘을 합쳐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일 경제연합 구상이 왜 경제계에서부터 나오게 됐는지 되짚어 봤다. 양국의 정치·사회적 역사와 별개로, 양국 기업인들 간에는 사뭇 다른 경제·산업의 역사가 흘렀다. 경제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한일 연합의 장점을 피부로 체감해 왔다.우선 양국의 협력은 강대국 앞에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 미국이 반도체 자국화에 나서던 2021년, 낸드플래시 3위 미국 웨스턴디지털이 2위 일본 키옥시아를 인수해 시장을 재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일본은 자국 메모리의 마지막 보루인 키옥시아를 지켜야 했고, 각각 1, 4위였던 삼성과 SK도 미국의 공습을 막아야 했다. 당시 한국 기업인들이 물밑에서 키옥시아 및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한 끝에 결국 인수전은 불발됐다.
전자와 반도체, 자동차와 배터리 등 한일 양국이 핵심 공급망을 가진 사업에서 동맹을 이룰 수도 있다. 2000년대 초반 삼성과 소니의 액정표시장치(LCD) 협력은 10여 년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을 한일 양국의 판으로 이끌었다. 삼성은 LCD 패널을 만들고, 소니는 이를 기반으로 TV를 만들어 과도한 초기 투자 비용 없이 함께 글로벌 시장을 뚫고 나갈 수 있었다.
물론 기업인들이 바라는 장밋빛 시나리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분명 동유럽과 중남미 국가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 불균형과 일방향의 브레인 유출 문제도 일으켰다. 한일 연합에도 산업 보호 리스크와 임금 격차에 따른 노동력 유출 등 우려가 공존한다. 오랜 시간 물과 기름 같았던 한일 관계가 경제계에서부터 물꼬가 트인다면 새로운 활로가 될 가능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선 경제블록의 성공 여부는 결국 경제로 시작한 연대가 그 이후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정치, 사회적으로 얼마나 화학적 결합을 이어가는가에 달려 있다. “이대로 가면 살아남기 어렵다”며 재계에서 용감한 제안을 꺼냈다면, 이를 풀어갈 국민과 정치의 숙제가 남았다. 한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의 엉킨 실타래를 하나둘씩 풀어가야 할 시간이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month ago
12
1 month ago
12


![[세상만사] 어느 공직자의 이임사](https://img0.yna.co.kr/etc/inner/KR/2025/07/11/AKR20250711126800546_01_i_P4.jpg)
![[팔면봉] 관세, 국방비, 전시 작전권, 정상회담 개최… 쏟아지는 韓美 현안.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주가 더 올린다고 선의의 기업들까지 희생양 삼나](https://www.chosun.com/resizer/v2/EIAOQU6MIND7NMWYYAIC3GVJFI.jpg?auth=22b4b80de50de03ec478a39add9039a6265040c8f2f3253015797f83562a33a6&smart=true&width=3034&height=1962)
![[사설] 국민·기업 직격탄 관세 협상은 누가 책임지고 있나](https://www.chosun.com/resizer/v2/OTR4TZP56VAATAUKE5WIH37C4I.jpg?auth=1caee60695374db57fdfecf90f551592a97a1f4d8c055cf179c89135f563904d&smart=true&width=3230&height=2023)
![[사설] 기이한 행태 강선우 후보자, 가족부 장관 맞지 않다](https://www.chosun.com/resizer/v2/D5UZJUAX7XRU2E2AOO5MNK75SY.jpg?auth=5df69625837633ae4549e59029807f2721e600c9b0b38e970731cdf372fd1d6a&smart=true&width=2341&height=1757)
![[박정훈 칼럼] “노벨상 받을 정책”](https://www.chosun.com/resizer/v2/SNU6Z2T7D5FPFOV5RU7SQYCRGQ.png?auth=8706222c40791eea37121382644492ea5bb4f71a3903720bd1b454569f16705b&smart=true&width=1200&height=855)
![[태평로] 등번호 7번 영웅의 유니폼 갈아입기](https://www.chosun.com/resizer/v2/5FJ4T2PFOFEGZNUT2QQMBGQOSU.jpg?auth=6a07451c56c4fd89272f75092d0eea4689c88e892cdd0b4e2c4a7083f539ed98&smart=true&width=500&height=428)
![[데스크에서] 정권 따라 먼저 눕는 금융권](https://www.chosun.com/resizer/v2/CVK3U4ZCRNBU5CDBQIEWCA7L5Q.png?auth=4996f952b11aa0808ba34969c2cfbf3b73f027df2b3cfa42ca9fc56ea95d8848&smart=true&width=500&height=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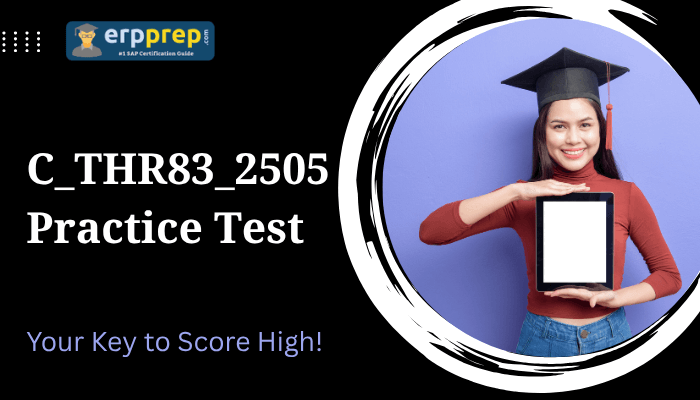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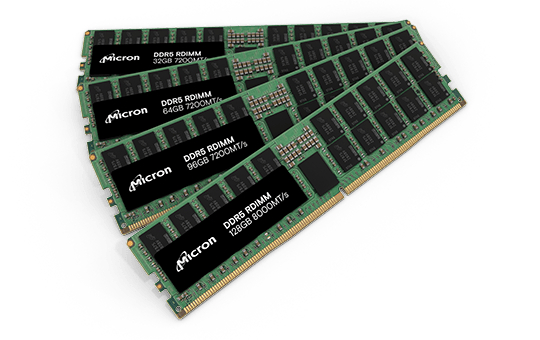



![[朝鮮칼럼] 신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대중국 정책](https://www.chosun.com/resizer/v2/RKK4RNGVFNH35JRLLXTTU2RAP4.png?auth=b176df5e9a825f7cfcf8abb8fe5e68d3b8bee2e5054afd5d9ff84d10209fa8ca&smart=true&width=200&height=267)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