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성룡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상임이사(CFP)
함성룡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상임이사(CFP)“요즘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 말은 단순한 세대 차이의 표현이 아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영상을 보고,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해석에 도달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술은 우리를 '연결'시켰지만, 그 연결은 생각보다 얕고, 오히려 더 깊은 '단절'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연결이라는 착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뉴스를 접하고, 친구의 일상을 지켜보며, 낯선 이의 생각까지 '좋아요' 버튼 하나로 반응한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대화가 오가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연결돼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정말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가?”
알고리즘은 '공감'보다 '반복'을 제공하고 있고, 기술은 사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가 클릭한 것, 멈춰 읽은 문장, 반복해서 본 영상. 그 모든 데이터가 축적되어, 나만을 위한 정보가 다시 제공된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세상만을 본다. 처음엔 편리함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진실의 파편화'가 일상화되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정반대의 해석이 존재하고, 서로를 향한 분노는 더 빠르고 강하게 확산된다. 정보의 다양성이 사라진 자리에, '맞는 말만 해주는 공간'이 생겼고, '다른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의 공간은 공유되지만, 맥락은 분리되고 있다. SNS에서 우리는 같은 밈(meme)을 소비하고, 같은 트렌드를 따라간다. 그러나 그 안에서 누구는 농담을 하고, 누구는 분노하며, 누구는 조롱하고, 누구는 상처 입는다. 공간은 하나지만, 맥락은 각자 다르다. 말이 오가지만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댓글은 달리지만 이해는 멀어져 간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을 강화시키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이야기보다 익숙한 이야기'를 택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술은 우리를 더 안전한 세계, 더 단순한 생각, 더 익숙한 편향 속에 가두어 놓게 된다. 결국 기술을 통한 연결은 점점 고립을 닮아가고, 그 고립은 사회의 갈등을 더 깊이 파고들고,'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기술은 본래 인간의 생존을 위해 발전했고, 기술을 이용해 무리 사회를 대형 국가 단위의 공동체로 확장시켰다. 이렇게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야만 살아남는 존재'로 진화해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기술은 다시 우리 사회를 '작은 무리'로 되돌려놓고 있다.
현실이든 확장현실이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듯하지만 실은 각자의 진실, 각자의 기준, 각자의 감정 속에 고립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이 연결된 이 시대에, 가장 깊은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
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그리고 이 연결은 진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가?
앞으로의 스타트업, 공동체, 그리고 무리들은 이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만들어야만 한다.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시대, 갈등이 파편화된 사회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설계하는 능력이야말로 생존과 성장의 기준이 될 것이다. 단순한 연결을 넘어서, 새로운 합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곳. 그곳만이 살아남고, 다음 시대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함성룡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상임이사(CFP)

 1 day ago
2
1 day ago
2
![[세상만사] 어느 공직자의 이임사](https://img0.yna.co.kr/etc/inner/KR/2025/07/11/AKR20250711126800546_01_i_P4.jpg)
![[팔면봉] 관세, 국방비, 전시 작전권, 정상회담 개최… 쏟아지는 韓美 현안.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주가 더 올린다고 선의의 기업들까지 희생양 삼나](https://www.chosun.com/resizer/v2/EIAOQU6MIND7NMWYYAIC3GVJFI.jpg?auth=22b4b80de50de03ec478a39add9039a6265040c8f2f3253015797f83562a33a6&smart=true&width=3034&height=1962)
![[사설] 국민·기업 직격탄 관세 협상은 누가 책임지고 있나](https://www.chosun.com/resizer/v2/OTR4TZP56VAATAUKE5WIH37C4I.jpg?auth=1caee60695374db57fdfecf90f551592a97a1f4d8c055cf179c89135f563904d&smart=true&width=3230&height=2023)
![[사설] 기이한 행태 강선우 후보자, 가족부 장관 맞지 않다](https://www.chosun.com/resizer/v2/D5UZJUAX7XRU2E2AOO5MNK75SY.jpg?auth=5df69625837633ae4549e59029807f2721e600c9b0b38e970731cdf372fd1d6a&smart=true&width=2341&height=1757)
![[박정훈 칼럼] “노벨상 받을 정책”](https://www.chosun.com/resizer/v2/SNU6Z2T7D5FPFOV5RU7SQYCRGQ.png?auth=8706222c40791eea37121382644492ea5bb4f71a3903720bd1b454569f16705b&smart=true&width=1200&height=855)
![[태평로] 등번호 7번 영웅의 유니폼 갈아입기](https://www.chosun.com/resizer/v2/5FJ4T2PFOFEGZNUT2QQMBGQOSU.jpg?auth=6a07451c56c4fd89272f75092d0eea4689c88e892cdd0b4e2c4a7083f539ed98&smart=true&width=500&height=428)
![[데스크에서] 정권 따라 먼저 눕는 금융권](https://www.chosun.com/resizer/v2/CVK3U4ZCRNBU5CDBQIEWCA7L5Q.png?auth=4996f952b11aa0808ba34969c2cfbf3b73f027df2b3cfa42ca9fc56ea95d8848&smart=true&width=500&height=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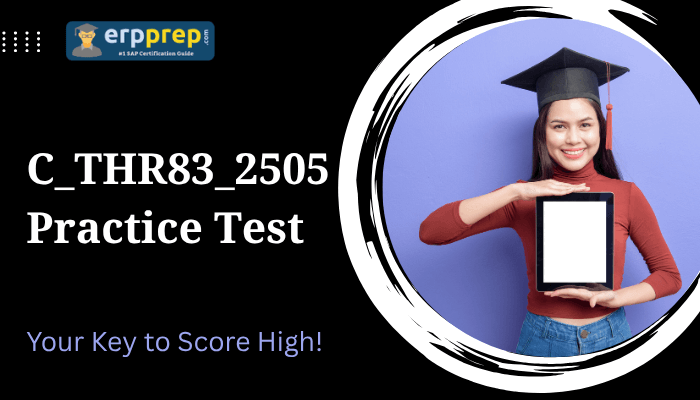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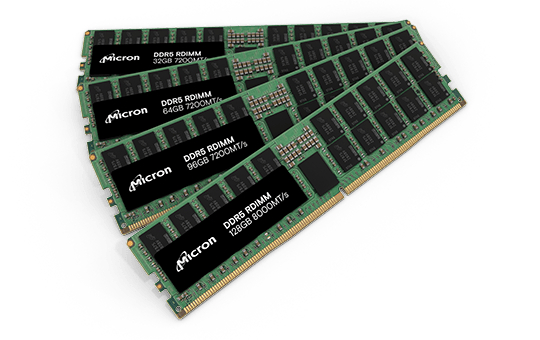



![[朝鮮칼럼] 신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대중국 정책](https://www.chosun.com/resizer/v2/RKK4RNGVFNH35JRLLXTTU2RAP4.png?auth=b176df5e9a825f7cfcf8abb8fe5e68d3b8bee2e5054afd5d9ff84d10209fa8ca&smart=true&width=200&height=267)
![[에스프레소] 피터 틸이 묻는다 “AI 강국, 말로만 외칠 건가”](https://www.chosun.com/resizer/v2/N5NWTT7NHJBCFHEEP5IQLW7DKU.png?auth=0e06d154dcf135b7a87bd56824433b79d36da0c6b19e5fa7db13ee646301dc8f&smart=true&width=500&height=500)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