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단은 옛날 남별영(南別營) 자리로 이태왕(고종) 32년 을미 8월 20일 민비피시사변(閔妃被弑事變) 때에 절사한 궁내 대신 이경직(李耕稙)과 연대장 홍계훈(洪啓薰)을 사(祀)하기 위하여 설한 것이니 (중략) 근래에는 공원을 설치하여 운동장 기타 설비가 경성 여러 공원 중 비교적 완비하고 사위의 송림이 울밀할 뿐 아니라 봄에는 개나리, 앵화(櫻花·벚꽃)가 성개(盛開)하고 또 버들이 좋기로 유명하며 그 안쪽에는 약수가 있고 전차, 뻐스가 공원 내까지 직통하는 까닭에 사시 산보의 객이 많다.” (‘경성이 가진 명소와 고적’, 별건곤 1929년 9월호)》


황제의 지시는 신속하게 이행됐다. 같은 해 10월 남산의 동쪽 자락, 한양도성의 동남부 끄트머리인 남소영(南小營·조선시대 어영청 휘하의 소군영) 터에 ‘장충단(奬忠壇)’이 조성됐다. 사당인 장충포열사(奬忠褒烈祠), 제사의 내력을 적은 장충단비 등 여러 시설이 들어섰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당에 모신 신위 제1위가 홍계훈, 제2위가 이경직이었던 점이다. 두 사람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 당시 경복궁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무관들이다. 이 둘을 부각함으로써 장충단은 간접적으로 명성황후의 죽음를 기억하는 장소가 된 것이다.
장충단에서는 매년 봄가을 정기적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초혼제를 지냈다. 1909년까지 총 19차례 제사를 지낸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1909년 11월 4일 장충단에서는 의미가 완전히 역전된 행사가 열렸다.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추모식을 개최한 것이다. 일제의 논리에 따르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황실의 충신’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역설적인 행사의 개최는 국망이 목전에 다가온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병합 이후 한동안 방치되었던 장충단은 1919년 정식으로 ‘장충단공원’으로 지정됐다. 본격적인 공원 시설을 갖추는 데는 1, 2년 정도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 공원은 원래 장충단 시대부터 시민이 많이 사용하던 터이며 경성부에서도 시민의 원하는 공원으로 처소가 가장 적당하다 하야 일찍이 이에 착수하야 얼마간 공원의 설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예산 문제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예정의 계획을 실행치 못하고 있던 바 금년부터 비로소 이 공원에 대한 설비를 확장하게 되어 이른 봄부터 새길을 내고 다리를 놓으며 꽃나무를 심어 모든 설비는 거의 완성했다.”(동아일보 1921년 4월 28일) 장충포열사 등 원래 있던 건물을 공원 사무실로 개조하는 한편 남산과 연결되는 산책로를 조성했다. 산에서 경내로 흐르는 소하천을 막아 연못을 만들고 물 위에 목교를 놓았다. 등나무 그늘과 벤치도 시설했다. 공원의 경관이 완성되자 장충단공원은 각종 행사의 개최 장소로 인기가 높았다. 자전거 경기 대회, 씨름 대회, 야외 영화 상영, 오페라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열리기도 하고 학교 연합 운동회도 열렸다. 심지어 5월 1일 노동절 집회를 이곳에서 개최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우리 조선에서는 1923년부터 이 날을 기념하기 시작하여 그해에는 우선 경성에 있는 인쇄직공을 위시한 다수의 노동자가 업을 휴하고 장충단공원에 회합하야 노동시간 단축, 임금 증상(增上), 실업 방지의 3종 결의를 행하고 시위 회합을 행함과 같은 경황을 보였다.”(메이데이와 어린이날, 개벽 1926년 5월호)
1930년대 장충단공원 권역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토 히로부미 사망 20주기(1929년)를 맞아 계획한 박문사(博文寺)라는 추모 사찰을 건립한 것이다. 사찰 건립은 총독부의 2인자인 정무총감이 회장을 맡은 ‘이등공추모사업회’가 주도했다. 위치를 두고 여러 견해가 있었지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점과 교통 편의성, 남산 자락 반대편에 위치한 조선신궁과 마주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장충단공원의 부지 일부를 할애하기로 결정했다.

박문사는 일제가 주관하는 다양한 추모 행사의 장소가 됐다. 대표적으로 1939년에는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이완용, 이용구, 송병준, 김옥균 등을 기념하는 ‘조선합병 공로자 합동 추모제’가 열렸다. 또 일본에서 고위 인사가 오면 반드시 들러서 참배를 했다. 고위층뿐 아니라 일본 학생들의 조선 수학여행 코스에도 꼭 포함됐다. 근대 일본의 최고 위인 중 한 사람인 이토 히로부미를 기념하면서 본당, 흥화문, 석고전 등 일본식과 조선식의 수준 높은 건축물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내선융화’의 교육장이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제강점기 장충단공원은 경성 시민의 유력한 휴식처이면서 제국주의의 기념물이기도 했다. 때로는 정반대 의미인 사회운동의 현장이 되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혼종의 공간’이었다.
염복규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week ago
4
1 week ago
4
![[사이언스온고지신]역대 최대 규모 R&D 예산, 과학기술 생태계의 새로운 도약](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5/news-p.v1.20250915.0c8c257b8a664665adfb11ec74909079_P3.jpg)
![[한경에세이] 축소경제 시대의 성장해법](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윤성민 칼럼] 프랑스병의 주범, 주 35시간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9/07.4164851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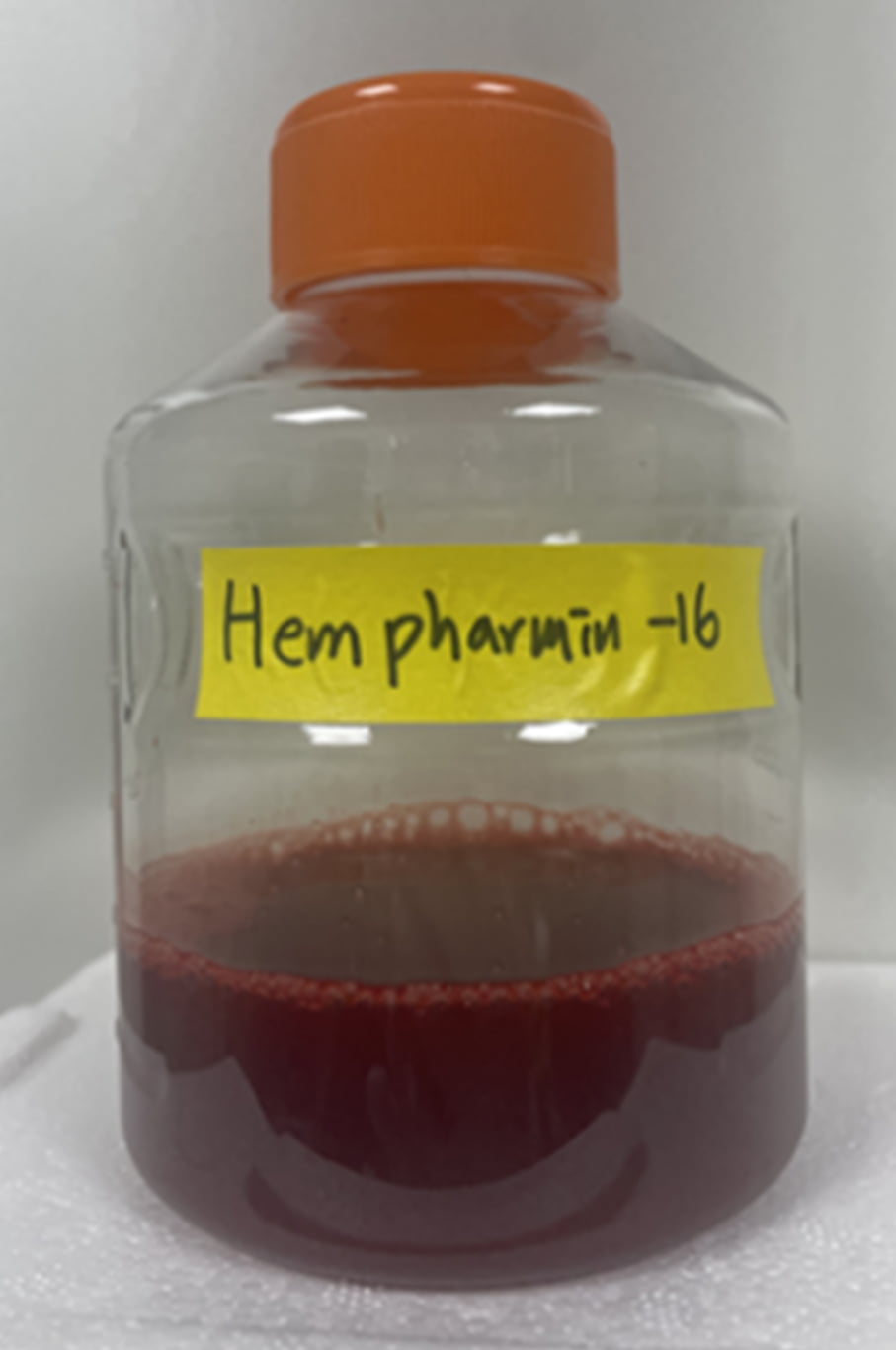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