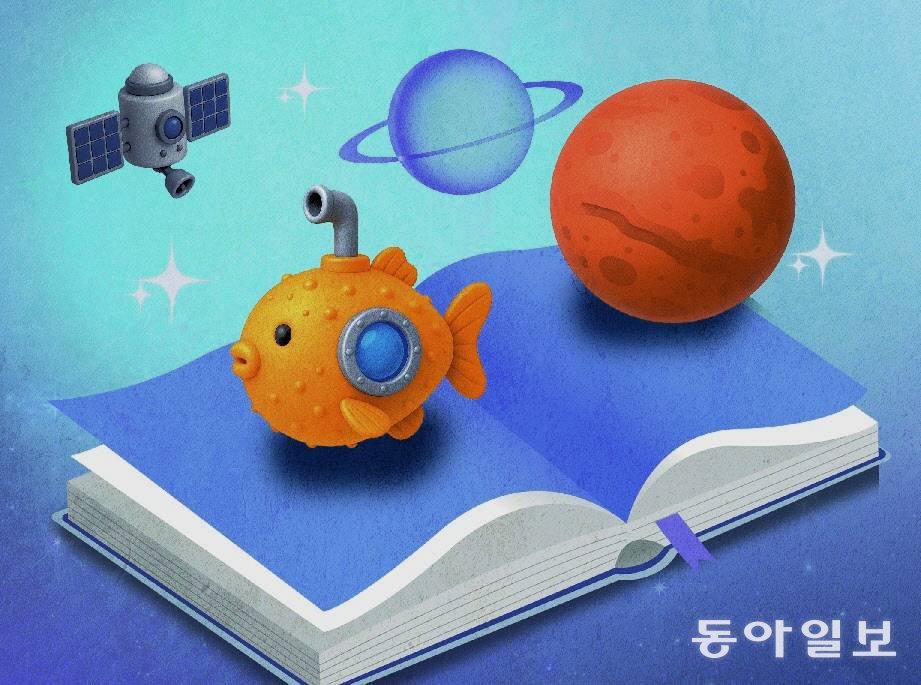

내 글은 비선형적인 시간을 탐구하는 탐정소설이었는데, 이 작품 속에서 복어의 독이 살인 무기로 사용됐다. 김아영 작가는 서양의 공상과학 소설 시리즈와 한국 드라마의 멜로드라마적 분위기를 혼합한 영상을 만들어냈다. 남미 TV 드라마 ‘텔레노벨라’와 비슷한 분위기의 작품이었다. 이 영상에서 김아영 작가는 이민자 출신의 과학자를 통해 국경과 기후변화를 다뤘다. 그런데 나의 눈길을 끈 것이 있었다. 주인공이 바닷속을 이동할 때 타는 미니 잠수함이 내 소설에 등장하는 복어 모양을 하고 있었다. 죽음의 도구가 과학탐사선으로 변신한 것이다.
한편 김초엽 작가가 쓴 공상과학 단편집의 스페인어 번역 감수를 맡으며 그의 글을 주의 깊게 읽었다. 한국 문학에서 ‘가족’은 주요 주제인데, 김초엽 작가는 이를 공상과학 장르의 전통적인 요소인 우주여행, 외계 문명과의 만남, 기술 발전과 결합해 섬세하게 풀어냈다. 이 소설 덕분에 공상과학 장르를 새롭게 보게 됐다. 김아영 작가의 작품에서 받은 느낌과 비슷했다. 여전히 내가 왜 이 장르를 멀게 느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그러던 중 내 에이전트가 아르헨티나의 젊은 작가 미첼 니에바의 에세이를 선물했다. 제목은 ‘자본주의 공상과학(Ciencia Ficcin Capitalista)’으로, 부제는 ‘억만장자들이 세상의 종말에서 우리를 구하는 방법’이다.니에바는 이 작은 책에서 하드 SF 장르와 자본의 관계를 설명한다. 쥘 베른과 같은 거장으로부터 탄생한 공상과학은 당시 군사공학을 응용한 산업에 영감을 준 원천이었다. 베른도 자신이 종이에 쓰는 내용을 누군가가 강철로 조각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 이 말은 곧 사실이 됐다. 베른의 가장 유명한 소설에 등장하는 잠수함 ‘노틸러스함’은 미국 육군의 의뢰로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영감을 줬다.
1950년대 이후, 공상과학 소설가들과 자본의 관계는 더욱 노골적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아서 C 클라크가 대표적이다. 작가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한 클라크는 통신 개발을 위해 인공위성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휴스항공 및 미 항공우주국(NASA)이 주도하는 위성 개발에 참여했다. 냉전 종식과 소련 붕괴 이후, 이러한 상상력은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국가 간 우주 경쟁에서는 분리돼 민간기업으로 넘어갔다. 오늘날에는 테슬라 및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에까지 이르렀다.
니에바는 자본주의와 문학, 그리고 기술의 관계를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를 제시했다. 1992년 발표된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는 메타버스, 암호화폐, 구글 어스, 배달용 모바일 앱 등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아이디어들이 등장한다. 니에바는 최근 몇 년간 대형 기술기업을 소유한 억만장자들이 세상의 재난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건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그 재난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금융 투기와 손잡은 상상력, 그 미래의 비전이 바로 하드 SF 대작들에서 비롯된다. 우주 관광, 화성의 식민지화, 세포의 퇴화를 막는 약물로 죽음을 극복하는 등의 이야기이다. 이 기업가들이 명확하게 하지 않는 부분은, 이 미래는 오직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라는 점이다. 이 관계를 설명한 니에바의 글을 읽으며, 나는 비로소 서양 공상과학 소설의 대작으로 꼽히는 일부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거부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이면에는 지난 세기들처럼 정복과 식민지화의 영웅 서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 주인공들은 기술을 신봉하며, 대개 유럽과 미주의 백인 남성이나 다른 인종에서 백인화된 이들의 후예들이다.다행히, 김아영과 김초엽 작가의 작품은 공상과학을 이끌어온 이전 세대 하드 SF의 전형(archetype)을 전복한다. 그리고 이 두 예술가가 한 세기 만에 식민지 시대의 상흔을 극복하고 전쟁과 절대적 빈곤을 지나 기술 강국으로 변모한 한국 출신이라는 점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안드레스 솔라노 콜롬비아 출신·소설가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month ago
11
1 month ago
11
![[부음] 이주현(전 파주시청 복지정책국장)씨 부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세상만사] 어느 공직자의 이임사](https://img0.yna.co.kr/etc/inner/KR/2025/07/11/AKR20250711126800546_01_i_P4.jpg)
![[팔면봉] 관세, 국방비, 전시 작전권, 정상회담 개최… 쏟아지는 韓美 현안.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주가 더 올린다고 선의의 기업들까지 희생양 삼나](https://www.chosun.com/resizer/v2/EIAOQU6MIND7NMWYYAIC3GVJFI.jpg?auth=22b4b80de50de03ec478a39add9039a6265040c8f2f3253015797f83562a33a6&smart=true&width=3034&height=1962)
![[사설] 국민·기업 직격탄 관세 협상은 누가 책임지고 있나](https://www.chosun.com/resizer/v2/OTR4TZP56VAATAUKE5WIH37C4I.jpg?auth=1caee60695374db57fdfecf90f551592a97a1f4d8c055cf179c89135f563904d&smart=true&width=3230&height=2023)
![[사설] 기이한 행태 강선우 후보자, 가족부 장관 맞지 않다](https://www.chosun.com/resizer/v2/D5UZJUAX7XRU2E2AOO5MNK75SY.jpg?auth=5df69625837633ae4549e59029807f2721e600c9b0b38e970731cdf372fd1d6a&smart=true&width=2341&height=1757)
![[박정훈 칼럼] “노벨상 받을 정책”](https://www.chosun.com/resizer/v2/SNU6Z2T7D5FPFOV5RU7SQYCRGQ.png?auth=8706222c40791eea37121382644492ea5bb4f71a3903720bd1b454569f16705b&smart=true&width=1200&height=855)







![[에스프레소] 피터 틸이 묻는다 “AI 강국, 말로만 외칠 건가”](https://www.chosun.com/resizer/v2/N5NWTT7NHJBCFHEEP5IQLW7DKU.png?auth=0e06d154dcf135b7a87bd56824433b79d36da0c6b19e5fa7db13ee646301dc8f&smart=true&width=500&height=500)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