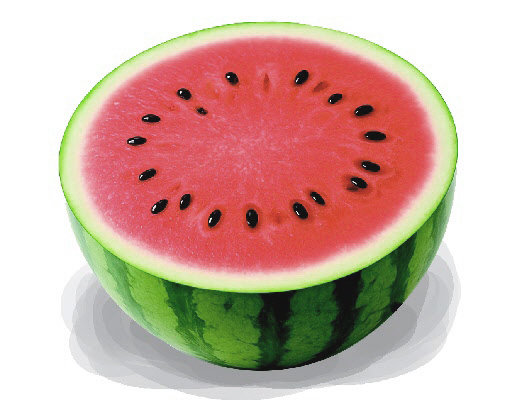

수박 맛을 좀 더 잘 느껴보기 위해 큼지막한 수박을 사다 먹은 뒤 그 속에 든 씨앗을 심어 본 이들이 있을 것이다. 텃밭이 아니더라도 웬만큼 큰 화분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도하기도 한다. 직접 길러서 먹는 것만큼 맛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서다. 이들의 눈앞엔 이미 어른 머리만 한 수박이 주렁주렁 열리는 흐뭇한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일은 현실이 되기 쉽지 않다. 잘 자라지도 않을뿐더러 수박이 열린다고 해도 그 씨앗이 들어 있던 수박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을 것이다. 천재 부모가 반드시 천재 자식을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같은 원리일까? 더 큰 요인이 있다. 우리가 사 먹는 큼지막한 수박은 호박 씨앗에서 자란 줄기에 수박을 접붙인 것이다. 수박보다 더 큰 열매를 맺느라 뿌리를 뻗는 능력이 왕성한 호박의 힘을 빌린다.
연구에 따르면 수박의 원산지는 북아프리카 수단과 나일강 근처다. 수박은 1500만 년 전쯤 염색체 중복으로 출현했다. 보통 씨앗을 만드는 수정 과정에서는 부모 양쪽의 염색체가 절반씩 공평하게 섞이는데, 웬일인지 염색체 한 세트가 더 섞였던 것이다. 바나나도 이런 식으로 염색체 한 세트가 통째로 중복되면서 생긴 것인데 식물계에서는 가끔 일어나는 변이다.지금은 수박 속살을 떠올리면 누구나 빨간색을 생각하지만, 6000년 전만 해도 수박은 속이 빨갛지도, 달콤하지도 않았다. 북아프리카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씨앗에서 열린 수박은 속이 박이나 호박처럼 하얗거나 샛노랬고, 쓴맛이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수박들은 속이 하얗다.
수전 레너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 연구팀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먹는 수박은 4400년 전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품종 개량을 한 결과다. 작물화 과정을 통해 쓴맛을 내는 물질인 ‘큐커비타신’을 만드는 유전자를 잠재우고 단맛을 내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붉은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같이 깨어나 빨갛고 달콤한 수박이 됐다. 같이 활성화되기에 속이 빨갈수록 맛있어진다.
수박이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고려시대다. 모래가 많은 사막 지역이 원산지이다 보니 적응이 쉽지 않았다. 조선 초기만 해도 수박은 엄청나게 귀한 식품이었다. 세종이 수박을 훔쳐 먹은 내시에게 곤장 100대를 치게 하고 귀양을 보냈을 정도다. 곤장 100대면 초주검을 만드는 엄한 벌이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2억 t 이상 수박이 생산된다. 특히 호랑이 무늬에 당도가 높고 과육이 아삭한 한국 수박은 인기가 높다. 여름엔 빨갛고 맛있는 수박이 최고다.서광원 인간자연생명력연구소장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day ago
2
1 day ago
2


![[광화문에서/이유종]‘폭염의 일상화’ 생존 위협… 함께 살아가는 법 배워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7/10/131980341.1.png)
![[고양이 눈]“무슨 잘못을 한 거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7/30/132101220.5.jpg)
![2초 찰나를 위한 열정[이은화의 미술시간]〈381〉](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7/30/132101233.5.jpg)
![비 많이 오면 경제에 좋다?… ‘비 오는 날’ 늘면 선진국은 성장 둔화[박재혁의 데이터로 보는 세상]](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7/30/132102893.1.png)
![1935년 8월 1일… 여성 의병장 윤희순 숨지다[이문영의 다시 보는 그날]](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7/30/132101215.5.jpg)
![인사 실패 막으려면 ‘後검증’ ‘세평검증’ 개혁해야[기고/김호균]](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7/30/132102891.1.jpg)
![美 국무장관도 당했다… ‘영화 속 장면’ 같은 딥페이크 사칭[이창수의 영어&뉴스 따라잡기]](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7/30/132101195.5.jpg)
![[만물상] 유명해져서 죄송합니다](https://www.chosun.com/resizer/v2/RQVNSCEEERBXZMNXUTDYIUVRTQ.png?auth=1b5bd98f677ce493a9cddaf9589876e01d0de83f860c44bcc3c9c81bdb1c065a&smart=true&width=580&height=323)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