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재석 선임기자 =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테네에서는 시민 가운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참정권을 줬다. 근대 들어서 참정권이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는 여성과 흑인 등 다양한 계층의 피와 땀이 있었다. 여성 참정권이 처음 보장됐던 때는 1893년이다. 시민 혁명을 거친 유럽 국가도 미국도 아닌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줬다. 이후 여성 참정권은 여러 나라로 확대됐지만 스위스 여성은 1971년에서야 참정권을 얻었을 수 있었다.
이미지 확대

홍성=연합뉴스) 25일 충남 천안 시외버스터미널과 도솔공원 일대에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비행선을 이용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5.5.25.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에서 흑인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은 불과 60년 전이다. 1870년 미국 수정헌법에서 백인과 흑인 구분 없이 모든 남성에게 참정권을 줬으나 남부지역 등에서는 흑인이 투표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제도적 제약이 있었다. 이후 수많은 민권 운동가들이 주도한 저항과 투쟁이 있었고 1965년 앨라배마주 셀마에서 참정권을 요구하는 흑인들을 강경진압한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행진이 벌어졌고 이를 계기로 흑인 참정권 요구가 미전역으로 확산했다. 결국 그해 투표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한 '투표권법'이 제정됐다.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부터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했다. 그래서 당연히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딛고 일궈낸 소중한 기본 인권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마땅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발달장애인들이 서울 시내 투표소를 찾았으나 높은 문턱에 좌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투표 보조인 동행을 거절당한 한 발달장애인은 힘겨웠지만 꿋꿋하게 혼자 투표를 마친 후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2022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만 18살 이상 발달장애인 유권자는 20만여명이나 된다.
지난 대선 때 휴무하지 않았던 쿠팡이 이번 선거일(3일)에는 배송 기사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간 로켓배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써 모든 택배 노동자가 참정권을 보장받게 됐다. 그러나 생업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참정권 제한을 받는 유권자들이 여전히 많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용자가 별도 휴무를 보장하지 않으면 선거일에도 정상 출근해야 한다. 건설 현장이나 교대근무 현장 등 업무 특성상 선거일 휴무가 어려운 노동자들도 적잖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는 사전투표마저 평일에 실시돼 투표하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번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혐오가 더 넘쳤다. 투표 하루 전까지도 찍을 후보가 없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를 포기하면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결과를 낳는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것도 아니면 차악(次惡)이라도 선택하자. 더욱이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소중한 한 표에서 몸이 불편하거나 먹고 사는 문제로 투표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들의 몫까지 담아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bond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6월02일 09시21분 송고

![[부음] 강민훈(NH투자증권 digital사업부 대표)씨 빙부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세상만사] 어느 공직자의 이임사](https://img0.yna.co.kr/etc/inner/KR/2025/07/11/AKR20250711126800546_01_i_P4.jpg)
![[팔면봉] 관세, 국방비, 전시 작전권, 정상회담 개최… 쏟아지는 韓美 현안.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주가 더 올린다고 선의의 기업들까지 희생양 삼나](https://www.chosun.com/resizer/v2/EIAOQU6MIND7NMWYYAIC3GVJFI.jpg?auth=22b4b80de50de03ec478a39add9039a6265040c8f2f3253015797f83562a33a6&smart=true&width=3034&height=1962)
![[사설] 국민·기업 직격탄 관세 협상은 누가 책임지고 있나](https://www.chosun.com/resizer/v2/OTR4TZP56VAATAUKE5WIH37C4I.jpg?auth=1caee60695374db57fdfecf90f551592a97a1f4d8c055cf179c89135f563904d&smart=true&width=3230&height=2023)
![[사설] 기이한 행태 강선우 후보자, 가족부 장관 맞지 않다](https://www.chosun.com/resizer/v2/D5UZJUAX7XRU2E2AOO5MNK75SY.jpg?auth=5df69625837633ae4549e59029807f2721e600c9b0b38e970731cdf372fd1d6a&smart=true&width=2341&height=1757)
![[박정훈 칼럼] “노벨상 받을 정책”](https://www.chosun.com/resizer/v2/SNU6Z2T7D5FPFOV5RU7SQYCRGQ.png?auth=8706222c40791eea37121382644492ea5bb4f71a3903720bd1b454569f16705b&smart=true&width=1200&height=855)
![[태평로] 등번호 7번 영웅의 유니폼 갈아입기](https://www.chosun.com/resizer/v2/5FJ4T2PFOFEGZNUT2QQMBGQOSU.jpg?auth=6a07451c56c4fd89272f75092d0eea4689c88e892cdd0b4e2c4a7083f539ed98&smart=true&width=500&height=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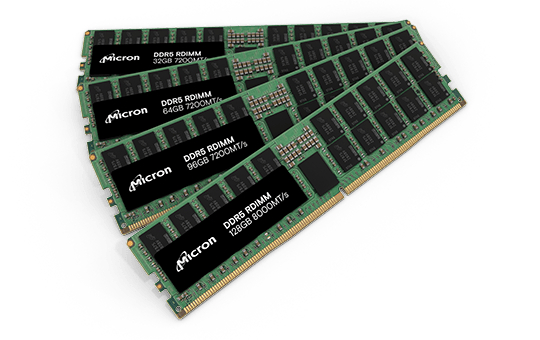



![[朝鮮칼럼] 신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대중국 정책](https://www.chosun.com/resizer/v2/RKK4RNGVFNH35JRLLXTTU2RAP4.png?auth=b176df5e9a825f7cfcf8abb8fe5e68d3b8bee2e5054afd5d9ff84d10209fa8ca&smart=true&width=200&height=267)

![[에스프레소] 피터 틸이 묻는다 “AI 강국, 말로만 외칠 건가”](https://www.chosun.com/resizer/v2/N5NWTT7NHJBCFHEEP5IQLW7DKU.png?auth=0e06d154dcf135b7a87bd56824433b79d36da0c6b19e5fa7db13ee646301dc8f&smart=true&width=500&height=500)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