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동 칼럼]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7.30039483.1.jpg)
서울 아파트값이 꾸준히 올랐지만 몇 년에 걸쳐 급등한 것은 크게 세 번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까지,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다.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의 일이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태우 정부 70%, 노무현 정부 94%, 문재인 정부 109% 정도다.
세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출범 초 투기 수요 억제에 역량을 집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88년 부동산투기억제종합대책을 내놓으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듬해에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까지 제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취임 초반부터 집값 상승은 투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고 대출 문턱을 높여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선 규제 강화 대책을 스무 번 넘게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요 억제책은 잠깐 약발을 내는 데 그치고 이내 집값이 치솟는 양상이 되풀이됐다. 정작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것은 각 정부 후반 이후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가 인상되면서부터였다. 노태우 정부 후반엔 주택 200만 가구 건설과 분당 일산 등의 1기 신도시가 큰 역할을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와 윤석열 정부 들어 집값이 안정된 것은 2, 3기 신도시와 금리 상승 덕이었다.
세 정부가 공들인 투기 수요 억제책이 실패한 원인은 뭘까. 고차방정식을 일차방정식으로 풀려고 한 탓이 크다.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공급량, 시중 유동성, 경기와 소득, 인구 변화, 개발 호재 등 상당히 많다. 이 중 집값을 광범위하게 수년간 밀어 올린 핵심 요인은 공급 부족과 시중 유동성 확대였다. 투기가 변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변수 중 하나에 불과하다.
게다가 투기라는 개념은 모호하기 짝이 없어 애초 정책 대상이 되기 힘들다. 투기란 무엇인가. 투기의 반대 개념은 투자인가 실수요인가. 2주택자 이상은 모두 투기꾼인가. 무주택자가 집값이 오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을 한 채 사면 투기인가 투자인가. 애써 투기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투기 수요는 그 규모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투기와의 전쟁은 헛발질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선 때와는 달리 지난 대선 과정에서 투기 억제보다 공급 확대를 앞세웠다. 윤석열 정부의 공급 계획에 105만 가구를 더해 311만 가구를 전국에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역세권 개발 등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국토보유세는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는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고 진단했고, 6억원 이상 대출 금지 규제를 두고선 “맛보기에 불과하며 수요 억제책은 이거 말고도 많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과거 세 정부를 쫓아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여기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3기 신도시 외 추가 공급 확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까지 보냈다. 이렇게 가면 과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 젓는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공급 확대를 구체화한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9 hours ago
2
9 hours ago
2
![[사설] 결국 한미 정상회담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https://www.chosun.com/resizer/v2/MKVUDTJXWMTKR3S4JAQUU5CZBU.jpg?auth=4101d5f90a1a3990359806743875cc1a3c3402fe3b1a16ad606c59be068740cb&smart=true&width=1000&height=643)
![[팔면봉] 장관 후보자마다 언론 의혹 제기에 “청문회 때 설명하겠다”고.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진의를 알기 힘든 대통령실 메시지](https://www.chosun.com/resizer/v2/XMQOY5X4YYP724OIIIQQE3575A.jpg?auth=6f79f9e5fb002e3b220cf950dc74356eee709f491c79200239187b8fa00f9991&smart=true&width=720&height=918)
![[사설] 알려진 것과 다른 복지장관 후보자 모습](https://www.chosun.com/resizer/v2/LXGPGLPN2PPKUBWOGI4MRDA3CA.jpg?auth=5b616a75e46693c1ec507d3754979a8934952c64480a29db00e4a0cc4ff34648&smart=true&width=2700&height=1642)
![[선우정 칼럼] 법원의 ‘14 글자 개헌’](https://www.chosun.com/resizer/v2/45XD37PIWFDS7NLZ7DBBIMQ34I.png?auth=4cdb4e93eb8d48ccb6617cfa839ecee8092c750b72e927a669065c6133b1d6f2&smart=true&width=500&height=500)
![[김준의 맛과 섬] [248] 신안 신도 꽃게 밥상](https://www.chosun.com/resizer/v2/6BGBXXSNRRFM5KZYJ2CBFC5UVI.png?auth=47eb7bb0d3ddc5db51c6840d60398aab1e18f5bcc3b03352c611e3e416fe788b&smart=true&width=200&height=266)
![[태평로] 中 전승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https://www.chosun.com/resizer/v2/WBTLXREQNNAELIBAJLEGV5CUG4.png?auth=367283adbd2129ac735076e03b172e1e0acd0fb1633f593d54612f99bbc6e9e3&smart=true&width=500&height=500)
![[김도훈의 엑스레이] [78] 못생긴 남자의 발라드](https://www.chosun.com/resizer/v2/DIUA6EVV7ZGFVLGMJIFKGO7KRU.png?auth=261356bd06ea342ad294ae2f3d07a8266a94f4cbcf7ebb456ea4c2a1801b8352&smart=true&width=500&height=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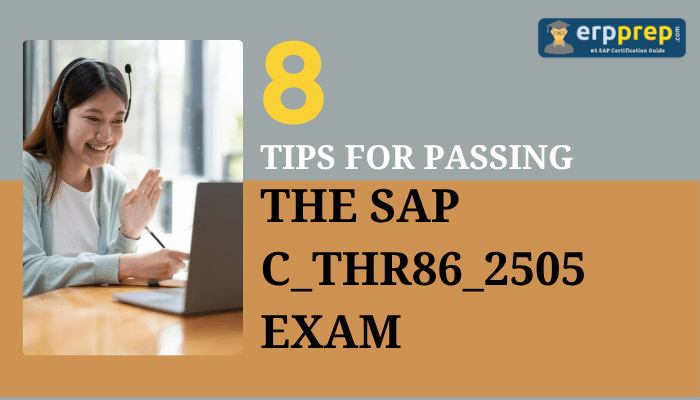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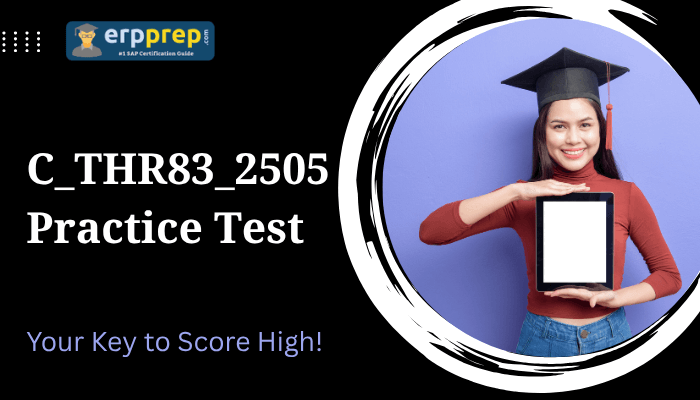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