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AI가 초래할 노동시장 충격](https://img.hankyung.com/photo/202509/07.27035797.1.jpg)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은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날 나는 대학원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여러분은 동년배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도 경쟁해야 하는 세대다.”
당시에는 4차 산업혁명이 당장 우리 경제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 변화는 더뎠다.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거론됐지만, 결국 챗GPT 같은 대규모언어모델 기반의 생성형 AI만이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다. 알파고 이후 진화한 AI는 경제 발전의 전환점이 될 잠재력을 지녔다.
경제학자들은 어떤 기술이 산업혁명적 변화를 가져오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제품·생산방식·조직 혁신을 이끌며, 핵심 기술의 지속적 개선이 이뤄지는 등 범용 기술이어야 한다. 둘째, 발명 방법의 혁신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즉, 연구개발 과정 자체를 효율화해 새로운 발명을 촉진해야 한다. AI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앞으로 산업혁명적 변화를 불러올 잠재력이 있다.
정부도 이런 가능성을 인식하고 AI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삼아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방향은 옳지만, AI가 당장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섣부르다. 혁신적 기술이 실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ICT) 혁명도 그랬다. ICT는 1970년대 초부터 발전했지만, 노동생산성이 본격적으로 높아진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였다. 오히려 미국 경제는 1970~1980년대 생산성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다. 이 상황을 두고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 MIT 명예교수는 “컴퓨터 시대는 어디에나 보이지만 생산성 통계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솔로 패러독스’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새로운 기술은 도입 초기에는 전환 비용과 혼란을 동반해 생산성이 더디게 오르거나 일시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과 제도가 적응하고, 기술에 맞는 인적 자본이 축적되면 생산성이 비로소 급등하는 J커브 효과가 나타난다.
생산성 향상은 시간이 걸리지만, 혁신적 기술이 노동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충격은 훨씬 빠르다. 1970년대 이후 ICT 발전은 이른바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를 가져와 고학력 인력의 임금만 오르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 결과 불평등은 심화되고 중산층은 위축됐다. 일부 학자는 이를 2008년 금융위기의 배경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 정치 지형을 뒤흔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도 중산층 몰락과 관련이 깊다.
AI의 충격도 이와 비슷하다. 생산성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먼저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AI는 어떤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까? ‘경력 편향적 기술 변화’(seniority-biased technological change)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에릭 브린욜프슨 스탠퍼드대 교수팀 연구에 의하면 AI를 도입한 기업에서는 경력 초년 인력(주니어)의 채용이 급감한 반면 고경력 핵심 인력(시니어)의 고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분명하다. 주니어가 맡던 기초 문서 작성, 판례 정리, 재고 관리 같은 업무는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다. 반면 시니어들은 AI를 활용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 AI는 경력에 따라 주니어에겐 대체재, 시니어에겐 보완재로 작용하는 셈이다. 실제 로펌에서는 AI 도입 이후 주니어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있다. 이런 변화는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주니어들이 경력을 쌓을 기회마저 빼앗는다.
경력 사다리의 첫 칸이 사라지면 후속 세대는 인적자본을 축적할 길이 막힌다. 세대 간 지식 전수가 끊기면서 주니어가 시니어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내세운 성장률 목표보다 시급한 것은 노동시장 대책이다. 청년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 초년생의 경력 축적 기회를 보장하는 창의적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AI 시대의 충격이 완화되고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가 지켜질 것이다.

 1 month ago
13
1 month ago
13
![[사설] 檢 항소 포기, 대장동 일당과 李 대통령에 노골적 사법 특혜 아닌가](https://www.chosun.com/resizer/v2/MVRDCYLFGU2DOYLCGEZTCZRXME.jpg?auth=e7208408e32f3c86fca96d1cc26ab946aa0573ff3afc88149eaf47be452d2014&smart=true&width=4501&height=3001)
![[팔면봉]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여권 인사도 놀란 듯.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권력 앞에 검찰권 포기, 용기 있는 검사 단 한 명 없었다](https://www.chosun.com/resizer/v2/GRSDOM3GGRTDMMZVMIZWEMRSGI.jpg?auth=3660099caccde3b5cc42f8a35fb1d3d3ed7245720ce0ddba78c999c2772ee0ad&smart=true&width=399&height=255)
![[사설] 국힘 대표 부인이 김건희에게 가방 선물, 민망하다](https://www.chosun.com/resizer/v2/MVQTQNLDMJSDONRTMVQWINDBG4.jpg?auth=8141846de3d24a96723f9b1cff26e76f746dd63a88bb3beb44b86fbf01793855&smart=true&width=6673&height=4246)
![[朝鮮칼럼] ‘진보 정권의 아이러니’ 재현하지 않으려면](https://www.chosun.com/resizer/v2/VXXDKUIJUJCOLIT4M4DA47BFKY.png?auth=47d5c0a683690e4639b91281f2cab5fd3b413998a70d2183f12a92e1f1b8119d&smart=true&width=500&height=500)
![[강헌의 히스토리 인 팝스] [287] K팝, 그래미상 ‘빅4′ 고지 오를까](https://www.chosun.com/resizer/v2/5XHK7PZ56NHTTKH7COJFQ4M54Q.png?auth=664876bab5cee8d9c73896a7d01b64f27386130e62bef9ae4289fdb3837c803b&smart=true&width=500&height=500)
![[동서남북] 원산·갈마 리조트에서 이산가족 상봉을](https://www.chosun.com/resizer/v2/273GIBFF3NCHBC5LVGUUIDK3GM.png?auth=2dc473a67ab5cc661f563ad05832554564124579b2d90352af8c3782f593b38f&smart=true&width=500&height=500)
![[문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詩] [95] 밥그릇 심장](https://www.chosun.com/resizer/v2/JZ2DPK7OZBANLBLB5SS5OH3S6I.png?auth=9fb621a8d43376974dd4c21736aba72e87fd3876911d9303e1df9f5adebb9cb7&smart=true&width=500&height=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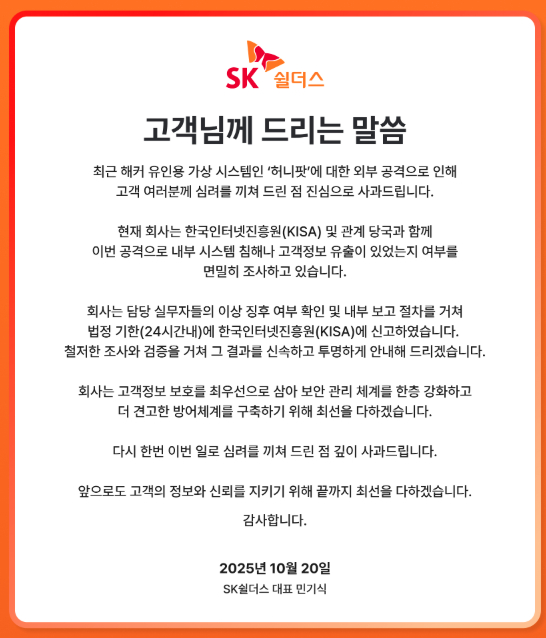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