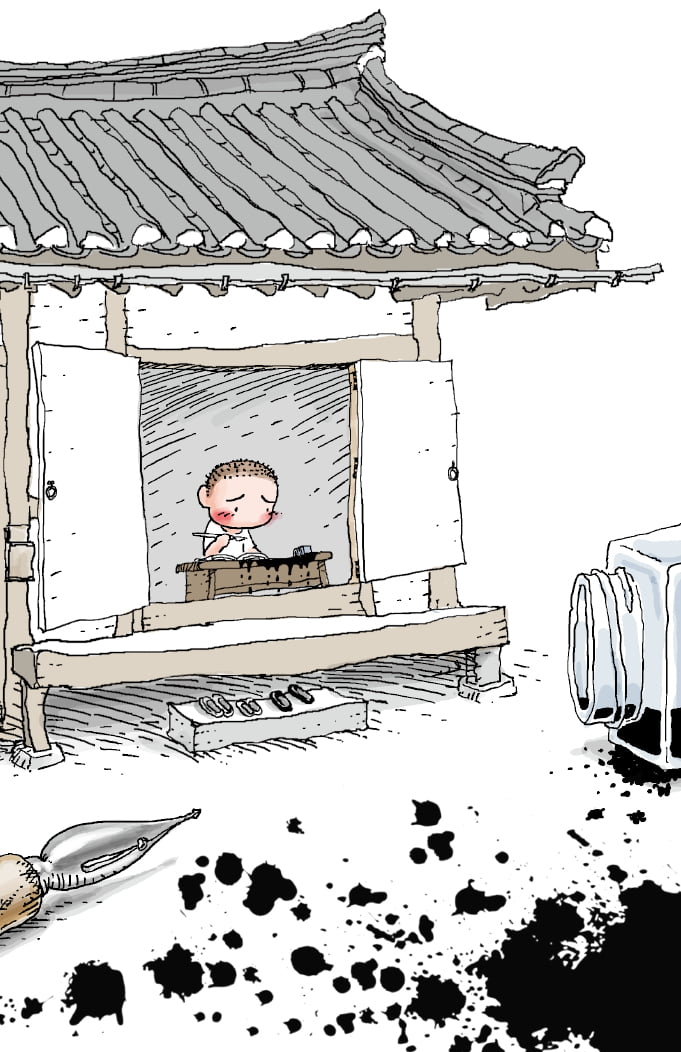
지난해 5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비워뒀던 막동리 집을 정리했다. 장롱이며 냉장고, 침대같이 덩치 큰 물건은 그냥 놔두기로 하고 아버지가 입으시던 옷가지며 자잘한 생활 도구를 여동생들이 와서 하룻저녁 자면서 치우고 남아 있는 자잘한 물건은 내가 치우기로 했다.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뜨신 뒤 5년 동안 아버지가 혼자서 사시던 집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동생들에게는 논을 주시고 나에게는 집과 텃밭과 선산을 주셨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그것들을 제대로 건사하기는 어려워 집과 텃밭을 서천군에 기부하기로 해서 집을 미리 청소해야만 했다.
옛집 정리하다 만난 특별한 유품
![[나태주의 인생 일기] 아버지의 낡은 책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7.39479997.1.jpg)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대청마루방에 있던 나의 책을 치우는 일이었다. 공주에서부터 이삿짐 자동차 두 대를 불러 막동리 집으로 가서 한나절 책을 차에 실었다. 기왕 자동차로 책을 싣고 오는 김에 집 안 여기저기를 돌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이 없나 살펴 몇 가지 가져오기도 했다.
우선은 어머니 반짇고리와 안경과 양산, 그리고 석유 등잔 하나, 아버지 어머니가 벽에 걸어놓고 보시던 사진들을 챙겼다. 또 가져올 만한 것이 없을까 살피다가 오래전 우리 식구들이 사용하던 나무로 된 밥상이 여러 개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챙기고 또 대청마루 한구석 찬장에 모아둔 사기대접을 있는 대로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또 무엇이 없을까, 두리번거리던 나의 눈에 나무 책상이 하나 눈에 띄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물건이고 낡은 것이었다. 아, 저 책상! 그것은 젊은 시절 아버지가 사용하던 앉은뱅이책상이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룩얼룩 나무의 여러 부분에 곰팡이가 슬고 더러는 썩기도 한 것이었다.
그렇다. 저것도 가져가야지. 저거야말로 아버지의 오래된 유품이 아니겠는가. 아버지는 저 책상에 앉아서 글씨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기도 하면서 마을 이장 노릇을 10년 동안이나 하셨다. 나에게 보낸 숱한 편지들도 저 책상에 앉아서 쓰셨으리라. 그런 생각으로 책상을 살피던 나는 또다시 책상에서 오래된 흔적을 발견하고 생각에 잠겨야만 했다.
잉크 얼룩 속에 새겨진 가르침
그것은 책상 위의 잉크 자국이었다. 책상 위쪽 나무판 삼 분의 일쯤을 덮은 잉크 얼룩. 그것은 아버지가 만든 것이기도 했지만 내가 만든 것이 더 많았다. 외갓집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어 막동리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사랑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냈다. 아니, 부모님과 나, 그리고 동생 네 명이 함께 지냈다. 그러니까 방 하나에서 일곱 명이 살았다는 얘기다.
그러니 책상을 두 개 들여놓을 공간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아버지의 책상을 나와 아버지가 함께 사용해야만 했다. 열두 살짜리 중학생. 연필을 놓고 마악 잉크와 철필을 사서 글씨를 쓰기 시작할 때. 나는 아버지의 책상 위에서 잉크병을 자주 엎어먹었다. 그럴 때마다 황급히 걸레를 가져다 잉크 얼룩을 닦아야 했고 야단을 맞지 않을까 싶어 아버지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한번인가는 책상머리에 공부 계획서를 적어서 붙여놓은 적이 있다. 그걸 유심히 봐두셨던지 아버지가 나더러 왜 너는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그걸 실천하지 않느냐고 꾸중하셨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애당초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말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말한 대로 살아야 한다-이른바 언행일치(言行一致)를 풀어서 그리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지금껏 살면서 가장 가슴 깊숙이 간직하며 살아온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이 말씀이 아닌가 싶다. 누구든지 자기가 입으로 말한 대로 그 일을 실천하면서 살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일 하나만 제대로 실천해도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아버지의 그 낡은 책상은 풀꽃문학관 별관 거실에 와 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반짇고리와 사기 등잔이 놓여 있다. 오며 가며 보는데 마치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만난 듯 정겨우면서도 가슴 한구석 서늘한 느낌이 든다. 특히나 잉크의 얼룩은 나에게 묻곤 한다. 과연 그대는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살아온 사람인가? 젊은 아버지의 뜨거운 음성을 다시금 듣는 듯 조심스럽다.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왔던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시 봄이 왔다. 벌써 1년 가까이 막동리 고향집은 빈집인 채로 방치된 상태. 다행히 서천군청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고향집과 텃밭을 한데 몰아 기증해 마음 한구석 허전한 대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 새록새록 일어난다. 그래, 올해도 봄은 오고 마당에 심은 몇 가지 꽃나무들은 꽃을 피우기도 했겠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시 한 편을 여기에 옮기며 섭섭한 마음을 달랜다.
‘어머니 세상 뜨시고 6년/ 아버지마저 세상 뜨신 건 작년 5월/ 또다시 어렵사리 봄은 와서/ 막동리 고향 집 아버지네 집/ 버려둔 지 1년도 넘어/ 사람 그림자 없어 혼자/ 외롭게 숨만 쉬고 있을 옛집/ 뜨락 한 구석지 동백꽃/ 새빨간 올해도 어렵사리 피웠겠다/ 여러 번 꺾이고 뭉개지고 비틀려서/ 키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볼품도 없는 동백꽃/ 너무나도 나를 닮은 동백꽃/ 그래도 붉고도 붉은 동백꽃/ 여러 송이 그 몸에 매달고/ 나도 꽃피웠어요 꽃 피웠다구요/ 붉은 울음 속에 샛노란 웃음/ 잠시 수줍게 보여주면서 고향 집/ 저 혼자 지키고 있겠다/ 멀리서 나만 혼자 애달프다 구슬프다.’ (‘고향 집 동백’ 전문)

 9 hours ago
2
9 hours ago
2
![[사설] 결국 한미 정상회담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https://www.chosun.com/resizer/v2/MKVUDTJXWMTKR3S4JAQUU5CZBU.jpg?auth=4101d5f90a1a3990359806743875cc1a3c3402fe3b1a16ad606c59be068740cb&smart=true&width=1000&height=643)
![[팔면봉] 장관 후보자마다 언론 의혹 제기에 “청문회 때 설명하겠다”고.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사설] 진의를 알기 힘든 대통령실 메시지](https://www.chosun.com/resizer/v2/XMQOY5X4YYP724OIIIQQE3575A.jpg?auth=6f79f9e5fb002e3b220cf950dc74356eee709f491c79200239187b8fa00f9991&smart=true&width=720&height=918)
![[사설] 알려진 것과 다른 복지장관 후보자 모습](https://www.chosun.com/resizer/v2/LXGPGLPN2PPKUBWOGI4MRDA3CA.jpg?auth=5b616a75e46693c1ec507d3754979a8934952c64480a29db00e4a0cc4ff34648&smart=true&width=2700&height=1642)
![[선우정 칼럼] 법원의 ‘14 글자 개헌’](https://www.chosun.com/resizer/v2/45XD37PIWFDS7NLZ7DBBIMQ34I.png?auth=4cdb4e93eb8d48ccb6617cfa839ecee8092c750b72e927a669065c6133b1d6f2&smart=true&width=500&height=500)
![[김준의 맛과 섬] [248] 신안 신도 꽃게 밥상](https://www.chosun.com/resizer/v2/6BGBXXSNRRFM5KZYJ2CBFC5UVI.png?auth=47eb7bb0d3ddc5db51c6840d60398aab1e18f5bcc3b03352c611e3e416fe788b&smart=true&width=200&height=266)
![[태평로] 中 전승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https://www.chosun.com/resizer/v2/WBTLXREQNNAELIBAJLEGV5CUG4.png?auth=367283adbd2129ac735076e03b172e1e0acd0fb1633f593d54612f99bbc6e9e3&smart=true&width=500&height=500)
![[김도훈의 엑스레이] [78] 못생긴 남자의 발라드](https://www.chosun.com/resizer/v2/DIUA6EVV7ZGFVLGMJIFKGO7KRU.png?auth=261356bd06ea342ad294ae2f3d07a8266a94f4cbcf7ebb456ea4c2a1801b8352&smart=true&width=500&height=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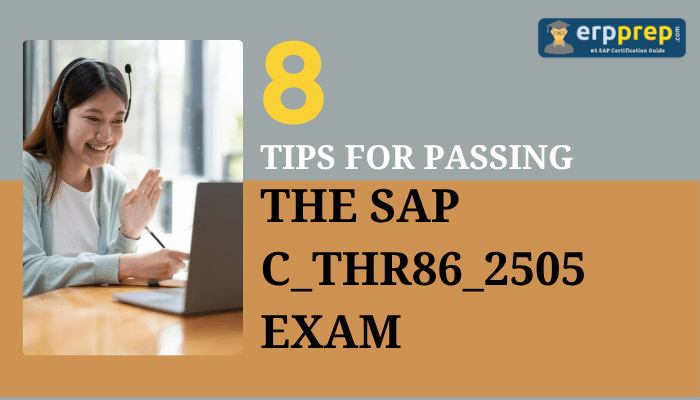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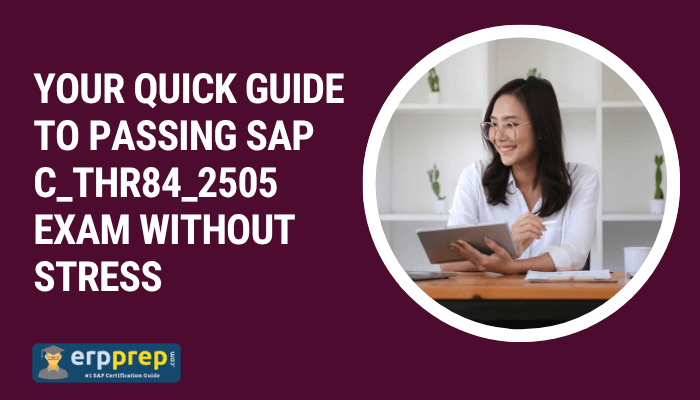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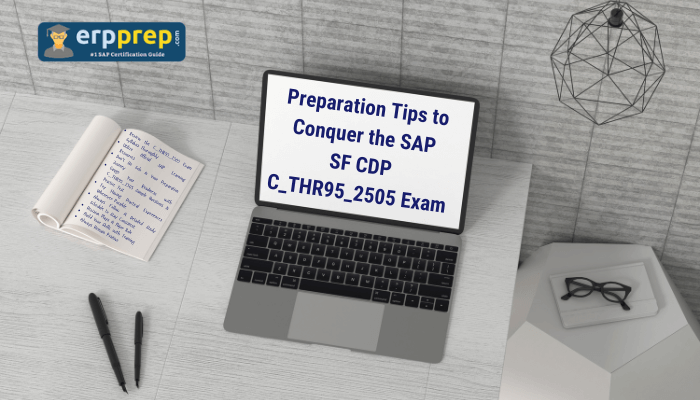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