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보현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객원교수
황보현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객원교수“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AI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달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다. 그는 취임사에서 AI를 두 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AI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후보 시절 그는 'AI 대전환(AX)을 통한 경제 강국 도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과 그간의 발언은 이번 정부가 'AI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짐작케 한다. 대통령은 소버린 AI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G3)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는 소위 'AI 정부' '소버린 AI 내각'이라 불리는 인재 등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대통령은 네이버 AI센터장을 지낸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내정했고, 최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AI 전도사'라 불리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이번 정부가 AI에 사실상 '올인'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정우 수석은 'AI 전쟁' 'AI 전쟁 2.0'을 통해, 구윤철 장관은 '레볼루션 코리아' 'AI 코리아'를 통해 AI 정책의 방향성과 국가 전략을 제시해왔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독자적 AI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AI 인력 양성과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외친 인물이다. 또 AI 거버넌스 정립과 AI 관련 국제기구 유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AI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활성화를 시도해야 함을 주장했다.
AI 전문가의 중용과 더불어, 이번 정부 인사의 또다른 특징은 민간 전문가의 대거 발탁이다. AI 영역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 정책실장에도 민간 기업가 또는 민간기업을 경험한 인물을 임명했다.
민간 전문가의 정부 발탁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AI뿐만 아니라 반도체, 우주항공, 양자컴퓨터 등 시시각각 변하는 미래 산업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료제가 가진 절차 중심의 사고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의 AI 수석 정책고문인 스리람 크리슈난(Sriram Krishnan)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엑스 등에서 일한 정보기술(IT) 전문가이며,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인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 역시 AI 스타트업인 스케일 AI(Scale AI) 출신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임명된 200여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민간 기업인 출신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 서구 선진국에서 기업 경영을 통해 리더십이 검증된 인물을 정부부처의 수장으로 영입하는 것과 배치되는 사례다.
이해 충돌 여부나 청문회 통과 등 검증해야 할 이슈와 절차가 많고, 민간 출신 인사가 전혀 다른 조직 문화인 관료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민간 출신 인재의 영입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가 첨단 기술과 산업 현장의 최전선에서 실무를 경험한 인재를 발탁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번 정부 산업 정책의 효과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간 여러 정부에서는 전문성과 학위, 명성 등을 이유로 대학교수 출신을 선호해왔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수 출신 장관의 한계는 대체로 뚜렷했다. 겉보기에는 무난하지만 관료 사회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고, 산업 현장에 대한 경험과 감각이 부족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번 정부가 시도하는 민간 전문가 중용의 실험은 중요하다. 이들이 맡는 영역이 AI를 비롯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이기에 이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AI 기본사회'와 '모두의 AI'라는 정책 비전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보다 폭넓게 발탁해야 한다. 또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과 문제 해결능력을 쌓은 인재를 산업 부처의 리더로 중용해야 한다. 이제는 산업 현장의 경험과 실전 감각을 갖춘 전문가들이 정부를 이끄는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황보현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객원교수 scotthwangbo@snu.ac.kr

 5 hours ago
1
5 hours ago
1
![[만물상] 연봉 1300억원 인재 쟁탈전](https://www.chosun.com/resizer/v2/MCBDGO2RB5C3HMDLSI3A4FMBAE.jpg?auth=010a2678b9878b28bb51f53837a0e38a9978ea34e73afb7a6d1cc192cc389eb8&smart=true&width=1200&height=669)
![[인사] 한국환경공단](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천자칼럼] 중국 공산당 권력투쟁사](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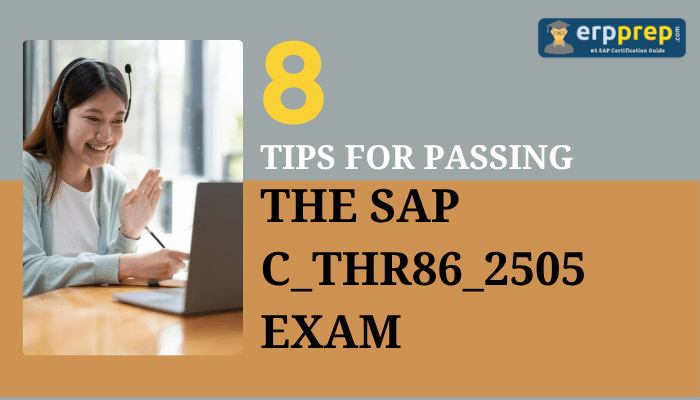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