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팬데믹 이후 정보통신, 전문 과학기술 등 하이테크 서비스업을 앞세워 경제 회복을 이뤄지만 한국 서비스업은 그 기간 성장을 견인하기는커녕 오히려 생산성이 뒷걸음질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하루이틀 된 얘기는 아니지만,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구조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우리 서비스산업은 실속 없이 덩치만 커진 상태다. 2024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서비스산업 비중은 44%를 차지했고 전체 취업자의 65%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20년째 제자리다. 민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실질 부가가치/취업자 수)은 2005년 제조업의 40% 수준으로 내려왔고 지난해까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은 것은 알려진 대로 부가가치가 낮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등의 비중이 높은 탓이 크다.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생계형 자영업 진출입이 반복되면서 영세성이 굳어졌다. 지식서비스나 기업서비스 분야조차 오랜 기간 제조업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에 머무르면서 경쟁력을 키우는 혁신에서 뒤처졌다. 전반적인 사회 인식에서도 서비스산업을 공공재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탓에 강력한 규제가 따라붙으면서 산업 활력을 떨어뜨려 왔다.
지금의 서비스산업은 농업, 제조업과 구분하는 과거의 산업 영역이 아니라 다른 산업을 연결하고 융합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지식·문화·디지털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산실이기도 하다. 규제 개혁을 통해 제대로 키운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융복합 서비스 신산업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에서 10년 넘게 공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엉킨 실타래부터 풀어내야 한다.

 7 hours ago
1
7 hours ago
1
![[사설] 李 “같은 쪽만 쓰면 전쟁” 특별감찰관 인선부터 실천을](https://www.chosun.com/resizer/v2/3SI4VAUBXVP3FAIDM2QHDD6JGI.jpg?auth=dc70245f3196527147c9a54b74645dcaf45e35c81e515d4803e044f761ef6665&smart=true&width=7064&height=4511)
![[사설] 의혹 속 인준 金 총리 “野 더 만날 것” 약속 지키길](https://www.chosun.com/resizer/v2/T44RB4Z4FNHHLDKM5YLR7ROUKQ.jpg?auth=a0209a189564181cdaeff009f164efae61982d278fe859775bba28a49bec5b3d&smart=true&width=2276&height=1280)
![[사설] 특활비 “쓸데없다”더니, 민주당은 부끄러움을 아나](https://www.chosun.com/resizer/v2/EGVNFMG324RQ3755Z3RXLFPGEI.jpg?auth=aa41ac261dc05f88d4b5ceb5c222de7a66a0b666779d90071b029bf85dbc6bb6&smart=true&width=5579&height=3720)
![[朝鮮칼럼]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이유](https://www.chosun.com/resizer/v2/JHF7MSAKFFFTXFBFAGU6VJJJEI.png?auth=4bb0b593aa8719f6fbde4d2e8361138d15f73fad0633dbed62627f203f174a68&smart=true&width=500&height=500)
![[광화문·뷰] 보수 정권의 死因은 ‘김건희’인가](https://www.chosun.com/resizer/v2/S53MD7CEGVGHXCMVYZTC5CX4ZQ.png?auth=1735df91590256db0b2e9cce946364aaf9dbb491c12b66d635d81709f8b1ab79&smart=true&width=500&height=500)
![[기자의 시각] 학문의 자유, 법으로 단죄 마라](https://www.chosun.com/resizer/v2/AHLB4A6QTRBSNOGTPHMWH6BXMI.png?auth=37a102a5d7baab172fcd8646d96f207b5e2ae31068e48ab3a2d437dfe85dbf3a&smart=true&width=500&height=500)
![[논설실의 뉴스 읽기] 치사율 100% 재선충병, 영남 휩쓸고 강원·경기 거쳐 서울로 진격 중](https://www.chosun.com/resizer/v2/IGJXUTT5HRGH3PCRT2JZUMDSMM.jpg?auth=4b434fd13296537b5c7ef3f943c2d863e372e7b2ca06e981c0a4beb5be14656e&smart=true&width=1280&height=926)
![[유현준의 공간과 도시] 공간 수축의 시대에 살아남는 법](https://www.chosun.com/resizer/v2/N6JIRAFHVVERREX43GPQPX67YQ.png?auth=a271294f75b461d7b8f9bc6be51c74d767acd7d245d0ab60a38f55ced77a7c2c&smart=true&width=200&height=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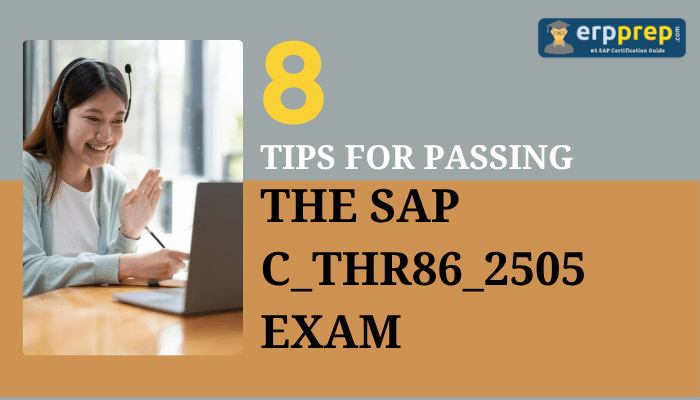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